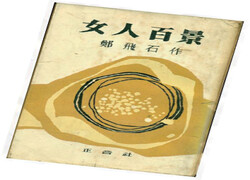1
의 허 간호사(허영란·사진), 의 자경이(윤정희), 의 승아(김하늘), 의 미남이(박신혜)…. 한때 가슴앓이를 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다. 윤정희·김하늘·박신혜의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여신님이 팬들에게 남긴 친필 메시지를 볼 수 있고, 그녀의 각종 인터뷰와 동영상이 모여 있는 게시판을 득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짓도 오래는 못 간다. 다른 드라마의 다른 여주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여신을 바꿀 때는 바람피우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한 마음 세 연인’의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을 팽개친다. 드라마 폐인들이 이렇게 많은 드라마 공화국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우리의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만들었던 여우(女優)들에 대한 메모리얼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문필가라는 사람들, 여우에 대해선 거의 글을 쓰지 않는다. 허영란에게 바친 고종석의 에세이가 내가 본 유일한 글이다. 쓸데없는 글들 좀 그만 쓰고 여신들의 미모와 마음씨와 몸짓과 눈물 한 방울을 예찬하는 글을 쓰도록 하자. 가십성으로 빼먹고 훔쳐보며 뒷담화하고 낄낄거리려고 안달 난 인터넷의 글들을 볼 때 상처받은 그녀를 생각하며 한숨짓게 된다. 왜 우리는 그녀들에게 언어폭력밖에 베풀 줄 모르는가.
고생하는 그녀들에게 ‘언어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사라짐과 늙어감 앞에 선 한시적인 것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이다. 시인 이창기는 “우리가 사는 이 삶에도 드라마처럼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고 노래했지만, 드라마 속 그녀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길을 걸어 길 끝으로 사라진 뒤 그대로 브라운관 속에 묻혀버렸다.
더 늦기 전에 그녀들의 청춘을 기록하자. “터럭 하나 허투루 그리지 않는다”는 조선시대 초상화 필법을 본받아 심리부터 표정까지 선명하게 기록하자. 너무 아름다워 그 무엇보다 세월의 핍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간의 마이너리티인 그녀들의 한시성을 위해 애뉴얼 리포트라도 작성하자. 시시콜콜 멋대가리 없이 쓴다면 오히려 누를 끼칠 터이니 매력 포인트를 잘 잡아 미학적으로 서술하자. 시간이 한참 지난 뒤 ‘1980년대를 뒤흔든 여배우들’ ‘1970년대 ○○○의 비키니 몸매 이 정도일 줄이야’ 운운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한 회고조에 불과하다.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그 숨결이 가을바람처럼 내 방문을 노크하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언어로 진심을 다해 사생대회를 갖자.
날고 기는 글쟁이들에게 각자 ‘나의 여신님’을 하나만 골라서 원고지 50장으로 10편만 부탁해볼까? 어떤 여우들이 지면에 불려나올까? 필자들에게는 현장 취재를 서슴지 말고 감행할 것을 권해야 할 것이다. 매니저한테 기획의 순수한 의도를 잘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인터뷰가 잡히면 현장 녹취는 출판사에서 담당하겠다는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룰라 ‘여보,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좀 봐요’…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