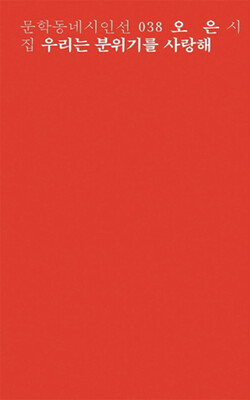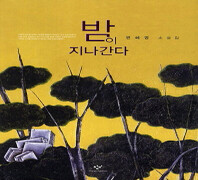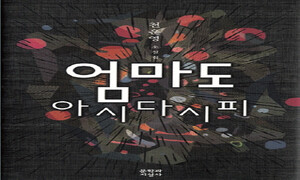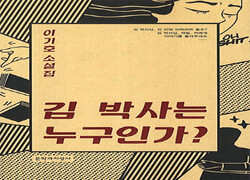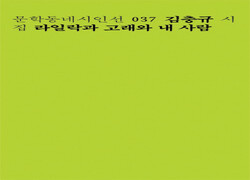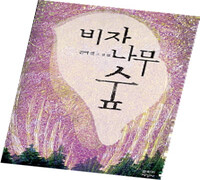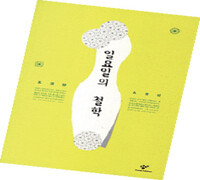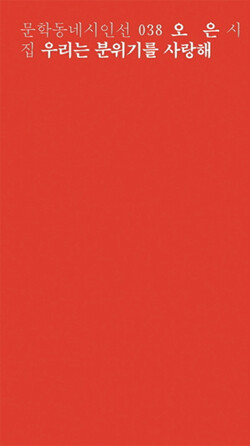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오은, 문학동네
‘어떤 날들이 있는 시절-망실의 시대’라는 시는,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일이었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잊어버림’과 ‘잃어버림’이라는 유사성 사이에서 그 언어들의 관계와 의미를 재배치한다. “어떤 날엔 잊어버리기 위해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 위해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와 같은 문장의 날카로움은 언어유희 뒤의 서늘함을 보여주며, 시간의 망실이 “스스로 뒷걸음질해서 아득한 기원이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어떤 날엔 기억을 더듬다가 갈피를 못 잡고 말을 더듬는 게 일이었다 (중략) 어딘가 슬픈 구석이 있었는데, 이 느낌만은 아무리 잃어버려도 끝내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다다르게 되면, ‘잊음과 언어’의 불가능성에 대한 시적인 사유의 발랄함과 예리함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이때 시인은 “가장 가벼운 낱말들만으로 가장 무거운 시를 쓰고” 있다. 이로써 망각과 망실의 시대에 대한, 혹은 우리 시대의 기억과 언어의 좌절에 대한 아득하고 인상적인 느낌 하나가 남게 된다.
무언가를 잊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선배 시인의 망각에 대한 문장이 있다. “망각은 없음일 뿐만 아니라 없음조차 없음이다. 또한 그것은 없음이면서, 없음일 수조차 없다. 없음을 없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없음으로써 있음이 되기 때문이다.”(이성복) 이 깊은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일 수는 없다. 어떤 지독한 기억은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망각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장 아름답고 참혹한 얼굴도 마침내 지워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최후의 순간에도 망각은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한다. ‘당신을 잊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표결 못한다” 여당서도 ‘법 왜곡죄’ 수정 요구…“후퇴 말라” 강경파 넘을까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