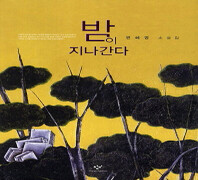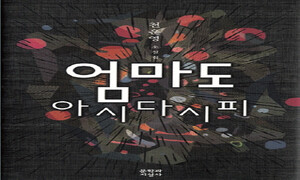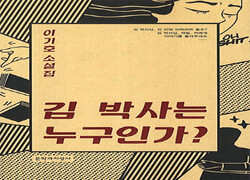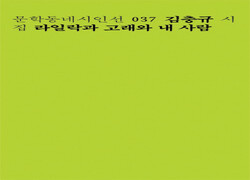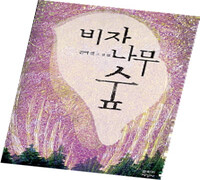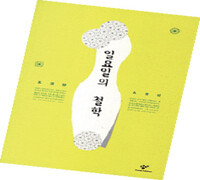황현산의 , 난다 펴냄
기억이 고통과 행복 중 어느 편에 속하는지 묻는 것은 무기력한 일이다. 기억은 어둡고 뻑뻑한 시간 속에 현재를 감금하기도 하 며, 무의미한 현재를 견디게 하는 축복이 되기도 한다. 기억은 아름다움의 형식 이 되기도 하며, 미지의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의 지층들을 감각하게 한 다. 그것을 기억의 미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불문학자이고 정밀한 문학비평가인 황현산의 산문집 는 문장 의 근육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유려함과 통찰력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다. 이 산문집 가운데 역사·기억·시간과 같은 주제들이 도처에서 반짝거리고 있 는 것은, 단지 그의 연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 망과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 은 ‘역사적 기억’과 ‘기억의 윤리성’ 안에서다. 자신의 유신시대를 기억하면서 그 시대의 억압을 망각하는 현실에 대해 “과거도 착취당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1980년대를 기억하려는 영화에 관해 “기억이 없으면 윤리도 없다”라는 명제를 가져오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늠될 것 같”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 시대’로 되돌아간 최근의 사태는 역사적 기억에 대한 자발적인 망각을 보여주는 ‘두 겹의 착취’라고 해야 할까?
현재를 두텁게 만드는 기억술은 지나간 아름다움을 현현하게 하고, 다른 시간 에 속한 타인들의 고통을 만나게 한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 “기억이 한 땅을 다 른 땅과 다르게 하고, 내 몸을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사이다’를 마시고 취해버렸던 어린 시절의 마법 같은 시간의 기억을 “바닥에 깔 려 있는 시간”이라고 호명하게 하며, “모든 예술적 전위의 다그침은 역사적 시 간의 파괴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장 날카롭게 곤두세워 믿어야 할 시간과 자기 사이에 어떤 운명의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쓰게 한다. 누구에게나 기억의 한계를 마주하 는 순간이 있다. 참혹한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 햇살이 지옥처럼 느껴지거나, 가장 황홀 했던 시간의 세부를 기억 못하고 늙어가는 것 이 문득 두려워지는 때. 살아 있다는 것은 기억 이 남아 있거나 혹은 기억이 사라져간다는 것 을 동시에 의미한다. 기억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미지의 가능성이다. 이런 이 유에서라면, 기억은 ‘나’의 시간에서 빠져나와 미래에 속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룰라 ‘여보,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좀 봐요’…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