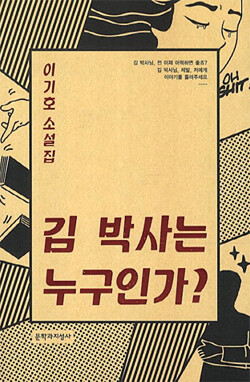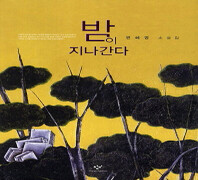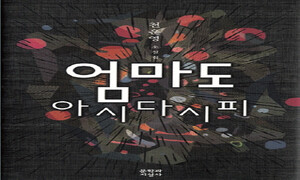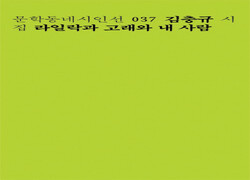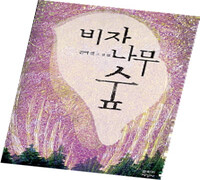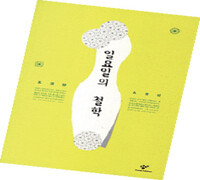‘김 박사는 누구인가‘, 이기호, 문학과지성사
이야기의 운명과 그 사회적 구성에 대한 흥미진진한 통찰을 보여주는 이기호의 소설집에는 이야기와 이름을 둘러싼 소설이 많다. 단편 ‘행정동’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지도교수를 끝없이 조른 덕에 대학 행정실의 임시직 일을 맡게 된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은 오래된 학적부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수정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등기된 이름을 다시 등재하는 일이면서, 이름을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일이다. 재입력되는 이름은 “마치 커다란 비밀처럼만 여겨졌다. 아무도 모르는, 이제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이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몰래 야근을 해야 하는 ‘자기 착취’의 상황에서 이런 작업은, 오늘날 ‘개인성’이 처한 위태로운 위치를 건조하고 날카롭게 보여준다. 함께 근무하는 여자와 심야 소동을 겪은 뒤 그는, “학적부의 숫자들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류란 원래 사실이 필요해서,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니까.” 이름을 둘러싼 서류상의 ‘사실’은 등재를 위한 사실에 불과하지만, 그 제도적 사실은 힘이 세다. 국가가 이름을 관리하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위에 작동하는 공허하지만 강력한 힘 같은 것들.
삶의 실재와 그 세부들은 기록할 수 없으며, 등기된 이름은 그 안에 커다란 공백을 남긴다. 이름은 그 사람의 내밀한 고유성에 대해 아무것도 담보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를 삭제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는 없다. 당신의 이름은 뼈아픈 비밀과 같고, ‘나’는 결코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에 닿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이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진 이름 하나를 되뇌는 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이름은 불가능하지만, 또한 불가피하다.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이름은 없어요.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