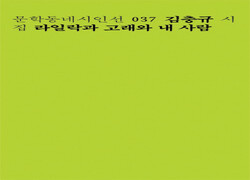954호 이광호의 만약에 사전
봄의 시제는 가정법이다. 봄은 언제나 ‘봄이 오면’이라는 시간대로부터 다가온다. 미래에 대한 가정과 기대 속에서 봄은 만질 수 없는 꿈처럼 오는 것이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김동환)와 같은 옛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윤동주)과 같은 익숙한 청춘의 시를 떠올리게 될 때도, 봄은 다만 소망의 풍경이며 가능성의 시간이다. 그런데 그 소망의 깊이가 너무나 간절해서 어떤 통증이 스며들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소망의 날카로움은 소망의 불가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봄을 둘러싼 소망스러운 장면은 불가능한 풍경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김윤아의 같은 상냥하고 부드러운 봄노래에 스며든 우울과 불안의 질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게 되며, ‘봄그늘’의 기억에 대해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 날 묶어/ 더 이상 안녕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나/ 더 이상 안녕하지도 않았다”(허수경, ‘불취불귀’)와 같은 지독한 마음의 자리를 수긍하게 된다.
젊은 시인의 시에서 봄이 불가능한 시간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박준의 시에서 봄은 ‘당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눈을 꼭 감아서 나는 꿈도 보일 때, 새봄이 온 꿈속 들판에도 당신의 긴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을 때”(‘동지’)로서의 봄은, 당신의 흔적을 발견하는 꿈속의 시간이다. “미인을 생각하다 잠드는 봄날, 설핏 잠이 깰 때마다 나는 몸을 굴려 모아둔 열(熱)들을 피하다가 언제 받은 적 있는 편지 같은 한기를 느끼며 깨어나기도”(‘미인처럼 잠드는 봄날’) 하는 것이 이 계절이다. “도망치듯 떠나온 이곳의 봄날”(‘동백이라는 아름다운 재료’)에, 당신이 없는 시간 속에 이 계절을 통과하는 일은 “이번 생의 장례를 미리 지내는 일”(‘꾀병’)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꿈에서만 만날 수 있고, 봄은 ‘당신’의 부재와 ‘내’ 죽음이 조우하는 계절이다. 박준의 시의 아름다움은 ‘당신’을 둘러싼 그리움과 죄의식이 뒤엉킨 그 순간 속에, ‘나’의 깊은 통증을 ‘꾀병’으로 만드는 처연한 의례와 천진한 슬픔에서 나온다. “그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도 나를 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파서 그대가 아프지 않았다”(‘용산 가는 길’) 같은 문장은 거기서 터져나온다. 그 ‘꾀병의 의례’ 가운데서 봄은 오지 않는 시간이며, 이미 흔적의 시간이다. ‘당신의 부재’는 불가능한 봄을 만들고, 눈부신 것은 차라리 그 불가능함이다. 시의 언어는 봄의 형상을 낳는 동시에, 그 풍경을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든다. 이 상냥하고 뼈아픈 계절, 날카로운 소망이 만들어낸 부재의 장소, 세상에 없을 익명의 시간. 그것을 ‘봄’이라고 부르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