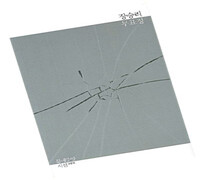다른 지면에서 ‘올해의 시집’을 선정해 짧게 몇 마디 적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의 소설’을 선정해보면 어떨까 싶어 지난 1년간 출간된 한국 소설의 목록을 정리해봤더랬다. 비평이 개입할 가치와 여지가 있어 보이는 책들로만 골라도 장편 45권, 단편소설집 30여 권이 추려졌다. 책들을 다시 들춰보다가 나는 조금 허전해졌는데, 읽지 못한 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읽다가 중단한 책들이 많아서였다. 그랬던 까닭을 되새기다가, 올해의 소설을 선정해보겠다는 생각을 이내 접고,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물음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고 말았다.
이런 얘기는 좀 쓸쓸하지만 그래도 해볼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다가 내려놓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독자 각자가 소설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이 책의 뒷부분에서도 제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책을 내려놓겠지. 나에게 ‘이 책을 그만 읽는 게 어떨까’ 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1차 고비는 처음 10쪽 부근, 2차 고비는 3분의 1 지점이다. 고비가 두 군데라는 것은 내가 소설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어떤 것이 적어도 두 가지라는 뜻이다. 10쪽 부근에서 하는 생각들만 일단 말해보려고 한다.
신기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얘기다. 모든 예술 장르는 각자의 매체를 갖는다. 음악이 소리를, 회화가 색을, 영화가 영상을, 무용이 몸을 갖고 있듯이, 문학은 언어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설가는 없다. 그러나 이 사실에 ‘시달리는’ 소설가는 드물다. 시달리지 않는 소설가들은, 그냥, 쓴다. 그럴 때 문장들은 달콤한 먹이를 실어나르는 개미들처럼 부지런히 이야기를 실어나른다. 여기엔 매체에 대한 자의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자의식이야말로 예술가의 존재증명이라면? 10쪽까지 읽었는데도 그 자의식을 증명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소설을 내려놓고 언젠가 영화화되길 기다리게 된다.
말하자면 나는 ‘소설적인 문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저 아름답게 쓰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요령부득의 문장을 써놓고 폼을 잡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동어반복처럼 들리겠지만, 소설적인 문장은 ‘소설적인 문장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고뇌한 흔적을 품고 있는 문장이다. 추상적인 명제이지만 정직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 고뇌는 반드시 전달된다. 속도감 있게 읽힌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믿는 소설가, 동시대의 전위적인 시를 따라 읽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설가들에게는 아마 무의미한 진리이겠지만.
그런 작가들은 자신은 전문적인 기능인일 뿐이며 예술가 대접까지 받을 생각은 없다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것은 존중받을 만하다. 나 역시 소설가는 모두 예술가여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반예술가적 타입의 작가라면 자신이 평단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다른 분야의 비평가들 역시, 사운드의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는 작곡가, 카메라의 윤리적 위치 따위에는 관심 없이 스토리텔링에만 열중하는 감독 등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건 당연한 일로 보인다.
내가 신뢰하는 몇몇 작가들로부터 존경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독일 작가 W .G. 제발트는 비평가 제임스 우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화자 자신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설 쓰기란 매우,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사기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화자가 자기 자신을 텍스트 안에서 무대담당자이자 연출자, 판사이자 집행자로 내세우는 그 어떤 형식의 작가적 글쓰기도 용납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도저히 읽어내지 못하겠어요.”(, 제임스 우드, 창비, 15쪽) 매체에 대한 자의식이 윤리적 자기 검열에까지 이른 경우다.
올해 번역 출간된 소설 (1995)에서도 이 작가의 기질적 신념은 철저히 관철된다. 그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서술자와 인물의 내면이 뒤섞이는) 자유간접화법을 거의 혐오하면서, 실로 경건할 지경인 벽돌 같은 문장들을 써나간다. 물론 제임스 우드의 말마따나 이것은 지나친 태도다. 나는 제발트를 좋아하지만, 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가능성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소설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올해 내려놓은 많은 소설들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제발트만큼 고집불통인 어떤 자의식을 모국어 소설에서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 쓸쓸해한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2관왕’ 김길리, ‘설상 종목 첫 금’ 최가온 제치고 한국 선수단 MVP 올라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