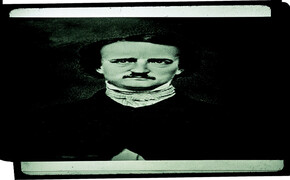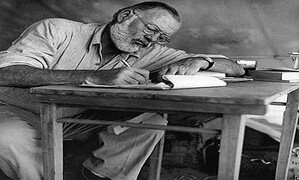한겨레 박미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에는 알베르 카뮈가 술과 관련해 남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 있다. “병영에 이런 삐라가 붙었다. ‘알코올은 인간의 불을 끄고 그 동물에 불을 붙인다.’ 이것을 읽으면 왜 사람이 알코올을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인간의 불을 끄는 술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 술은 소주다. 맥주처럼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속 시원하게 꿀꺽꿀꺽 들이켤 수 있는 것도 아닌 이 술을 도대체 왜 마시나 싶으면서도 간혹 물처럼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래서 깜박깜박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잘라먹게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어김없이 소주를 마신 날이다.
소주는 인간을 동물로 탈바꿈하게 하는 악마 같은 습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는 이슬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 소주를 ‘노주’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주를 증류할 때 증기가 냉각돼 액화되는 과정에서 술이 이슬방울처럼 맺혀 떨어진다고 해서 이슬 로(露)자를 쓴다. 또한 소주는 양조주에 비해 잘 부패하지 않는데, 불순물을 거의 다 제거하면서 증류해 얻은 순수 알코올을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다. 청명하게 맑은 그 빛깔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최영철 시인은 시집 의 ‘소주’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느새 이슬처럼 차고 뜨거운 장르에 왔다/ 소주는 차고 뜨거운 것만 아니라/ 격정의 시간을 건너온 고요한 이력이 있다/ …/ 불순의 시간을 견딘 폐허 같은 주름이 있다.”
‘불순의 시간’을 건너온 이 ‘고요한 이력’의 술은 그래서 가만가만 사람들 안에 스며들어 술자리를 공유하는 이들을 취기 어리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다 금세 ‘격정’적으로 ‘인간의 불을 끄고 동물에 불’을 붙여 ‘폐허 같은 주름’을 자아내게도 하지만.
그러나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의 불을 끈 그 순간은 카뮈가 말했듯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지난 술자리들을 돌이켜보자. 인간이 아닌 인위를 버려 오히려 조금 더 인간다워 보였던, 그래서 술기운을 빌려서라도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동료가 있지는 않았는지, 평소 뾰족하게 굴던 친구가 고양이가 주인 품을 파고들듯 따뜻한 기운을 건네오진 않았는지. 그래서 동물의 본성이 깨어나 몽롱하게 흐느적거리는 그 시간들은 알코올 내음이 없는 낮 시간보다 더 따뜻하고 오히려 더 인간적이다.
한편, 술기운에 젖은 시간은 새로운 차원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다음의 시가 이해되는 이들이 꽤 있을 듯하다. 김영승 시인의 ‘반성 16’은 숨결마다 번지는 술내가 훅 하고 끼친다.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 고 써 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술의 시간은 다시 술에 물드는 시간이 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나 보다.
어제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불을 끈다거나 불순의 시간을 건넌다는 말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다시 술에 물들 오늘밤을 위한 다음의 구절을 읊어보자. “나는 마시느니 오오늘도/ 비우면 취하는/ 뜻에 따라.”(정현종, ‘술잔 앞에서’ 부분)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중과세 무관 ‘1주택자 급매물’도 잇따라…보유세 부담 피하려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