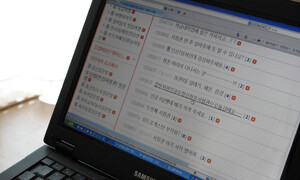수려한 외모를 자랑하지만 현대 사진 기술의 한계로 인해 사진만 찍었다 하면 ‘장군감’으로 변모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우리 아기. 한겨레 김은형 기자
“아기 어떻게 생겼어요?” 얼마 전 만난 후배들이 물었다. “하필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를 낳았지 뭐야.” “어휴, 뭐야, 다른 사람이 다 아기 낳고 변해도 선배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야유 폭탄이 쏟아졌다. 야유를 예상한 ‘조크’이긴 했지만 순전히 농담만은 아니었다. 진실이 담긴 농담이랄까. 예쁜 아기를 그럼 예쁘다고 하지,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짜증 나도 책을 내던지지는 마시길. 에는 이 칼럼보다 좋은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 고민을 뱃속에 넣은 임신 기간에 주요 근심 가운데 하나는 유치하게도 ‘아이가 못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었다. 많은 엄마들이 태교용으로 강동원·신민아 같은 연예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한다. 매일 빌었던 나의 소망은 엄마의 큰 키와 아빠의 숯검댕이 눈썹을 물려받는 것, 적어도 그 반대의 재난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겨우 생후 다섯 달인 지금 나의 바람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거의 매일 남편에게 말한다. “신기해.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예쁜 아기의 모습 그대로 태어났어.” “쯧쯧, 지 새끼라고 아주 눈이 뒤집혔구만.” 남편한테 외면받은 나는 친정엄마에게 다시 구애한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아니, 내 애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다가 말이야.” “글쎄다.” 이런 냉담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한 할머니 같으니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팔불출로 변모한 것이 꼭 단독 플레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내가 아이의 외모에만 집착한다면 천재의 신화는 바로 주변인들, 가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엄마들의 환상이 현실로 투사되는 “우리 아이 천재인가봐” 레퍼토리는 유구하다. 이런 엄마들의 착각과 욕망이 꽃을 피워 대여섯 살짜리 영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자 이제는 ‘민증 까’듯이 어디에서 인증받은 영재인가로 또 줄 세운다고들 한다. 이런 모습이 한심해서 나는 천재, 영재 운운에 말려들지 않으리라 결심했건만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안고 ‘죔죔’을 가르치던 작은언니는 아이가 손을 폈다가 주먹 쥐는 모습을 보면서 죔죔을 벌써 한다고 열광했다(원래 그때는 주로 주먹 쥐고 있다가 가끔 손을 펼 뿐인데 말이다). 백일 지나 옹알이를 하면서는 이따금 ‘까’ ‘마’ 하는 소리를 내곤 하는데 그것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는 ‘엄마’로 윤색돼 들렸다. 이런 식으로 150일 된 우리 아기는 신생아 때부터 시선 맞추기와 죔죔, 메롱 등 다양한 재주를 선보이면서 엄마 소리도 능숙하게 할 뿐 아니라 손이 무엇인지 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비상한 아이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집 직계가족에게만.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늘 말하면서도, 물론 이 말도 진심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욕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다른 아이보다 훤칠하고 잘생겼으면,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으면. 이런 바람들이 갓난아기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쑥쑥 자라나면서 결국 영재교육이니 선행학습이니 하는 양육의 늪지대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육아는 통제 불가능한 아기와의 전쟁이면서 엄마 자신의 욕망과 벌이는 전쟁이기도 하다.
조기교육 바람에 휘말리지 않으리라 맘먹은 나는 외모 쪽 팔불출로만 특화하기로 결심하고는 오늘도 잘생긴 아기를 자랑질하기 위해 아파트 놀이터에 나간다. 사람들이 아는 척한다. “장군감 아기 오네.” 헉! 이게 아니잖아~~~!
김은형 한겨레 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