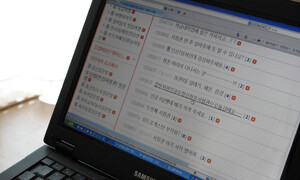아기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수입 아기띠는 마다하고, 포대기에 싸여 할머니 등짝에만 업히면 바로 잠이 들었다. 한겨레 김은형 기자
“좋겠다.” 친정이 지방이어서 육아에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를 부러워했다. 집 근처까지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 사는 엄마와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워놓고 “일단 낳기만 해라”라고 말하던 언니들까지 나에게는 근거리 육아 서포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복 터졌는가 하면 물론 터지기야 했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기의 안전과 내 편의 대신 자유의지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다. 특히나 출산 직후 혼합수유(모유+분유)를 권하는 엄마에게 모유수유만을 박박 우기다가 병원 신세를 지면서 육아의 ‘선제권’을 빼앗긴 탓에 찍소리 내기 힘든 여건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아이를 키워주는 집안 식구(주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있는 건 감지덕지할 일이긴 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한 예로 웃풍 센 옛날 생각만 하고 아기 감기라도 걸릴까봐 잔뜩 껴입히고 푹 싸는 바람에 땀띠로 엉망이 된 아기 얼굴은 어른들 도움을 받는 엄마들의 대표적인 불만 레퍼토리다. 특히 그렇게 아기를 아껴(!) 키워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엄마는 터지는 속을 부여잡고 묵묵히 아기에게 땀띠 연고를 발라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물론 나의 경우는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터지는 속을 부여잡을 일은 없었지만 욱하는 내 성격을 익히 아는 엄마는 측면공격으로 내 속을 살살 긁었다. 이를테면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어디서 화분 같은 걸 가져와서 아기 욕조라고 우기는구나”(엄마의 자궁을 닮아서 아기가 편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다는 최첨단 인체공학적 욕조라고요!), “단추도 없는 옷을 어떻게 입히려고 몇 벌이나 사왔더라, 내 참”(광고에서 내복 입고 나오는 아기 본 적 있어요? 외국 아기들이 신생아 때부터 즐겨 입는 보디슈트라고요!) 흉을 보면서 잽을 날렸다.
육아를 도와주는 엄마에게 효녀가 되기로 결심한 나는 그 자리에서 벌컥 하는 대신 검증을 통해 내 선택의 탁월함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러나 행복해하는 아이를 기대하며 인체공학적 목욕통에 아기를 넣은 순간, 욕조가 깊고 좁아 제대로 씻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엄마의 저주를 받은 그 욕조는 난화분에 물 주는 용도로 전락했다. 보디슈트는 아기 탄생 이후 최대 참사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기저귀를 가는데 아기가 보디슈트에 응가를 싸버린 것. 아기가 옷에 똥 싸는 게 대수랴 하겠지만, 내복이야 단추 풀어 쓱 벗기면 그만이지만 원피스 스타일의 보디슈트는 어른 티셔츠처럼 머리통으로 입히고 벗겨야 하는 옷이다. 그러니 옷 엉덩이 부분의 응가가 어떤 루트로 온몸에 ×칠을 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결국 나는 2라운드에서도 패배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따져보니 엄마의 핀잔을 받은 내 선택들은 요즘 엄마들의 유행과 인기에 편승한 도구나 방법이 대부분이다. 의사의 판단이나 권유보다 자신의 육아 경험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의 완고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 아이 몇을 키워본 숙련된 경험자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초보엄마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이 모든 경쟁의 심판자인 아기는 역시 ‘인체공학적 설계’로 아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아준다는 비싼 수입 아기띠 안에서 울고불고하다가 포대기로 할머니 등짝에만 업히면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바로 잠이 드니 말이다.
김은형 한겨레 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19899520364_4017719899388765.jpg)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