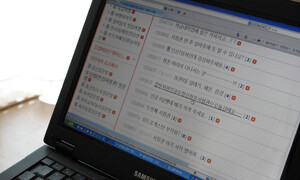숨을 들이쉰 채 허리를 조르고 졸라서 재본 둘레가 30인치를 넘는다. 과연 20인치대로 내려올 날이 있을까. 한겨레 김은형 기자
얼마 전 tvN 을 보다가 화들짝했다.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들의 옷차림에서 맨 처음 나온게 레깅스였다. 속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다나. 입속에 넣으려던 초코칩 쿠키가 뚝 떨어졌다(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 코미디 영화를 너무 본 건가).
내 얘기였다. 임신 중기부터 출산 백일이 지난 지금까지 집에서도 레깅스, 외출할 때도 레깅스, 사시사철 밤이나 낮이나 레깅스 차림으로 지내왔다. 물론 내 스타일에는 여느 청춘의 멋내기와는 다른 사연이 있다. 옛날에 입던 바지가 안 맞는다. TV를 보면서 기가 팍 죽었다. 단지 멋내기 차원이라면 간단히 전략 수정을 하면 되지만 나의 레깅스룩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 국민 의식을 조사한 내용을 9시 뉴스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코미디 프로그램일 뿐인데 좀 과도하게 의기소침해진 내가 의아했다. 더군다나 아기 낳기 전에도 날씬하지 않은 몸매였지만 다이어트도 신경 안 쓰고 신체적 콤플렉스(“아악, 등짝에 얼굴이 달려 있어” “자기는 왜 가슴이 배에 붙어 있는 거야?” 따위의 남편의 무한 반복되는 썩은 농담)에도 별로 예민하지 않던 나였는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출산 뒤 다이어트’ 문제는 산후우울증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것 같다. 산모의 60%가 크고 작게 겪는 문제라지만, 아이를 낳기 전만 해도 산후우울증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오래도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는데 기쁨 충만이지 뭔 우울증?’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엄마와 언니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아이를 봐줬건만 한 이틀이라도 아기와 둘이 씨름할 때면 중학생 대상의 문방구 시집에나 등장하는 단어인 줄 알았던 “외로워”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아이와 둘이 있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우리 둘만 떨렁 내던져진 것처럼 막막한 느낌이 수시로 몰려왔다. 책이나 신문을 볼 수 없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전화 통화조차 쉽지 않으니 이런 고립감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런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었고, 그보다 더한 기쁨은 남편이 사들고 오는 초콜릿 ‘이빠이’ 뒤집어쓴 케이크였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울적하니 단 음식이 젖을 줄인다는 이야기에도 그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물론 지금도) 상황이 이럴진대 다이어트라는 건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바지 단추와 단춧구멍 사이의 거리를 보면서 출산 전 세상으로의 복귀도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도 유모차 끌고 잠깐잠깐이라도 나갈 수 있게 된 지금 종종 지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술 마시고 싶지 않으냐”다. 광고 모델처럼 시원한 맥주 한잔을 원샷으로 들이켜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간절한 로망이 생겼다. 너무 유치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바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노천카페에 앉아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물론 차림은 예전에 입던 청바지. ‘큰 결심 하고 이 동네 놀러왔어요’ 티 내는 지금의 아줌마 레깅스 스타일이 아니라. 누가 청담동의 잘나가는 레스토랑 어디 가보고 싶다, 이태원 물 좋은 클럽에 가고 싶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면 “야, 이 촌것아”하고 비웃곤 했는데 내가 지금 정곡으로 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런 외로움을 타개할 방법을 최근 찾기는 했다. 친한 사람들에게 집에 놀러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다. 이사하고 집들이조차 안 한 너저분한 집이지만, 아이와 둘이 외로워 미치는 것보다는 나아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니 우울감은 한층 나아졌다. 그러나 이 멀고도 먼 바지 단추와 단춧구멍 사이의 거리는 어떡할 것인가. 출산 뒤 뱃살 감량의 비기를 가진 분 댓글 좀 부탁드린다(단, “초콜릿 케이크부터 끊으세요”식의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과목 열심히’ 조언은 사양합니다).
김은형 한겨레 기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말 바꿨단 비난 납득 안 돼”

내부 결속도 안되는데…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다른 세력 손잡아야”

놀아야 산다,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1950년 9월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했던 그 병사, 잠들다
![[속보] 쇼트트랙 황대헌, 올림픽 1500m 은메달 [속보] 쇼트트랙 황대헌, 올림픽 1500m 은메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5/53_17711066437584_20260215500101.jpg)
[속보] 쇼트트랙 황대헌, 올림픽 1500m 은메달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4/53_17710435306389_20260211504219.jpg)
하루 5분 ‘한 발 서기’로 건강수명이 달라진다 [건강한겨레]

심석희가 밀고 최민정이 추월…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행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좌파 칼부림 정점…윤 탄핵 뒤 ‘통일교 게이트’ 우려” 내부 문자 드러나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