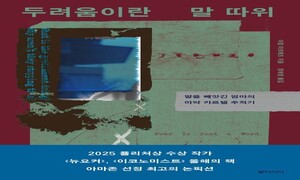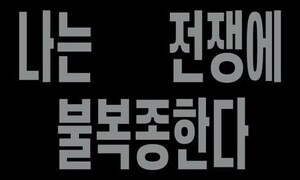84
낯익은 ‘골디락스’(Goldilocks)와 낯선 ‘그리드락’(Gridlock). 그리드락의 재앙은 골디락스의 파티가 한창일 때 슬그머니 찾아왔다.
영국의 는 2004년 중국의 고도성장을 ‘골디락스 경제’에 비유했다. 성장을 이루면서도 물가가 안정된 최적의 경제환경을 말한다. 미네르바가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의 반대 지점으로 보면 된다.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서 유래했다. 세 마리의 곰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금발(gold+locks)의 소녀가 곰의 집에 들어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식어 있는 죽을 먹고 놀았다. 곰 가족이 돌아오자 소녀 골디락스는 열린 창문으로 달아난다. 좀 싱거운 이야기에 조미료를 치면 이렇다. 증시에서 곰은 약세장을 상징한다. 약세장이 만들어놓은 싼값의 식은 죽을 노리고 소녀가 들어왔다. 하지만 곰이 돌아오면 골디락스는 도망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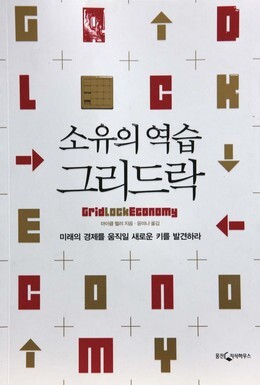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2002년 이후 미국은 뜨겁지도(인플레) 차갑지도(디플레) 않은 골디락스 호황을 누린 것으로 평가됐다. 덩달아 한국 경제도 2007년까지 ‘금발 소녀’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도망을 준비할 시점이었다. 깜박 잠이 든 골디락스는 성난 곰에게 붙잡혔고 동화는 비극으로 바뀌었다. (원제 〈Gridlock Economy〉·웅진지식하우스 펴냄)의 지은이 마이클 헬러 교수는 그 이유를 ‘그리드락’ 때문이라고 봤다.
헬러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서적으로 이 책을 추천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리드락의 연원을 살피다 보면 클린턴의 속내가 다른 데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든다. 그리드락(Gridlock)의 원뜻은 사방에서 진입한 차량들이 뒤엉켜 교차로에서 일으키는 ‘교통 정체’다. 여기에 빗대, 정부와 의회를 서로 다른 당이 지배하는 구도를 그리드락이라고 한다. 여소야대 의회에선 ‘정책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2006년 미국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하원 권력을 탈환했다. 그런데 당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주도 세력이 달랐던 1990년대 클린턴 정권에서 미국 경제가 최장기 호황을 지속했다는 학습 효과가 그리드락을 되레 호재로 받아들인 것이다. 클린턴으로선 그리드락이 집권기의 호황과 부시 후반기의 민주당 약진을 떠올리게 했고, 마침내 2009년 ‘검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는 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저자에게는 결례가 되겠지만 클린턴이 이 책을 추천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헬러 교수는 그리드락을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이 새로운 부의 창출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정체’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현재진행형인 금융위기가 바로 그리드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본다. “미국의 투자은행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위험부담이 큰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저당 체계를 만들어냈다. 은행들은 이 저당권들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위험 수준이 다양한 채권으로 다시 쪼갰다. 이러한 마술 덕분에 금융공학은 위태로운 저당을 안전한 채권으로 변신시킨 듯 보였다. 하지만 저당권을 파편화함으로써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대출이 연체돼도 흩어져 있는 저당권자들은 대책을 합의하기 어려웠다. 돈 빌린 사람이 전화를 걸어 사정할 상대조차 불분명했다. 할 수 없이 은행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차압하고 매각했다. 또 수많은 규제 기관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기관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금융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단일한 기관은 없었다. 결국 수천억달러의 위험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동안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문에는 금융위기와 관련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클린턴이 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그리드락’이란 책 제목만 보고 좋아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또 다른 이유다.

토지 소유자들의 지나친 석유 시추 경쟁은 유전을 고갈시킨다. 1930년께 미 로스앤젤레스 시그널힐의 유정탑 300개 중 일부. 웅진지식하우스 제공
저자는 공유재(commons)와 반공유재(anti-commons)의 성격을 통해 그리드락의 본질을 이끌어낸다. “도심의 공터를 발견했다. 이 마법의 주차장은 공짜고 모두에게 개방돼 있다. 그러나 차츰 다른 사람들도 이곳을 알게 된다. 얼마 안 있어 주차장은 꽉 차버린다.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서로 문짝이 부딪치고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사람들은 다른 유료 주차장으로 가버린다.” 흔히 목초지의 황폐화로 설명되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공유한 것이 가장 소홀히 관리된다”고 말했고, ‘공유의 비극’이라는 말을 만든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재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회에서 최대한의 사익 추구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공유재를 사유화하면 남용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사적 소유자들은 자원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이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작은 조각들을 소유하면 자원 미활용이라는 ‘반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목초지를 너무 작은 단위로 사유화하면 양 한 마리조차 풀을 먹을 수 없다. ‘공유재’ 목초지는 풀이 다 뜯겨 맨땅만 남지만 ‘반공유재’ 목초지는 풀이 무성하지만 뜯어먹는 양들이 없다. 어느 쪽이든 양은 배가 고프다.
공유재의 비극을 반공유재의 재앙으로 맞받아치며, 사유화를 강요하는 자본적 논리의 위험성을 찬찬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다만 소유권의 최적 지점과 정부 개입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못해 갈증은 여전히 남는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청년 피눈물은 안 보이냐”

구치소 김건희 “공책에 편지·영치금 주신 분들 이름 적으며…”

“너 나와” “나왔다, 어쩔래”…국힘, 한동훈 제명 내홍 속 ‘막장 의총’

‘파면’ 김현태 “계엄은 합법, 문형배·민중기는 내란조작범” 궤변

트럼프, 인도 관세 18%로 대폭 인하…“러시아 말고 미국서 원유 구매 합의”

BTS 광화문광장 ‘아리랑’ 공연, 넷플릭스 전 세계로 생중계 한다
![[단독] ‘신라 속국화’의 특급 단서일까…경주 돌덩이에 새겨진 고구려 글씨체 [단독] ‘신라 속국화’의 특급 단서일까…경주 돌덩이에 새겨진 고구려 글씨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3/53_17700700489173_20260202504028.jpg)
[단독] ‘신라 속국화’의 특급 단서일까…경주 돌덩이에 새겨진 고구려 글씨체

이해찬 조문 끝내 안 한 이낙연…6년 전엔 “대표님 뒤를 졸졸”

오늘 귀국 전한길 “체포 못 하게…비행기 내리자마자 유튜브 라방”

1년 만에 31%p 날아간 ‘트럼프 텃밭’…텍사스 상원 민주 손에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