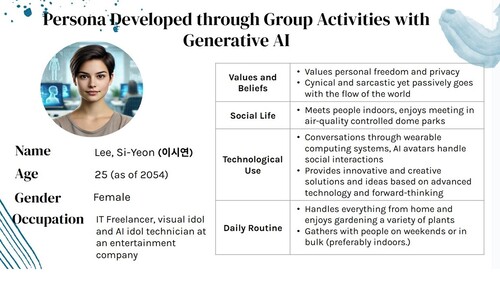백문이 불여일청
오늘은 시 말고 노랫말을 읽자. 언젠가 한번은 그러려고 했다. 시의 본적(本籍)은 노래니까. 본래 노랫말이었으나 노래와 분리되어 떨어져나오면서 지금처럼 눈으로 읽는 시가 되었다. 그러니 시와 노랫말은 여전히 은밀한 혈족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라는 ‘제도’가 아니라 ‘시적인 것’ 그 자체라는 것. 대중음악의 노랫말 속에도 시적인 것이 발견된다면 그 노랫말들이 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제도적 생산물과 달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대중음악의 노랫말에 완강한 문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고리타분한 짓이다. 대중음악에 나름의 룰이 있듯이 대중음악의 노랫말에도 불가피한 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컨대 박진영이 쓰고 있는 원더걸스의 노랫말들은 어떤가. ‘아이러니’ ‘텔 미’ ‘소 핫’ ‘노바디’ 등 한두 개의 영어 단어들을 제목으로 삼고 이를 후렴구에서 유혹적으로 반복시킨다. ‘의미’보다는 ‘울림’을 고려한 계산이다. 문학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대중음악의 노랫말로서는 영리하지 않은가. 그렇다고는 해도, 좀 견디기 힘든 경우들도 있다. “사랑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Red ocean/ 난, breakin’ my rules again/… /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억 개의 나의 Crystal/ 마침내 시작된 변신의 끝은 나/ 이것도 사랑은 아닐까? 오∼.”(, 동방신기)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어설픈 영어 문장과 뒤섞여 거의 아수라장이다. 10여 년 전 HOT 시절부터 이 기획사 출신 팀의 노랫말들은 요령부득이었다. 이 기획사에는 교열부가 필요해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니, 멋진 노랫말들을 더 칭찬해주고 싶어진다. 좀 거슬러 올라가볼까. 한국 대중음악 노랫말의 역사에서 80년대 후반 ‘동아기획’ 사단 뮤지션들의 작품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들의 순정한 구어체 가사는 가요 가사 특유의 클리셰들을 몰아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예컨대 지금은 전설이 된 팀 ‘어떤 날’의 노랫말들은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이병우가 “제법 붙은 뱃살과 번쩍이는 망토로 누런 이를 쑤시는 나의 고향 서울”(, 1989)처럼 쓰라린 문장들도 써내긴 했지만, 이 팀의 감수성은 대개 서정적이었다. 조동익이 훗날 솔로로 발표한 (1994)가 도달한 예술성은 그 자연스런 귀결이다.
광고
90년대 초·중반은 박주연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이영훈, 유재하 등이 있긴 했지만 한국 발라드 노랫말의 표준 문법은 그녀가 만들었다. 울고불고 헤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녀는 다시 돌아오는 자의 복잡한 내면까지 묘사했고 ‘다음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식의 집요한 격정까지 그렸다. 조용필의 , 김민우의 , 김규민의 등이 특히 훌륭했다. 이후 등장한 신해철과 서태지의 역할도 컸다. 엘리트의 철학적 독설, 자퇴자의 비판적 육성이 그들의 무기였다. 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이적의 독특한 서사 충동도 기억해둘 만하다. (2집, 1996)를 들어보면 그가 훗날 왜 소설을 썼는지 이해가 된다.
2000년대 이후 내가 가장 편애하는 작사가는 이소라와 박창학이다. 이소라는 흔한 소재들을 평범하고 순한 단어들로 노래할 뿐인데도 어떤 히스테릭한 깊이에 도달하곤 한다. 그의 노랫말에 은은히 흐르는 리듬감은 특히 일품이다. 그는 아마도 발라드 장르에서 각운(脚韻, rhyme)을 배려하는 거의 유일한 작사가일 것이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6집, 2004) 마지막 세 문장은 정곡을 찌르면서 빈틈없는 보폭으로 걸어간다.
윤상의 모든 음악에 노랫말을 붙이고 있는 박창학은 국어 교사답게 정확한 문장을 구사해서 우선 미덥다. 그가 나 등에서처럼 정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때 그의 노랫말들은 어딘가 어색해지지만, “이젠 출발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한낮의 햇빛이 커튼 없는 창가에 눈부신 어느 늦은 오후/ 텅 빈 방안에 가득한 추억들을 세어보고 있지 우두커니/ 전부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너의 기억들을 혹시 조금 남겨두더라도 나를 용서해”(, 2002)에서처럼 힘 빼고 겸손하게 감정의 기미(幾微)들을 포착할 때 그의 노랫말은 아늑한 관조의 미학 같은 것을 품는다.
최근의 사례로 단연 인상적인 것은 ‘루시드폴’과 ‘언니네 이발관’의 근작들이었다. “날개, 내 손 끝에 닿지 않는 곳, 작은 날개가 생겼네./ 시간, 모질게도 단련시키던. 우리 날개가 되었네.”(, 2007) 루시드폴의 노랫말은 시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다. 그의 서정성은 당대의 시인들과 경쟁한다. “당신을 애처로이 떠나보내고/ 그대의 별에선 연락이 온 지 너무 오래되었지/ 너는 내가 흘린 만큼의 눈물/ 나는 네가 웃은 만큼의 웃음/ 무슨 서운하긴, 다 길 따라 가기 마련이지만/ ….”(, 2008) 언니네 이발관의 독특한 감성이야 이미 유명하거니와, 이 노래는 제목부터가 이미 시적이다. 어색한 듯 결합된 세 어절이 만들어내는 이 쓸쓸한 뉘앙스. 길게 말할 여유가 없어 아쉽다. 백문이 불여일청.
광고
신형철 문학평론가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박지원, 정대철에게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대답이…

이재명 상고심 ‘속전속결’ 1일 선고…대선 최대 분수령

한덕수, 선거사무실 이미 계약…‘무소속으로 단일화 뒤 입당’ 유력

한덕수 부른 국민이 도대체 누군데요…“출마 반대·부적절” 여론 압도

김상욱, 권성동에 반발…“기분 나쁘다고 해당행위 단정은 잘못”

홍준표 “제 역할은 여기까지”…탈당·정계은퇴 선언

김건희 오빠 운영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당국 현장조사

이낙연이 어쩌다 한덕수와…“정치적 무덤, 시대의 엇박자”

“나도 모르게 SKT 폰 해지, 5천만원 인출됐더라…알뜰폰 개통돼”

4월 30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