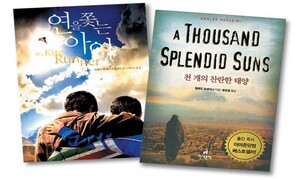‘무사하게’ 독자들에게 도착한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대표작
▣ 태풍클럽 출판 편집자
오늘은 누군가의 험담을 푸짐하게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번역으로만 먹고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번역가 중에는 투잡족이 꽤 많은데, 이들 중에서 편집자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이들은 ‘일부’ 대학교수다. 사실 이분들은 번역을 본업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니며, 세간의 짐작과 달리 번역의 성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제자들에게 번역을 찢어 맡기거나, 문장 토씨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을 몇 년씩 미루는 일이 보통이다. 프로필을 으리으리하게 꾸미는 데 치중하며, 편집자를 조교처럼 부리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몇 년 간 번역을 안 주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연구실적에 보태야 한다며 한 달 만에 책을 내달라고 주문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날 위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게 특징인 이런 ‘교수 번역 프로젝트’들 중에서 위의 특징을 한두 가지쯤 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책을 담당하게 된 편집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

물론 모든 교수 번역자들이 이렇게 상전 행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작품을 국내에 한 편이라도 소개하고픈 마음에 부지런히 출판사를 이곳저곳 드나들며 발품을 파는 분들이 있다. 이들의 노고 덕분에 한두 권이나마 한국에 빛을 보게 된 귀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다만 운이 좋지 않았을 경우, 즉 출판사가 영세하거나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연구자도 의욕만 앞서는 상황에서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초난감’한 상황들이 빚어지기도 한다.
일본 소설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작품들 역시 지난해 눌와에서 펴낸 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렇게라도 나와주었으니 산다’는 심정으로 샀다가 읽으며 적잖은 고통을 겪은 케이스다. 어느 책은 작가를 한국에 소개한다는 자랑스러움이 지나쳤는지, 연구자이자 역자인 자신의 약력을 앞표지에 넣고 정작 중요한 작가 프로필은 뒷날개에 넣었더랬다. 중년 작가와 그의 젊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음증과 성적 긴장을 그린 는 도색소설로 포장되어 나왔고, 그외 대부분의 책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괴이한 장정을 뒤집어쓰고 출판되었다. 이번에 나온 (열린책들 펴냄)은 ‘무사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운명을 용케 피해갔다.
에로틱하고 탐미적 성향을 지닌 다니자키의 작품 가운데 은 매우 독특한 소설이다. 오사카에서 대대로 살아온 명문 마키오카 가문의 네 자매를 그린 이 소설은 풍속소설로서는 가히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기자기한 읽는 재미를 준다. 스토리는 나머지 자매들과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 않은 맏언니를 제외하고 아래 세 자매를 위주로 전개되는데, 일본식 미인인데도 너무 수줍음을 타 혼기를 놓친 셋째 유키코의 혼담과 맞선, 그리고 ‘모던걸’인 막내 다에코와 속 깊은 둘째 언니 사치코의 갈등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오사카 지역의 풍습과 축제, 자매의 일상과 그 소소한 디테일이 이를 통해 철마다 벚꽃처럼, 단풍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스러지며 흘러간다.
살아 있으면 노벨상을 탔을 작가 운운 하는 건 이제 와서는 별 의미가 없고, 예스러운 화식(和式, 일본식)과 경쾌한 양식(洋式)이 공존한 소화시대 초기의 풍속과 일본인들의 마음, 2차대전을 바라본 일반적인 국민 정서 등이 궁금한 독자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한다. 이 책은 이번에 나온 열린책들 판도 좋지만, 1970년대에 나온 한국교육출판공사의 하드커버 버전도 도서관이나 헌 책방에서 구해 읽어볼 만하다. 새 번역은 쉽고 부드러운 반면, 옛 번역은 옛 소설에 어울리는 생뚱맞으면서도 신기한 표현들로 가득하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일반이적죄 등 혐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트럼프 새 관세, FTA 맺은 한국은 유리…기존 세율에 10% 더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미, 이란에 ‘무기한 핵합의’ 요구…협상단, ‘제로 핵농축’에서 물러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