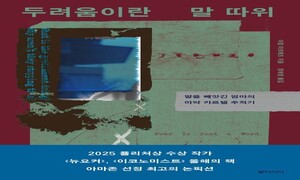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남녀의 소통을 다룬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 유현산 기자 bretolt@hani.co.kr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뗏목 같은 작가들을 이야기했던 때가 있다. 그 ‘뗏목’으로는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서 리얼리즘의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준 김영현이나 신경숙 같은 여성작가가 거론되기도 했지만(청산, 혹은 청승에 가까운 ‘후일담 소설’들은 빼자), <은어낚시통신>에서 시작되는 윤대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상하게도 그는, 그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강 저편의 일들을 말끔히 잊어버렸는데도, 그리고 이제는 ‘중견’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지경인데도, 늘 강가를 서성이면서 그 시절의 불안과 상처를 몽환적으로 끌어안고 흐느낀다. 그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뗏목이었다.
윤대녕의 신작 장편소설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생각의 나무 펴냄)가 나왔다. 이번에 그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낚싯대를 드리우고 안개처럼 자욱했던 ‘불안’의 발생지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나 보다. “나는 내가 청년으로 살았던 80년대와 90년대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건너뛰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 영영 그럴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믿음과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을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소설의 몫인지도 모르겠다.”(작가의 말)
소설에는 원죄 같은 불안을 껴안고 사는 세 인물, 영빈, 해연, 히데코가 등장한다. 이들의 불안은 모두 과거로부터 온 것이다. 80년대 촉망받던 법대생 형이 프락치 소문에 괴로워하다 자살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마저 삶의 의욕을 놓아버린 영빈, 성실한 가장이던 아버지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한 뒤 바닷가 낚시터에서 바다로 휩쓸려가버린 해연, 첫사랑의 남자가 자신과 잔 다음날 자살해버린 재일조선인 히데코. “그녀(해연)가 내 트라우마를 건드렸어요”라는 히데코의 말처럼, 이들은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시점에 묶여버린, “시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영빈은 내면의 불안을 의미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제주도로 날아가 그날부터 낚시질에 전념한다. 낚시를 통해 호랑이와 만나려는 영빈의 이야기 속에 해연과 히데코의 갈등이 끌려들어온다. 부서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이들의 내면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따르게 마련이다. 히데코의 자살을 계기로 한 것처럼, 영빈과 해연은 불안을 정화하기 시작한다. 불안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소통하며 정화돼야 한다. 영빈과 해연의 사랑, 아기는 그 결실이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 대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리게 전개되는 이 소설엔 새로운 이야기 대신 어떤 결기가 보인다. 끝내 뿌리로 돌아가서 상처를 정화하겠다는 작가의 각오다. 그는 이제 뭍으로 올라올 것인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수사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쿠바 “미 고속정 영해 진입해 4명 사살”…미국은 일단 신중 모드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