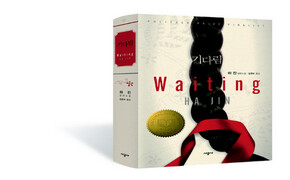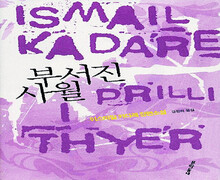〈욕망〉
삶은 선정적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지루한 일상을 견디느라 몸을 비비 꼬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대뜸 반박하리라. 그러나 선정성의 근원이 바로 ‘욕망’이라고 한다면, 다들 입을 다물고 말리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투덜댈 것이다. 쳇, 다 아는 뻔한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거지?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을 갖춘 몇몇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이 책 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제목이 ‘욕망’이라니. 제목만으로도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다 읽어버린 듯한 느낌이 아닌가.
오스트리아의 작은 산골 소도시. 종이공장 공장장인 헤르만과 그의 아내 게르티가 주인공이다. 그들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소설의 주성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르만과 게르티 사이에 지치지도 않고 반복해서 벌어지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연상시킬 만큼 격하고 강간 수준으로 극단적인 성행위의 묘사라고 할 수 있다. 도중에 한 번, 게르티는 미하엘이라는 젊은 대학생과 혼외정사를 벌이지만 결국에는 헤르만에게 잡혀 그의 성욕 해소 도구로 다시 돌아온다. 그날 밤 게르티는 잠든 아들의 머리에 비닐 쇼핑백을 씌워 질식시키고 시체를 강물에 갖다 버린다. 줄거리는 이처럼 간단하다. 아니 어쩌면 이 책에는 줄거리란 것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상태의 줄기찬 묘사’ 이것이 바로 이 소설 자체이다.
이것은 포르노인가. 살덩어리의 행위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3시간짜리 장편 포르노 영화.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저자는, “처음엔 남성 포르노에 대항하는 여성 포르노, 즉 여성이 욕망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포르노를 쓰려고 했으나 그 분야가 이미 남성적 언어에 의해 점유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포르노의 언어와 전형을 파괴하는 작품을 쓰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남성 포르노와 여성 포르노, 안티 포르노 그리고 나아가서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다.
짐승처럼 욕조에 머리를 처박힌 채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게르티에게 우리는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 그녀가 왜 그런 남편을 참아내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 줄기차게 남녀 성기의 모양새를 놀랄 만큼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소설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용어는 정치성,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계급과 권력, 남성의 지배, 가족과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한 섹슈얼리티이다.

엘프리데 옐리네크. REUTERS
이러한 사회적 상징들과 성을 통한 권력관계의 노골적 암시는 사실 21세기 우리에게 그다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에게 성을 제공하고 대가로 생활비와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산업혁명 시대적 설정도 아니고, 성행위 도중 오줌을 싸거나 아들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씌워 죽이는 에피소드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범한 행복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는 작가의 독살스럽고 악랄한 시선과 과격하면서 뛰어난 언어 때문이다. 작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호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정치적 주장과 감정적인 편들기 대신 그로테스크한 언어미학을 그 자리에 갖다놓았고 바로 이것이 문학작품으로서 의 빼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교활한 외설이고 은 그것에 대한 날카로운 찬가다. 그러므로 당신이 임산부나 가정지상주의자라면, 제발 이 책을 읽지 말기를!
수상쩍은 의심 하나, ‘안티 포르노’ 역시 ‘페미니즘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기존 포르노와 동일하게 기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배수아 소설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1549929584_20260203503847.jpg)
현대차노조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 NO…일자리 충격 해법은 [뉴스AS]

‘파면’ 김현태 극우본색 “계엄은 합법…문형배는 조작범” 궤변

막말 이하상, 이진관 판사가 직접 ‘감치’ 지휘…김용현 쪽 “나치 경찰이냐”

장동혁 “이 대통령에 단독회담 요청…16살로 선거 연령 낮추자”

이 대통령, ‘KBS 이사 7인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또 “연명치료 중단하면 인센티브 주자” 제안

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03/20260203503629.jpg)
4398번은 오늘도 감사 또 감사 [그림판]

‘법정 난동’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구치소 수감될 듯

정청래 “합당 여부 전당원 여론조사 어떠냐”...최고위선 또 공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