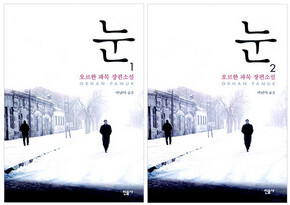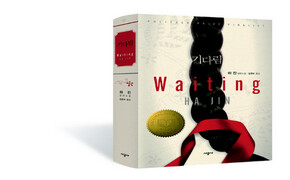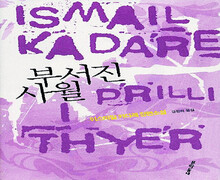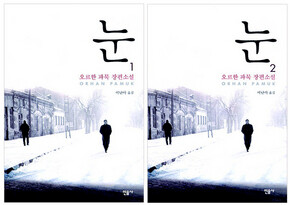
〈눈〉
때아니게 흥청망청 쏟아지는 하얀 눈에 깜박 홀려서 오르한 파무크의 (민음사 펴냄)을 떠올린 건, 물론 나의 실수였다. 그 연상의 철없음이란, ‘발리 상표가 붙은’ 여행 가방을 들고 독일 백화점에서 산 두툼한 털코트를 입은 채, 눈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좇아 터키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전통색이 강한 변방의 도시 카르스를 찾아간 주인공의 행적과 맞먹는다. 이 책에서 아무리 온 세상의 빈곤을 덮으려는 듯 끊임없이 눈이 내린다 해도, 아무리 그 눈이 ‘평생 한 번 우리의 꿈속에서도’ 내리는 눈처럼 신비롭다 해도,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정치적 이슬람주의자의 갈등, 터키 민족주의자와 쿠르드 민족주의자의 반목, 케말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불신, 거기에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까지 얽히고설킨 이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적 문제들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 주인공 카(Ka)는 이미 한 차례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로 등장한다. 대도시 이스탄불의 중산층 출신이며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 시인인 그는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음에도 대학 시절 좌익 데모에 연루돼 체포를 당하고 결국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독일로 망명해야만 했다(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력이 아닌가!). 그 뒤 프랑크푸르트에서 12년간 쓸쓸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잠시 귀국한 것이다. 그런 카가 임시 취재기자가 되어 카르스까지 가게 된 것은,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3일간의 반란에 휘말리게 된 건 순전한 우연이었다. 이스탄불에서 만난 옛 친구가 두 가지 미끼를 던져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일을 그에게 떠맡긴 것이다. 그 미끼는 첫째 12년 동안 변한 터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명분이었고, 둘째 대학 친구인 아름다운 이펙이 그곳 호텔에서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였다.
작가 파무크는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이 주인공이 ‘소녀들의 계속된 자살 사건’을 취재하러 가는 버스 안에 앉아 ‘눈의 정적’ 같은 단어나 떠올리는 못 말리는 시인이며 빈곤과 갈등의 도시인 카르스로의 여행을 속 편하게 ‘행복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향한 회귀’로 받아들이는 대책 없는 낭만주의자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 카가 어느 쪽 미끼에 걸렸는지는 자명한 일, 그에게 정치적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인이자 기자란 딱지 때문에, 특히 독일에서 온 지식인이란 신분 때문에 카르스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정치적 이슬람주의자, 케말주의자, 공산주의자, 정부 관리들까지도 그를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서방서계에 전달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연극 무대 위에서 혁명을 일으킨 배우 수아니 자임의 아타튀르크 케말을 위한 옹호에서부터 신실한 무슬림 네집의 신앙고백, 서양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과격 테러리스트 라지베르트의 열변, 이펙의 여동생 카디페의 이슬람 페미니스트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마치 성명서라도 발표하듯이 돌아가며 카를 붙잡고 자신들의 신념과 입장을 하염없이 털어놓는다. 이 각기 다른 목소리들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어느덧 그것이 카의 새로운 임무가 된다.
결국 오르한 파무크가 2006년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서방세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이들의 목적은 이뤄진 셈이 되었다. 파무크는 4년 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슬람 과격주의자에게 살해된 카를 대신해 그가 뜻하지 않게 떠맡은 대변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카르스란 작은 도시에 마치 각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처럼 모였던 터키인들은 만족했을까? 들은 바에 따르면, 많은 터키인이 “민족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유럽에 팔아먹었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케말주의자는 무능하게 그려진 터키 관료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이슬람주의자는 불경스럽게 그려진 그들의 지도자들 모습에 분노하고, 좌파 지식인은 그저 한물간 세력으로 그려진 데 분노하고….
영리한 파무크가 소설의 마지막 장에 터키인들을 달래기 위한 변명처럼 집어넣은 대화는 나처럼 터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를 위한 위안밖에 안 된 모양이다.
“나는 파즐에게 몸을 돌려 어느 날 내가 카르스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쓴다면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중략) ‘저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저에 대해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말하는 것들을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누구도 멀리서 우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내리는 눈을 봤다고 해서 카르스에 내리는 눈을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다.
최인자 번역가·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