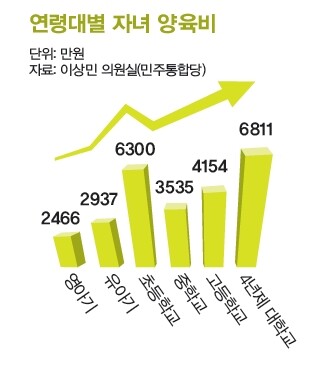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생물학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하지만 인류는 획득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올랐다. 생물학적 유전은 아니다. 문자·기계 등을 통해서다. 인류만의 독특한 문화적 유전이다. 기록의 역사는 인류의 성장사이기도 하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작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왕조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그 정점이다. 실록은 왕의 사후에 엄격한 규율에 따라 편찬·보존됐다. 사관(史官)의 독립성과 편찬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됐다. 사관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실록을 열어볼 수 없었다. 무엇을 넣고 뺄지 왕이나 정승들이 관여할 수 없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태종 4년 2월8일’의 기록이다. 사관은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는 태종의 어명조차 실록에 적었다. 조선의 왕과 양반 관료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게 한 버팀목이다. 지금 우리가 수백 년 전 조선의 실상을 알고자 하면 가장 먼저 실록을 들추는 까닭이다.
조선의 기록문화는 일제 식민통치와 오랜 독재를 거치며 맥이 끊겼다. 독재자들은 뒤탈이 두려워 중요 기록을 불태우거나 파쇄했다. 역사는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825만3715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 그 이전 1~15대 대통령이 남긴 33만 건보다 25배 많은 양이다. 노 전 대통령은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기록문화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다.
새누리당이 10월2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정권 영토 포기 및 역사 폐기 진상조사 특위’를 띄웠다. 가 그날치 1면 머리로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라고 보도하자 박근혜 후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장구를 친 직후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노 전 대통령을 “5천 년 내 최초의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 폄훼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청와대의 모든 기록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차기 정권에 넘겨줄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연계된 비밀문서의 목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2007년 5월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다. 비밀문서는 법에 따라 목록도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인수인계 자료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 ‘역사 폐기’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타도어다. ‘그들’이 떠받드는 미국에선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백악관의 모든 문서를 국가에 이관하지만, 차기 정권 담당자들에겐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는다. 심지어 백악관 전화번호부조차. 이는 뭐라 할 건가.
대통령기록법엔 특정 문서를 30년까지 비공개하는 ‘지정기록물’ 규정이 있다. 공개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쟁에 휘말려 기록이 파기·훼손될 위험을 차단하려는 안전장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지정기록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역사가 웅변하듯, 이 경우 봉인은 은폐의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위한 기록 보호 장치다.
그런데 MB의 청와대가 집권 4년간 생산한 문서는 54만1527건이란다. 참여정부 5년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자 디가우징(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영구 삭제)과 문서 파쇄를 일삼은 MB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행태를 떠올리면 불경죄가 되려나?
*조선왕조실록 관련 내용은 (오항녕 지음·역사비평사 펴냄)을 참고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한동훈 “윤, 계엄 안 했으면 코스피 6천”…민주 “안 놀았으면 만점 논리”

나경원 “‘오세훈 징계 정지’ 원칙 어긋나…안 좋은 평가, 본인 반성부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08840037_20260306502691.jpg)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절차’ 조작 증거 나왔다 [논썰]

60살 이상, 집에서 6천보만 잘 걸어도 ‘생명 연장’…좋은 걷기 방법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7/53_17728477491692_20260305504002.jpg)
‘두번째 기회’는 안희정이 아닌 ‘김지은 동지’에게 [.txt]

이웃국에 사과한 이란 대통령에 “나약”…‘온건파’ 공격 이어져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819701798_20260306502051.jpg)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냈다…위헌심판 기각에 불복

두바이 재벌, 트럼프 직격 “전쟁에 우릴 끌어들일 권한, 누가 줬냐”

뉴 이재명, 밥그릇 싸움인가 정책대결 승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