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의 범인이 쓰던 아이폰을 수거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통화 내용을 비롯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면 배후에 있을지 모르는 공범이나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났다. 아이폰5C 기종의 휴대전화에 암호가 설정돼 있었는데, 이를 풀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10회 잘못 입력하면 내장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도록 설계돼 있다. 수사 당국은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다. 잠금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범인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법원까지 나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듭 이를 거부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이 소비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밝혔듯이 “아이폰 기기 자체의 보안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고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언론은 양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어디까지 권한을 줘야 옳은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도 사설에서 애플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법원이 애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명령하며 근거로 든 법 조항은 1789년 제정된 ‘모든영장법’(All Writs Act)으로, 이 법은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원활한 수사를 위해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지금껏 수사에 협조해왔다. 이미 애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해당 아이폰의 데이터를 FBI에 넘겼다. 수사 당국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백업된 사건 한 달 전부터 테러를 일으킨 시점까지의 아이폰 사용 내역이다.
는 1977년 대법원이 “정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수사 협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한 판례를 인용하며, 아이폰의 보안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애플에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다음번 사건에도 활용하려 할 것이고, 암호 방식이 진화하면 이를 풀어낼 열쇠를 내놓으라는 명령을 새로 내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백도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FBI는 이미 애플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버와 구글의 지메일(Gmail) 데이터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았다. 버라이즌이나 AT&T 등 통신사로부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을 반드시 조사해야겠다며 애플을 압박하는 건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는 지적했다.
팀 쿡은 앞서 여러 차례 정부와 수사기관의 선의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의 생각도 같으리란 법은 없다. 수사기관·정보기관에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만능열쇠까지 줄 수는 없다고 버티는 애플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가정보원이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인 대규모 사찰까지 할 수 있게 된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카카오톡에서 을 선물하세요 :) ▶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멀쩡한 치킨 쌓아놓고…‘배민온리’에 처갓집 속타는 사연

‘공천헌금 1억’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대전·충남 통합 불발되면, 강훈식은 어디로…

대출 연체 ‘5일’ 넘기지 말고…상환 힘들면 채무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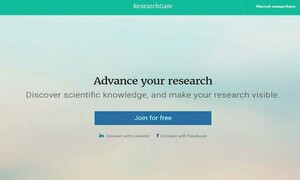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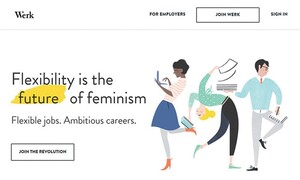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