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제공
잊을 만하면 표준어도 아니고 신조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닌 말을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려놓는 분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에게 “중간에 자꾸 겐세이(‘견제’라는 뜻의 일본말) 놓지 마라”고 해서 ‘겐세이’란 말의 뜻을 찾게 했던 그는, 이번엔 야지(‘야유하다’는 뜻의 일본말)를 실검에 올려놨다. 모두 비속어다.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어제 ‘야지’를 놨는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방 중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야유하며 발언을 방해했다며 ‘야지’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야지’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우리가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 ‘야지’를 놓은 기억이 없다. 품격을 갖추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료 의원 질의에 ‘야지’ 놓는 의원은 퇴출해달라.”(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발언 때 ‘야지’를 안 놨습니까? 대단히 품격 있으시다.”(장제원 의원)
야지는 ‘까닭 없이 덩달아 떠들어대는 일, 아유, 놀림’ 등의 뜻을 가진 일본말 ‘야지우마’(やじうま)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서 ‘야지’로 검색해보니 1950년대 1~4대 국회 본회의에서 “야지하지 마시오”라며 종종 쓰던 말이었으나, 이후 1995년 한 차례 나온 이후 쓰이지 않았다. 이은재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죽어가는 말’을 되살린 것이다. 참고로 이 의원은 지난 8월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있다며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지’ 논란에 앞서 예결위 회의에선 ‘한주먹’ 공방도 있었다. 11월5일 예결위 회의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독해 능력도 없는 게 국회의원이라고!”(박완주), “너 나와!”(박완주), “나가서 붙어!”(장제원), “쳐봐, 쳐봐!”(장제원) 하며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박 의원을 가리키며 “한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도 했다. ‘야지’나 ‘한주먹’이나 말만 놓고 보면 시장이나 거리에서 벌어진 ‘싸움판’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의 ‘야지’ 공방이 진짜 ‘겐세이 놓고’ ‘야지 놓는’ 대상은 따로 있다. 바로 예산 심사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온 다른 의원들과 정부 예산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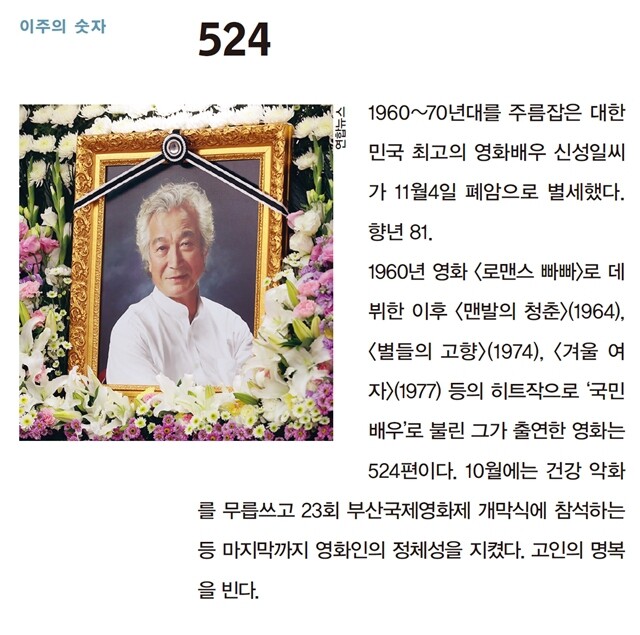
블라블라/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
부정한 부정의 역사

연합뉴스
1993년 5월8일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립대 부정입학자 학부모 명단을 공개합니다. 장강재 한국일보 사장 딸은 1991학년도 성균관대에, 백상승 전 서울시 부시장의 딸은 1991학년도 건국대에 부정입학, 김영식 전 문교부 장관 아들은 1989학년도 고려대 경영학과에 부정 ‘편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죠. 교수 13명(당시 신문엔 교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을 비롯한 교직원 자녀 52명이 성균관대 1991학년도에 부정입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학부모가 ‘그 시절이 제일 공정했다’며 강한 향수를 느끼는 ‘학력고사’ 시절에도 어긋난 ‘부정’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대학 입시의 유형이 정시냐 수시냐, 또는 수능이냐 학종이냐는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늘’(SKY)이 있고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이상.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증시 더 달굴 듯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