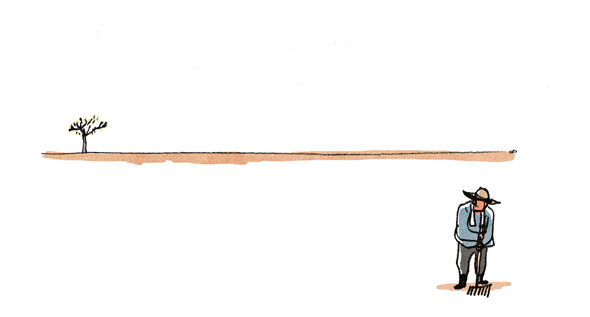유산은 없는데 유품은 많은 경우가 있다. 내가 그러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많은 물건들을 남겼다. 책, 모자, 신발, 전자제품, 자전거 등등. 어떤 유품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처치 곤란이다. 일부는 과감히 팔거나 없애야 할 때도 있다. 나머지는 그 앞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다.
더구나 아버지의 유품들은 대부분 남성 취향이기에 어머니가 사용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런 걸 샀다냐?” 어머니가 불평조로 내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것도 있다. 바로 화초들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꽃시장에서 화초들을 사와 가꾸는 것을 즐겨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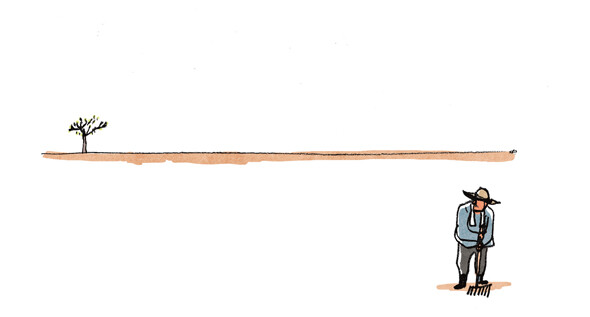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것은 화초라기보다 화초를 가꾸는 행동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남은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화초들이 수명을 다하면 그 자리를 어머니의 화초들이 채웠다. 어머니는 화초에 정성껏 물과 비료를 주었고 필요하면 그것들을 신선한 흙이 담긴 새 화분에 옮겨 심었다.
화초들은 잘 자랐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 것도 어느 날 보면 초록 잎과 가지를 틔웠다. 봄이면 베란다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엄마, 원래 화초 잘 키우세요? 내가 키우면 다 죽던데.”
어머니가 답했다. “나도 너처럼 그랬어. 평생 제대로 화초 하나 키워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참 잘 키웠어.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 내가 화초 잘 키우는 사람으로 바뀌네. 신기하지?” 나는 화초에 물을 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바로 저 뒷모습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겨줬구나.
어머니는 가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 꽃구경 오라는 거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 친구들의 방문이 있었는데, 다음날 어머니가 나에게 푸념을 했다. “얘, 엄마 친구가 군자란을 보더니 이런다. ‘나는 군자란은 너무 화려해서 싫어.’ 그이는 말을 왜 그리 할까? 저 여린 것이 겨울을 견디고 꽃을 활짝 피워내는 게 놀랍지도 않나봐?”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아마도 그분에게 화초는 그냥 예쁜 이미지에 불과한 거겠죠. 하지만 엄마는 화초를 성심성의껏 돌봐주면서 꽃이랑 이파리가 돋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 엄마한테 화초는 자연스레 이미지가 아니라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로 보이는 게 아닐까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문득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이창근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얼마 전 나와 송경동 시인과 이윤엽 판화작가는 공장 앞에서 이창근과 화상통화를 했다. 송경동이 이창근에게 웃으며 말했다. “봄이 오고 있네.” 그러자 이창근이 말했다. “에이, 시인의 표현이 뭐 그래요. 봄은 오는 게 아니라 일구는 거라고요.”
나는 그때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대화 중에 깨달았다. 어머니는 화초를 키우며 베란다에 봄을 일구는구나. 이창근도 저 굴뚝 위에서 봄을 일구고 있구나. 어머니와 이창근이 비좁은 공간에서 죽은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일구는 봄 속에는 생명의 분투와 삶의 가능성이 가득하구나. 누구에게는 저기 먼 데서 봄이 올 테지만 누구는 바로 여기서 봄을 일구고 있구나.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봄을 일구고 있는가? 내가 쓰는 글들 속에 생명과 삶을 키우고 있는가? 나는 황무지 위에 서 있는 농부가 된 느낌이다. 농부는 주먹을 쥐고 있다. 농부는 주먹 안에 한 줌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것을 모른 채 고랑을 파고 이랑을 쌓는 농부의 심정으로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두렵고도 설렌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2/53_17733006909357_20260312502955.jpg)
관세와 미사일, 양손에 쥐고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 [아침햇발]

이란, 종전 조건 ‘불가침·배상금’ 제시…미국과 평행선

내일부터 휘발유 100원 더 싸게 산다…정유사 출고 최고액 ℓ당 1724원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12/20260312503676.jpg)
손녀와 초등학생 [그림판]

오세훈, ‘장동혁 2선 후퇴’ 압박 초강수…서울시장 추가 모집 ‘버티기’

‘대출 사기’ 민주 양문석 의원직 상실…선거법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