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이야기부터 하자. 태평양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대대적인 적의 공습을 두려워하던 와중에 동물원 걱정까지 한다. 폭탄 투하로 동물원이 파괴되어 동물들이 뛰쳐나가 사람들을 공격할까 걱정된 군은 맹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사육사들은 가슴 아파하며 동물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독이 든 먹이를 준다. 문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서울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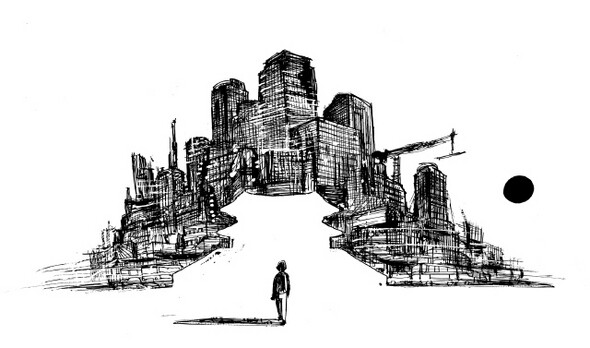
입 없는 것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1945년 7월25일, 창경원의 일본인 책임자는 이미 도쿄에서 명령이 시행됐다며 사육사들에게 극비리에 독약을 나눠준다. 그날 밤 창경원에서는 저녁 식사에 섞인 독약을 먹은 150여 마리의 동물들이 밤새 울며 죽어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망국의 한을 동물을 키우며 달래던 궁궐에서 그야말로 한낱 구경거리 동물원으로 전락한 창경원, 그 비운의 장소에서 동물들은 해방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이다. 단지 미군의 공습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경술국치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등 굵직한 역사적 기념일(?)을 맞는 올해, 역사의 현장에서 희생된 동물들 얘기부터 꺼낸 이유는 인간은 오죽했겠나 싶어서다. 더불어 가끔 그렇게 입 없는 것들의 고초가 마음을 짠하게 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2년 전 불타 쓰러진 숭례문의 복원공사 착공식을 보는데 불쑥 그 옛날의 창경원 몰살의 밤이 생각난 것도 비슷한 연유일 거다. 사람도 고생이 많고 사람이 아니어도 고생이 많단다. 하수상한 세월에 태어나면 말이다.
숭례문의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남대문시장 옆 도로 한복판에 매연을 덮어쓴 채 무인도처럼 떠 있던 말로만 국보 1호였던 남대문 시절에는 ‘남남남대문을 열어라’라는 노랫말에 나오듯 그것이 ‘문’이었던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다. 구한말 사진 자료를 통해 올망졸망 낮은 초가집과 기와집들을 양옆으로 넉넉히 껴안고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숭례문을 보고서야 나는 그것이 ‘문’임을 깨달았다.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전 숭례문은 과연 친근하고 위엄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였다.
내가 숭례문의 과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소설을 쓰려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보게 된 사진 한 장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전쟁이 나기 몇 달 전 ‘WELCOME. U.S. NAVY!’란 선전 간판을 문루 2층에 떡하니 달고 있는 숭례문의 모습이었다. 꽤 충격적이었다. 아니 대통령배 배구 경기가 열리는 장충체육관도 아닌데 대문짝만한 고딕체 표어라니.
그 뒤 숭례문의 과거 흑백사진들을 접할 때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은 되풀이됐다. 성벽 제거가 시작된 1907년 일본 황태자의 방한을 맞아 오만하게 으스대며 세워진 봉영문(귀인을 맞이할 때 세우는 문이란다)에 가려진 숭례문은 그때부터 이미 질곡의 근현대사를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은 듯 보였다. 일제에 의해 싹둑 날개 잘린 새처럼 성곽이 잘려나간 뒤 숭례문의 데커레이션은 참으로 다양하게 변화했다. 국가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간판을 이마에 붙였고, 조명등을 달았고, 담쟁이넝쿨을 입었다. 진동이 요란한 전찻길을 들이니 사람들이 멀어졌고 명색이 문인데 꽁꽁 닫히게 되자 찻길 한가운데 덩그러니 나앉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포격을 맞아 의식불명 직전에 놓이기도 했던 숭례문은 그렇게 모진 풍파 다 이겨내고서 허무하게 방화로 무너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숭례문이 불타던 밤, 나는 낑낑거리며 소설집 원고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다들 그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거다. 이상하게 그 밤의 기억은 유독 또렷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숭례문은 그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거라고. 그날 숭례문은 토지 보상 문제로 열받은 우리를 보고 있었을 거다. 2년 뒤 다시 양옆에 부러진 날개인 성곽을 달고서 돌아온단다, 숭례문이.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숭례문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지민 소설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한덕수 23년형 선고’ 이진관 판사, 박성재에 “계엄 반대한 것 맞냐” 송곳 질문

김민석 “서울시 추진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검토”
![[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 [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9/53_17706239393914_20260209503251.jpg)
[단독]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못박은 여당에 “매끄럽게 한목소리 내야”

합당·특검 ‘계파 갈등’, 보완수사권 ‘당청 불화’…수세 몰린 정청래

“배신자 될래?” 전한길 최후통첩에 반응 없는 국힘

한미연합사단 한국 부사단장에 첫 여성장군 문한옥 준장 취임
![그 눈빛…혹시 우리 보는 거야? [그림판] 그 눈빛…혹시 우리 보는 거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9/53_17706343870542_20260209503732.jpg)
그 눈빛…혹시 우리 보는 거야? [그림판]
![[단독] 쿠팡,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부담하기로 [단독] 쿠팡,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부담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9/53_17706359241826_20260209503772.jpg)
[단독] 쿠팡,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부담하기로
![[단독] “무안공항보다 246배 위험”…조종사협회, 가덕도신공항 조류충돌 우려 [단독] “무안공항보다 246배 위험”…조종사협회, 가덕도신공항 조류충돌 우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9/53_17706188495138_20260209502634.jpg)
[단독] “무안공항보다 246배 위험”…조종사협회, 가덕도신공항 조류충돌 우려

‘역사적 압승’ 이끈 다카이치…1946년 제정 ‘평화 헌법’ 최대 기로


















![[단독]건설 경기 어렵다고 순금 ‘뇌물’ 시도? [단독]건설 경기 어렵다고 순금 ‘뇌물’ 시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6/53_17703650106529_202602055042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