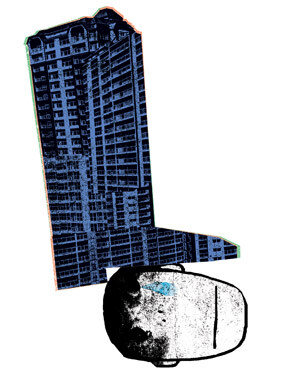▣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참 볕 좋은 곳이었다. 낡은 외관에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어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지만 계단참에 화분을 놓아 고추와 상추를 심고 끼니때마다 하나둘 따먹는 재미가 있었다. 좁은 창문으로나마 북한산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고 양복 입은 사내들이 건물을 몇 번 오르내리면서 이사한 지 2년 만에 짐을 빼야 할 처지가 됐다. 급하게 새 사무실을 구했지만 사방이 건물로 막힌 그곳에서 북한산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고추 심을 계단참도 없다. 그럼에도 올라버린 시세에 보증금과 월세 모두 지금의 두 배다 보니 이달부터 가난한 인권단체, 허리가 휠 판이다.
성장의 시작과 끝, 빈곤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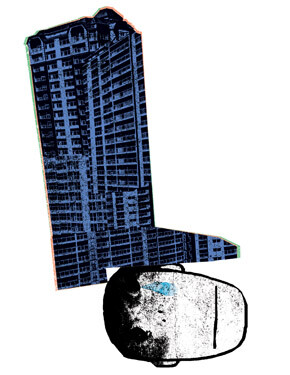
온 나라가 재개발 광풍에 휩싸인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속에 시작된 재개발로 서울이 들썩이더니, 이제는 그 당시 재개발의 열풍에 쫓겨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곳, 하월곡동, 중계본동, 상계동 등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마저 뉴타운 사업 속에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있다. 없는 이들 살림에 재개발은 장밋빛 꿈같은 환상. 거주지가 개발돼 보상을 받으면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기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더 비참한 삶뿐이다. 거대한 개발이익은 투기자와 외지인들의 배만 불릴 뿐,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30%에 불과하다. 이도 대부분은 높은 아파트 입주금을 감당할 길 없어 은행에 손을 벌렸다.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들 역시 급작스레 올라버린 전세금과 월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은행에 손을 벌리고도 더 외곽으로, 지하실 사글세방으로 모여든다. 이자에 삶은 팍팍해지고, 개중 일부는 체불이자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니 취직도 어렵다. 그뿐이 아니다. 보상금을 놓고 이웃사촌은 상종하지 못할 원수가 되어버리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갈 곳이 없어 최후까지 버틴 주민들은 철거용역의 횡포 앞에서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내몰린다. 미친 듯 재개발이 이뤄지고 아파트가 올라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이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집 부자들이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 한 채 한 채 더 보태는 현실도 변하지 않는다.
이쯤 되다 보면 뒤집어질 만도 한 세상인데, 여전히 득세하는 건 경제성장의 논리. 행복한 삶을 위해선 경제성장과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 하지만 없는 이들에게 경제성장의 시작과 종착은 빈곤과 내몰림의 악순환에 불과하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없는 이들의 삶은 더욱 파괴될 뿐이다. 인간을 위한 개발이 아니어서 그렇다.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은 좀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지, 가족을 가꾸며 자식을 키우며 일상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지, 공동체와 문화 등이 파괴되진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혹여 개발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인간을 중심에 둔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시작과 과정, 종결에서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하여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은 어느 순간 실종되고 상품이 된 집과 돈이 되는 땅만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없는 이들의 설움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환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 혹은 아파트를 새롭게 올리는 일이 아닌, 없는 이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이다. 빈곤을 심화시키는 덫일 뿐이다.
37년 전 화두를 붙잡고 제자리걸음
1971년 8월10일, 광주대단지(현 경기 성남 지역)에서 도시 빈민들의 항거가 있었다. 광주는 서울시가 도시 개발을 위해 도시 빈민이 살던 무허가 건물을 대규모로 철거하면서 생겨난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집단 정착지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허하지 않았다. 무허가 가옥. 상수도, 전기, 교통 등이 결핍된 도시에서 그들은 삶의 비참함과 동시에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결국 분노는 외침이 됐다. 이들의 항거는 ‘난동’ 또는 ‘폭동’으로 정권에 의해 명명되었고 22명이 구속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들의 외침은 미약하나마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최초의 주거권·생존권 싸움이 있은 지 37년. 여전히 같은 화두를 붙잡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럽게 되물어진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사항에 해당될 내용”

“서울마저” “부산만은”…민주 우세 속, 격전지 탈환이냐 사수냐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태진아 이어 이재용 ‘윤어게인 콘서트’ 퇴짜…전한길 “이재명 눈치 봐요?”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9809613_20260222502135.jpg)
국가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가 [한승훈 칼럼]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개헌 투표 가능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557735175_20260222502090.jpg)
[사설] ‘무기징역’ 빼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1심 판결

‘허술한데, 한번 털어볼래?’…462만 따릉이 계정 유출 혐의 10대들 송치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