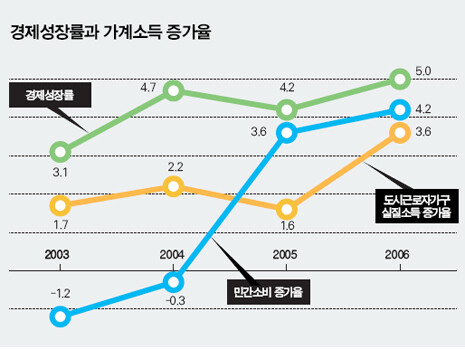▣ 정재권 한겨레21 편집장 jjk@hani.co.kr
조갑제 전 사장에겐 흔히 ‘극우 논객’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남다른 열정과 집요함을 갖춘 기자라는 ‘다른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가 1986년 내놓은 (한길사 펴냄)는 ‘기자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통합니다.
오휘웅은 1979년 처형된 살인범입니다. 그는 1974년, 평소 정을 통해온 두이분이라는 여인의 교사를 받아 두씨의 남편과 두 아들을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휘웅은 재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을 주장했습니다. 사형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두이분의 자백이었는데, 정작 두씨는 1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휘웅은 사형이 집행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조갑제는 나중에 이 유언을 전해듣고 3년 동안 사건의 진상을 캤습니다. 해묵은 수사·재판 기록을 뒤지고 수십 명의 관계자를 만난 뒤, 오휘웅의 무고함을 확신하며 쓴 기록이 입니다.
조갑제의 확신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휘웅 사건의 전말을 ‘조갑제 프리즘’만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 갖는 한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뒷북’일 수 있고 ‘실익’도 크지 않은(오휘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오휘웅 사건을 물고 늘어진 그의 문제의식만큼은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어느샌가 우리에게 내재돼 있는 ‘제도에 대한 맹신’을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위주의가 몸에 밴 탓인지 우리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결정을 좀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 여론의 심판마저 끝난 경우라면, 그 실체적 진실에 눈길을 주려 하지 않기 십상입니다. ‘석궁 사건’이라 이름 붙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일 겁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젠 잊혀진 채로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정조준해 배를 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을 부인합니다. 한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증언과 소견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들이 김 전 교수를 자유롭게 만들 정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한결같은 외침과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또 다른 오휘웅’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다시 이 사건의 ‘추적’에 신발끈을 조여매는 것은 작은 관심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소박한 믿음 때문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중과세 무관 ‘1주택자 급매물’도 잇따라…보유세 부담 피하려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