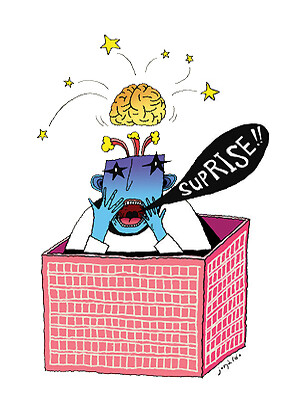▣ 김창석 한겨레 교육서비스본부kimcs@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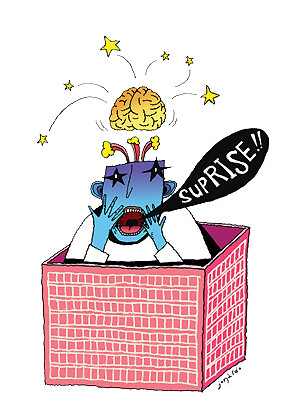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면 많은 이들이 이 문구를 곧잘 인용한다. 과거의 단순한 사실에다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영국 역사학자 E. H. 카가 라는 책에서 언급함으로써 대중화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문구도 내용을 완전히 담지는 못하고 있다. 원문은 “History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만 남고,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역사에 대한 논리적인 글에서 이 문구는 이제 너무 식상한 표현이 되어버렸다. ‘상투어구’(‘클리셰’라고도 한다)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이 문구를 인용한다. 역사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있어 보이는’ 표현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읽는 이도 똑같은 문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글에서 그 문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보라.
일기 같은 사적 기록을 빼고 공적으로 쓴 모든 글에는 그 글을 읽을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읽는 이를 고려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점은 글쓰기의 제1원칙에 속한다. 글이 오래도록 인상 깊게 읽는 이의 기억에 남으려면 무엇보다 읽는 이의 뇌를 자극해야 한다. 그런데 ‘뇌를 깨우는 글쓰기’를 하려면 뇌세포가 어떤 경우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는 보통 예상 가능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더라도 미세하고도 통상적인 수준의 반응만 보인다. 그런데 예측한 일이 보기 좋게 빗나가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인간의 뇌는 긴장하게 된다.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이 이미 입증한 내용들이다. 개그나 코미디를 보면서 웃는 순간을 돌이켜보라. 그 순간은 항상 자신이 예상하는 내용이 뒤집힐 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남들이 뻔히 예상하는 내용으로 글을 채운다.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글을 채운다면 읽는 이의 뇌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들도 다 아는 내용이나 표현을 자신의 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글을 죽이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 두 문단 이상 지속되면 읽는 이는 글읽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도입부부터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을 맞닥뜨리는 순간, 뇌는 긴장하게 된다. 주목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 다음 문단에서는 무슨 사례를 쓸까 하는 궁금증이 샘솟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도입부의 주목도만 강조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글 전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글 전체를 새로운 얘기로 채울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면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문구를 쓰는 대신 정조나 세종을 다룬 최근의 역사드라마를 끄집어내 역사적 상상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해보는 것은 어떤가.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고민과 통찰력을 보탠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이 차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란, 두바이금융센터 공격…신한·우리은행 지점 있지만 인명 피해 없어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미 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