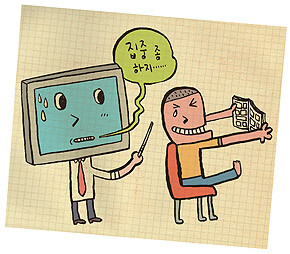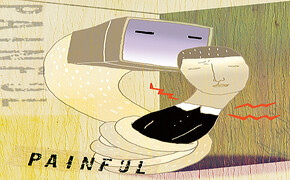▣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뛰 띠띠띠띠 뛰이~.”
한참 동안 기계음을 참아야 했다. 신호가 끊겨 에러가 나면 낭패다. PC통신 시절, 모뎀으로 사이버 세상에 가 닿던 시절의 이야기다. 접속 중에는 집전화가 안 되니 엄마의 눈치도 봐야 했다. 대학에 입학한 90년대 말, 학교에서는 PC통신 나우누리를 통해 수업 하나를 진행했다. 아이디는 자신의 학번으로 통일했다. 접속을 해 ‘교수님 말씀’을 흘끔 보고 나면 동기들이 우글대는 토론방으로 달려갔다. 채팅을 실컷 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괜히 반가웠다. 그곳엔 대학생이 됐다는 설렘에 새 미디어를 접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새 천년이 오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니 사이버 강의도 ‘업그레이드’됐다. 우선 학생들이 접속 자체에 에너지와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졌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좋아지니 교수님이 큰 그림 파일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렸다. 게다가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모여 놀던 ‘PC통신 강의’에서 진보해 서울에서 제주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한데 클릭으로 출석하고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PC통신 땐 오프라인 시험) 꾀가 생겼다. 사이버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했다. 시험은 다 같이(여기서 ‘다’란 그 강의를 함께 듣기로 약속한 친구 그룹) 인근 PC방에 모여서 치렀다. 공동으로 한 명의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베끼는 식이었다. 학생들끼리 ‘모르는 사이’다 보니 게시판·토론방도 썰렁. 사이버 강의 덕에 ‘주4파’(일주일에 4일 등교)가 되어 남는 하루는 그냥 ‘휴일’이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회사에 오니 또 ‘사이버 교육’이 나를 맞는다. 외국어 교육부터 사내 연수까지 ‘사이버’로 안 되는 것이 없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의지를 불태우며 수강 신청을 했다가도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야 ‘아차’ 한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이래저래 효율적인 ‘사이버 수업’에서 나는 그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고가 덜 들어가 애정도 덜 생기는가 보다 생각해왔다.
최근 이런 내 ‘경험적 결론’에 반하는 두 가지 소식이 들렸다. 첫째는 사이버 대학의 꾸준한 성장이다. 2001년 처음으로 문을 연 사이버대학은 2008년 현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만 17개로 늘었다. 학생 수도 6만5천 명에 이른다. 그들은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 오프라인 대학생들과 비교해보면 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우선 사이버 대학생의 경우 “공부가 하고 싶거나 필요해서” 입학·편입한 경우가 많다. 서울사이버대 남상규 교무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직장인·자영업자·전업주부 등이며 상당수 졸업생이 학위나 자격증을 활용해 전직한다”고 말했다.
학교도 ‘열공 모드’를 부추긴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코넬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끌어왔다. 시험과 리포트는 더 꼼꼼히 체크해 ‘Ctrl c+Ctrl v’를 가려내고 재학생-신입생 멘토링 제도를 통해 소속감과 흥미를 더해준다. 인터넷프로토콜(IP) TV를 통한 수업을 준비한 학교도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지역별로 전임교수를 지정해두고 학생들과 만난다. 2007학년도 1학기에 35회, 2학기에 25회의 지역 모임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사이버 강의만을 통해 일본어 마스터 단계에 이른 한 선배의 소식이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정말 하고 싶은 공부면 그렇게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취업 준비에 바쁘답시고 ‘주영파’(등교 않는 학생)가 되기 위해 사이버 강의를 기웃거리는 대학교 4학년생이라면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 사이버 수업을 ‘사이비 수업’으로 만들고 나면 후회는 학생의 몫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19899520364_4017719899388765.jpg)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