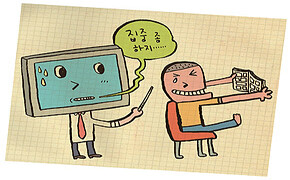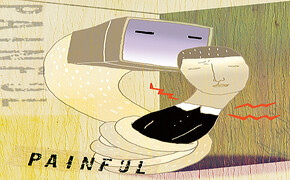▣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가까운 미래에는 휴대전화로도 TV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린가 싶겠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가 ‘신기술 예측’이었다. 지금이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디자인이 예쁜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있어도 안 보게 되던걸” 하며 DMB를 외면하기도 한다. 불과 3~4년 만에 말이다. 기술의 진보도 인간의 망각도 엇비슷하게 빠르다.

그런 ‘3~4년’을 법안 통과에만 쏟은 신기술이 있다. IPTV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본다는 개념의 IPTV는 2003년부터 방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네 마네 하더니 2007년의 끝자락을 잡고서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해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IPTV 준비한 지 4년도 더 됐다” 하고 언론사들은 ‘IPTV 법제화 일지’에서 그 시작을 2004년 10월로 기록한다. 2005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융합화 추세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고 2006년엔 이재섭 IPTV 포커스그룹 부의장이 “한국 IPTV, 올해 넘기면 경쟁력 없다”고 했다.
IPTV를 포함해 ‘방송통신 통합기구 출범’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디어정책 공약이었다. 취임 뒤, IPTV는 ‘방송’이라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서비스’라는 정보통신부 사이에서 표류했다. TV가 컴퓨터를 먹느냐 컴퓨터가 TV를 먹느냐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여기에 각 기업들의 이해관계도 엉켰다. 케이블TV 업계는 긴장했고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기대했다. 법안이 붕 떠 있는 사이 착실히 미래를 준비한 이들도 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고 NHN은 KT와 손잡았다.
그리하여 연초부터 IPTV 수혜주가 떴고 방송·통신 관련 기업이나 협회는 저마다 신년사로 IPTV 시대를 맞는 소감과 각오를 내비쳤다. 일단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3개월간 정통부와 방송위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송통신특위 소속인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쪽은 “당연히 잡음이 있을 것을 염려해 3개월을 정해놨으니 정부에서 안 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모두들 “융합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기술·산업 간 융합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에 돈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했다. 하지만 융합으로 신기술이 나오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 기존에 굳어진 조직과 사고를 어떻게 유연하게 할지에 관한 답은 없다. 벌써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는 미디어정책과 관련된 분과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인사도 없어 IPTV와 같은 융합 기술을 논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하기는 쉬운 기술 융합,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할 작정이라면 부처 간, 집단 간 갈등의 융합도 신경써야 한다. 3~4년 뒤에도 “융합 기술 법안 통과에 3~4년이나 걸렸다”는 한탄의 소리가 나온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룰라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받고 미소…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19899520364_4017719899388765.jpg)
[속보]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한 수단 쓰겠다…소득세 대체할 것”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에 미-중 전투기 대치 사과’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