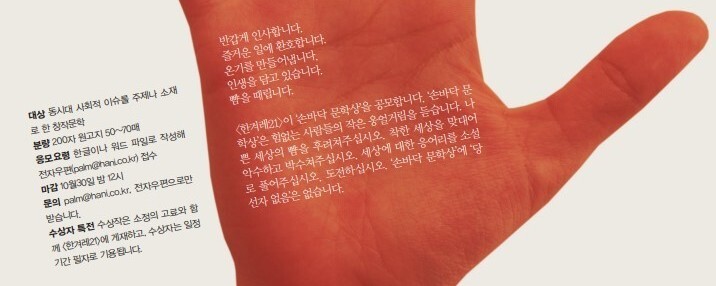퇴근길 저녁 갑작스레 비가 내리면 지하철역 출구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꺼내 펼칠 수 있는 것이,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날 아침 예보에는 ‘저녁부터 비’라고 돼 있곤 하지요. 저는 오늘도 아니고 ‘지금’만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출구에서 망설이다 그냥 뛰어나가는 쪽입니다. 날씨 확인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의 날씨’ 기사를 자주 읽습니다. 손바닥문학상 주제를 ‘오늘의 날씨’로 정하고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손바닥문학상 응모자를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듯이요.
손바닥문학상이 시작된 것은 15년 전, ‘누구나 소설 쓰는 시대’라는 표지이야기를 썼을 때입니다. 소설 공모제가 많이 늘어나고, 공모전 등에서 응모작이 폭발적 급증을 보이던 것을 ‘현상’으로 삼아 쓴 기사였습니다. 편집장은 성질이 꽤나 급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편집장은 “그러면 우리도 만들지, 뭐” 한마디 했고, 어느새 저는 알림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손바닥문학상’이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담배 피우는 손을 보고 떠올렸을 수도 있고, 글씨 쓰는 손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지인이 ‘폭발하는 문학적 영감’을 받아 소설을 썼던 때의 에피소드가 기억납니다. 폭군으로 군림하던 사장의 이런저런 지시에 응하다보니 회사를 나서게 된 것은 새벽에 가까운 시각. 도시(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된 ‘출판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동료와 함께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탄 사연이 궁금해 물어보는 택시기사에게, 회사 동료와 함께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던 택시기사는 순진한 출판편집자는 상상도 못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회사는 확 불을 질러버려야 해.”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였지만, 지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방화’ 소설을 써서 ‘나도 작가’ 뭐 이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이트에 올렸다가 조회수도 낮고 부끄럽기도 해서 삭제했지요. 그런데 글 쓰는 중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쾌감이 있더라고요.”
정세랑은 에세이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에서 편집자를 하다가 소설을 쓴 계기를 풀어놓습니다. “스스로를 이야기가 지나가는 파이프 정도로 여기는 편인데, 그 통과가 지연되면 문제가 생기고 마니 사실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 같은 ‘파이프형’이라면, 창작물이 안에 고일 때 괴롭고 내보내야 머릿속의 압력이 낮아진다면 당신도 창작을 해야 한다.”
무릎을 주무르며 “오늘은 비가 오려나” 하는 할머니가 ‘날씨 예보관’인 것처럼 손바닥문학상의 ‘오늘의 날씨’도 정확하게 주제를 겨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의 강수량을 확인하고 노을 색깔을 확인하는 농부나 바람 세기를 살펴보고 너울 높이를 가늠하는 어부의 날씨 기록 자체가 글감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날씨 인사로 편지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을 이야기 소재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 십센치의 노래 <10월의 날씨>에는 예보에는 없던 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날씨를 믿은 그를 비웃지만 믿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빗물이 내리면 눈물이 흐르는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날씨’라는 하루하루의 기록으로 ‘지구의 위기’를 포착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11월2일)의 날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역대급 따뜻한 가을… 아침 기온 평년보다 10도까지 높아’.
뜨거운 영감이 지나가는 ‘파이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마감은 11월12일입니다.(공모 내용은 ⇒제15회 손바닥문학상 알림 참조)
구둘래 편집장 anyone@hani.co.kr
*만리재에서는 편집장이 쓰는 칼럼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값싼 드론 앞세운 인간 사냥…우크라이나에는 ‘후방’이 없다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모든 수입품’에 15% 관세…세계 무역질서 뒤엎은 트럼프

최시원, 윤석열 선고 뒤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법적 대응”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