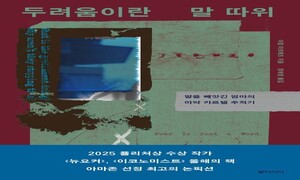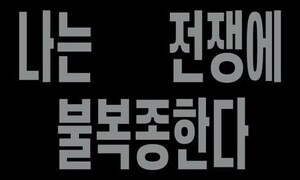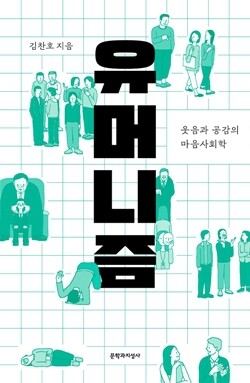
16세기 문인 임형수는 조정을 비난하는 벽서를 썼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았다. 사약을 마시기 전 그는 옆에 있던 의금부 서리에게 한마디 던진다. “자네도 한잔할 텐가?” 죽음의 순간에 나온 해탈한 유머는 에 적혀 전해지는 이야기다.
사약을 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임형수의 일화에서 느껴지듯 유머는 심오한 미덕이다. 사전적으론 ‘어떤 말이나 표정, 동작 등으로 남을 웃게 하는 일이나 능력, 또는 웃음이 나게 하는 어떤 요소’일 뿐이지만 유머는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효과를 빚어낸다. 나를 드러내는 매력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머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코미디 방송을 챙겨보고, 유머책을 달달 외운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는 그의 신간 (문학과지성사 펴냄)에서 웃음의 사회성에 주목한다. 책 을 통해 한국 사회 속 모멸감의 실체를 분석했던 그는 이번에 유머의 정체를 파헤친다. “유머를 권하는 사회에서 유머에 대한 논의가 빈곤하다”는 게 그가 연구에 빠진 이유다.
‘유머니즘’은 ‘유머’와 ‘휴머니즘’을 조합한 개념이다. 유머를 위한 유머가 아니라 인간애로 연결되는 유머라는 의미가 담겼다. 지은이는 웃음의 본질부터 파악한다. 웃음에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웃음인 ‘뒤센 미소’(신경심리학자 기욤 뒤센의 이름을 따서 붙임)가 있고, 팬아메리칸 항공사 승무원들의 억지웃음을 빗댄 ‘팬아메리칸 미소’가 있다. 웃음의 종류를 더 들여다보면 실소, 미소, 함박웃음, 폭소, 너털웃음, 비웃음 등 다양한데 지은이가 ‘좋은 웃음’과 ‘나쁜 웃음’으로 가르는 기준은 “공감”이다.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은 단절의 징표고, 함께 웃지 못하는 웃음은 폭력이라고 짚는다.
지은이는 유머 감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포착’해야 하고, 의미를 변주하는 언어의 연금술(‘표현’)이 필요하다. 연극적인 표현력(‘연기’)과 세상을 경이롭게 대하는 감각(‘동심’), 엉뚱한 것을 감행하는 배짱(‘넉살’), 사소한 농담에도 화답하는 여유(‘공감’)도 필수다.
유머 감각은 단기간에 늘지 않는다.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복합적이어서 지능, 언어 감각, 정서적인 결,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변수가 연결돼 있다.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유머가 터진다.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자기 말을 믿으면 놀란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비꼬는 동시에 권력자들의 행태를 꼬집는 ‘뼈 있는 농담’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다.
지은이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쾌감을 느끼는 비웃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희롱, 권력과 지위에 도취돼 짓는 과시적인 미소 등 ‘병적 웃음’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진단한다. ‘센스’에 ‘개념’도 탑재한 유머가 더욱 요청되는 까닭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진정한 유머는 경솔함이 아닌 진솔함에서 우러나온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최소 1억…전한길 “윤석열 중심 제2건국 모금”

“문 열고 달리는 기분”…이 대통령 SNS 정책 ‘투척’에 초긴장

트럼프, 캐나다가 7조원 들인 다리 “절반 내놔”…러트닉-재벌 ‘로비’ 의혹

‘태극기’ 접더니 ‘받들어총’…오세훈의 논란 사업, 결국 중단되나

“‘윤 어게인’ 지지 약속 지켜라”…밀려드는 ‘전대 청구서’에 진퇴양난 장동혁

18살 최가온, 하프파이프 결선 진출…“내 기술 절반도 안 보여줬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신랑

‘전두환 미화’ 고성국 “당무위 피하려 비겁한 결정”…국힘 자진 탈당 거부

“한국 대통령이냐?”…‘순복음’ 이영훈 목사 과잉 의전에 미국 어리둥절

미 전문가들, 한미 조선협력 ‘용두사미’ 전망…“미국 내 숙련공 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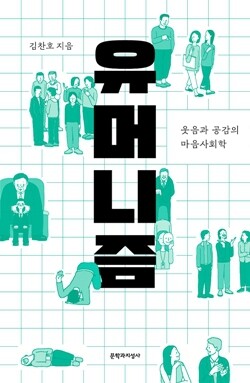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