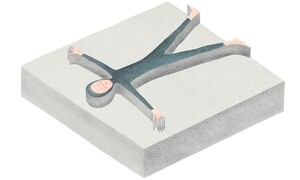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20년이 넘었는데 그 아기 얼굴을 잊지 못한다.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한 아동복지원에 자원봉사를 갔다. 무슨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여기저기 배회하던 시절이다. 한 방에 아기 20여 명이 있었다. 대개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이었던 거 같다. 거기서 청소 따위를 했다. 그 뿌연 기억 속에 기저귀를 찬 그 아기는 온 얼굴을 구기며 울고 있다. 파란 줄무늬 티셔츠는 온통 콧물, 눈물 자국투성이다. 선 채 두 팔을 내게 벌리고 운다. 그 가는 두 팔이 아직 생생하다. 나는, 그 아기를 끝까지 안아주지 않았다.
그 아기의 열망이 너무 간절해 뒷걸음질했다. 내 첫 기억 탓인지도 모른다. 컴컴한 방, 침대 위에 나만 있다. 몇 살인지 모르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누가 나를 안았다면 그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으면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다른 아기들도 다 안기고 싶어. 근데 왜 너만 유독 그래.’ 죄책감을 피하려 말도 못하는 아기를 속으로 탓했다. 그 복지원에 다시 가지 못했다.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아기에게서 고개를 돌린 내가 보여서다.
이 정도는 약과인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어떤 장면들은 그렇게 또렷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댄다. 부탄 왕국에서 인도 쪽으로 국경을 넘자마자 나오는 도시 ‘자이공’, 그 길 한복판에서 얼어붙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무엇으로 얼굴이 얼룩덜룩했다.
6월의 습기와 열기 속에서 쓰레기 더미가 썩어 들어갔다. 도시 전체가 두엄이다. 아이들은 그 속을 뒤져 페트병 따위를 자루에 담았다. 건물은 여기저기 멍든 자국처럼 삭았다. 시장통에서 사람들은 흥정했다. 한 백발의 여자는 사리로 몸만 겨우 가린 채 맨발로 진창을 휘청휘청 걸으며 구걸했다. 구정물 같은 빗물이 여자 머리 위로 떨어졌다. 새끼 밴 염소 한 마리가 돌아다녔다. 염소 옆구리가 터질 듯 불룩하다. 그때 자루를 든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쇄골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신발을 신고 있다. 나는 그를 등지고 돌아 걸었다.
호텔 방엔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왔다. 뜨거운 물로 샤워했다. 리넨 침대보는 하얗다. 몸이 노곤해졌다. ‘그 할머니는 그래도 형편이 더 나아 보였어.’ 합리화해봤자 소용없다. 1달러를 무슨 권리인 양 쥐고, 알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저울질하는 내가 거기 서 있다. ‘너는 더 불쌍해 보이니 1달러, 너는 신발 신었으니 패스’ 줄 세웠던 내가 있다. 내게 그 할머니는 사람이었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나는 사람인가.
이기호의 소설집 에는 타인의 슬픔을 마주 보려 했지만 결국 반쯤 돌아서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정만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붐’은 서울 용산 참사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한 가상의 크레인 기사 인터뷰다. 경찰을 망루로 올리는 작업을 지시받았는데 과적 단속에 걸려 현장에 가지 못했다. 술이 돌고 이야기는 꼬여가다 크레인 기사가 묻는다. “말해봐요… 아, 왜 자꾸 사람 말을 듣고도 눈만 감고 있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형씨도… 그러니까 형씨도 나랑 비슷한 거 아니냐구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 아니냐구요.”
타인의 슬픔은 얼마나 버겁고 두려운 것인지. 완전히 외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갈팡질팡 속에 수치가 자란다. ‘한정희와 나’에서 한정희는 따지고 보면 나와는 별 상관 없는 초등학생이다. 극 중 화자의 부인이 초등학교 때 집안이 망해 엄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엄마 친구 부부는 친부모도 주지 못한 따뜻함으로 아이를 키운다. 부인이 본가로 돌아가고 엄마 친구 부부는 양자를 들이는데, 이 아들이 커 사고를 치고 다닌다. 그 양자의 딸이 한정희로 오갈 데가 마땅치 않게 됐다. 나는 한정희를 집에 들이고 나름대로 잘 돌본다 생각했는데 한정희는 말간 얼굴로 학교폭력을 저지른다. 그런 정희에게 나는 결국 퍼붓고 만다.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정희가 떠나고 이 말은 그에게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의 내면은 늘 불안과 절망과 갈등 같은 것들이 함께 모여 있는 법인데,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타인의 슬픔이 남긴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인공들은 되레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자신이 준 상처는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잊어버린다(‘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게다가 타인의 슬픔은 얼마나 난해한지, 어떤 호의는 되레 상처를 덧낸다.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선으로만 보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보려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보려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아졌다.”(‘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
어차피 불가능할 ‘환대’라면 차라리 놓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어쩌자고 이기호의 주인공들은 실패가 뻔한 시도를 계속 하나? 왜 이런 질문을 붙들고 있을까? “이렇게 춥고 뺨이 시린 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 나는 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때도 과연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때, 그 아기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나는 내게도 등을 돌렸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타인은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련이기도 하다. 외로 고개를 튼 자리마다 죄책감의 생채기가 나고 그만큼 나도 허물어진다. 결국 자기는 속일 수 없으니까, 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기억들은 나도 사람이 아님을 자신에게 증명하니까, 우리는 사실 사람으로 살다 죽고 싶으니까, 이 질문을 놓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실패한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국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6000피 시대 ‘빚투’도 ‘하락 베팅’도 역대급…커지는 변동성 압력
![아무도 없나요? [그림판] 아무도 없나요?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5/20260225503912.jpg)
아무도 없나요? [그림판]

대구 간 한동훈 “출마지 미리 말 안 하겠다…국힘, 막으려 덤빌 것”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