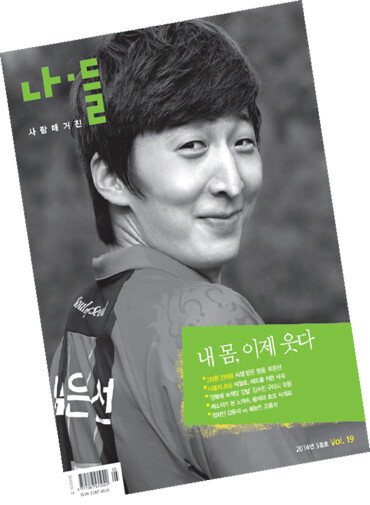
1
우리는 애도마저 프로파간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세상에 산다. 철통같은 경호가 이뤄졌을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에 유가족도 아닌 일반 조문객이 가까이 따라다니다 마침내 포옹까지 한 것은 연출이든 우연이든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외설적인 풍경은, 초유의 참사 앞에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이 현실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감정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이는 애도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통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애도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유의 대상이다. 애도가 철학 안으로 들어갈 때, 단순한 감정의 기전을 넘어서는 무엇이 된다. 그리고 이런 낯선 물음과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 있는가.
최근 발간된 사람 매거진 5월호의 특집 제목은 ‘애도의 부정변증법’이다. ‘산 자의 슬픔이 죽은 자의 고통과 대면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애도해야 할지를 집요하게 묻는다. 그저 순전하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삶은 계속될 것이다.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보증도 없이. 그래서다.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한다.”(‘나들의 초상’ 전문)
“지금 배 안의 아이들을 못 찾는 게 아니다. 그 아이들이 ‘배 안에서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참하게 박탈당한 죽음에 관한 권리의 복원을 요청하고 있다.”
아도르노와 베냐민 전공자이고, 상처와 애도를 철학의 주제로 삼아 깊이 연구해온 김진영 철학아카데미 대표는 과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개인 차원의 자연사가 아니기에 애도는 정의(正義)의 문제로, 산 자들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죽은 자들에 대한 정의로 건너가야 한다”며 “애도는 산 자들이 죽은 자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줄 것인지를 발본적으로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신분석학적 애도가 아니라 ‘정치적 애도’다.
우리 사회는 이번 참사의 책임자를 가리려 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것인데, 그런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 철학자의 생각이다. 대통령부터 많은 권력자들이 터무니없는 언행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이 사태와 자신은 직접 관계가 없을뿐더러,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기 믿음이 내면화돼 있기 때문인데, 마음껏 분노하고 슬퍼하는 우리는 저들이 서 있는 ‘예외적 입지’를 넘어섰는가 묻는다. 대칭적 거울상은 아닌가 하고.
“지금은 당연히 눈물 흘리고 슬퍼해야 하지만 자기 행동이나 판단에 대한 성찰도 해야 합니다. 애도는 죽음 앞에서, 특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만 열리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입니다.” 비상사태를 정상상태로 오인하고 있는 산 자들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하라고 죽은 자들은 요청하고 있다. 그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조용히 살겠다…내 사퇴로 갈등 바라지 않아”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 “모즈타바 외모 훼손됐을 것…다음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배신자론’ 일축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