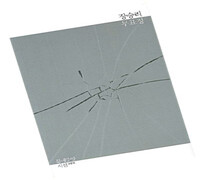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건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에게는 유다만큼 매혹적인 캐릭터도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반이지만 그 배반의 동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는 그토록 사랑한 스승을 배반하고 목숨을 끊어야 했나. 그가 마귀에 들린 자였다거나 남다른 탐욕의 화신이었다거나 하는 복음서의 설명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유다는 물론이고 인간 일반에 대해서도 신비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리라. 그런 이들에게는 세 공관복음서의 필자들(마태, 마가, 누가)이 유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의 세부가 엇갈린다는 사실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을 통해 인간을 탐사하고자 하는 이에게 배반자 유다의 내면은 두렵고도 매혹적인 심해처럼 느껴진다. 단테의 (1321)에서부터 레이디 가가의 노래 (Judas·2011)에 이르기까지, 숱한 예술가들이 유다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중 보르헤스의 것은 가장 심오한 경우에 속한다(왜 아니겠는가, 보르헤스인데!). 그의 (민음사·2011)이 최근에 다시 번역됐는데, 이 책에는 ‘유다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라는 작품이 수록돼 있다. 보르헤스의 소설답게 ‘닐스 루네베리’라는 가공의 인물이 쓴 책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쓰였다. 그에 따르면 세 가지 (난해하지만 흥미로운) 설명이 가능하다.
(1)유다의 배반이란 그가 적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에게 입을 맞추어 그들이 체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던가? “회당에서 매일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스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굳이 사도의 배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 실수가 있다고 말할 순 없는 노릇이니, 그의 배반은 어떤 다른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행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하위 질서는 상위 질서를 반영(해야)한다는 것, 신이 자신을 희생했으니 인간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 ‘말씀’이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씀’의 제자인 유다도 자신을 낮추어 밀고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
(2)이 논변이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자 닐스 루네베리는, 전지전능한 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다른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리가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만, 유다를 달리 이해하겠다는 의지만은 굽히지 않는다. 예수의 사도가 고작 은화 서른 닢 때문에 배반을 감행했을 리 없다는 것. “구세주가 발탁한 사람의 행적이기에, 그 행적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해석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주장한다. 유다를 지배한 것은 ‘탐욕’이 아니라 ‘금욕’이라고. 선행과 행복은 신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유다는 스스로 추락했다는 것. 무한한 금욕의 정신으로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갔다는 것.
(3)‘희생자’ 유다와 ‘금욕주의자’ 유다에 이어 닐스 루네베리가 제시하는 마지막 유다의 상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었다. 예수라는 인간? 아니다. 하느님의 자기희생이 완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 하느님은 더욱 철저하게 인간에 가까운 인간, 즉 죄의 인간이 되길 선택했을 것이다. 인간성과 무죄성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놀라운 결론이 이어진다. “신은 완전히 인간이 되었다. 심지어 부정한 인간, 영원한 벌을 받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빠질 정도의 인간이 되었다. (…) 그는 비열하고 경멸스러운 운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유다였다.” 유다가 곧 하느님이라는 것!
보르헤스 자신이 ‘기독교적 환상 문학’이라 명명한 이 소설의 가설들이 놀랍도록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더 끌리는 논변은 지젝의 것이다. (길·2007)에서 그는 유다의 행위가 ‘신뢰의 궁극적 형태로서의 배반’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공적 영웅이 되려면 누군가의 배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럴 때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꺼이 그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유다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배반해야만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비극적인 인물이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오독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이 오독의 빛에 의지해 인간이라는 심해로 내려간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팔짱 케미’ 룰라 사로잡은 이 대통령 선물…전태일 평전, K-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