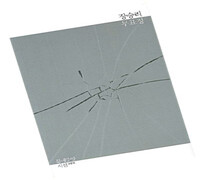지난 6월30일 김진숙 위원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힘들다”는 말 뒤의 표정은 여전히 천진하다. 한겨레21 박승화
선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지만 희망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기자, 편집자, 동료 문인들과의 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늘 그들을 힘들게 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려고 나서는 일이 가당찮게 여겨졌다. 당면한 일들을 먼저 해내야 했다. 이 하찮은 사정을 말하는 일이 부질없게 느껴져서 회신도 보내지 못했다. 다녀온 선배가 쓴 글을 읽으며 미안해했고 또 고마워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줄도 쓸 자격이 없지만, 시인의 좋은 시를 외면할 자격도 없을 것이다. 덜 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미안해지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영주의 시 ‘공중에 사는 사람’( 2011년 여름호)은 총 10개의 단락으로 돼 있다. 5연씩 나눠 옮긴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깊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지붕이 없는 골조물 위에서 비가 오면 구름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살 냄새, 땀 냄새, 피 냄새// 가족들은 밑에서 희미하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덩어리를 핥고 싶어서 우리는 침을 흘립니다// 이 악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공중을 떠도는 망령을 향하여 조금씩 옮겨갑니다 냄새들이 뼈처럼 단단해집니다// 상실감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가장 실감나게 느끼면서 비가 올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이란 지붕도 벽도 있어야 할 텐데요 오로지 서로의 안쪽만 들여다보며 처음 느끼는 감촉에 살이 떨립니다 어쩌면”

<문학과 사회> 2011년 여름호
그가 처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는 거기서 죽은 동료를 생각하며 거기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시의 주어는 ‘우리’인 것일까. 그들은 올라가서 거꾸로 깊어졌다. 이 표현이 지상과 공중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몸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마음은 깊어지는 심리적 역설을 표현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이 첫 구절은 힘있게 시를 연다. 시인들은 ‘그곳에서는 가족이 더욱 그립다’라고 적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는 단지 희미한 덩어리로만 보이는 가족들을 핥고 싶어서 침을 흘린다’라고 사무치게 적는다. 그들은 영웅적 자부심과 승리에 대한 예감으로 거기에 있는가? 아니, “상실감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가장 실감나게 느끼면서” 거기에 있다.
“지구란 얇은 판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구멍 뚫린 곳// 우리는 타오르지 않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너진 골조물에 벽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서서히 올라오는 저녁이 노래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우리는 냄새처럼 이 공중에서 화석이 될까요// 집이란 그런 것이지요 벽이 있고 사라지기 전에 냄새의 이름도 알 수 있는//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이마를 문지르고 머리뼈를 기대고 몸에서 몸으로 악취가 흘러가기를 우리는 남겨두고 노래가 내려가 떨고 있는 두 손을 핥아주기를”
지구가 구멍 뚫린 판자일지도 모른다는 표현은 공중에서의 두려움을,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벽으로 우리를 둘러싼다는 표현은 그곳에서의 안간힘을 전달한다. 아니,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들이다. 보다시피 이 시에는 어떤 독자들이 바랄 만한 선명한 울분과 명쾌한 선동이 없지만, 그 대신, 상상하기 힘든 어떤 고행의 실감에 조금이나마 도달해보려는 조용한 노력이 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시가 과연 김진숙씨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이 시의 후반부를 이렇게 이해했다. “공중에서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만 내려오지 말고 노래를 부른 당신도 반드시 함께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체계 속에서 신은 하늘에 있다. 신과 가까운 곳이 곧 낙원이지 싶어, 낙원도 하늘에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곳을 ‘천국’(天國, heaven)이라 부른다. 이 나라 곳곳에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듯이, 아니 여기가 이미 천국이라는 듯이 초고층 아파트들이 솟아 있다. 그런 나라의 남쪽 어느 하늘에 한 사람이 산다. 축복과 은총 따위는 기대해본 적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상에서 살아갈 희망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신에게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희망은 천상의 어디에서가 아니라, 지상의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달려온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보내기 전에,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올려보낸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미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적군 공격·오인사격 아냐”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이하상 “특검 안 나온 재판은 불법” 트집…재판장, 17초 만에 “기각”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한준호 “김어준, 사과·재발방지해야”…김어준 “고소·고발, 무고로 맞설 것”

박지원 “레거시 언론과 언어 차이”…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제기 두둔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