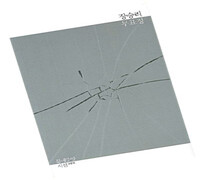2010년의 소설들 중에서, 비록 언론과 서점에서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으나, 정신의 유전자가 비슷해 보이는 두 작가의 멋진 책 두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먼저 배수아의 소설집 (창비 펴냄). 2000년대 들어와서 잇달아 출간된 그녀의 장편소설들, 예컨대 (2003), (2004), (2005)을 차례로 읽어보면 이 작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이방인의 시선을 체득해서, 그 시선에만 명확히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과 싸우고 있었다. 그 싸움은, 산업화와 민주화로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네 의식구조의 어떤 낙후성 혹은 폭력성과의 고투로 보였다.

풀이 눕는다
그 취지는 여전하되 이제는 더 고요해지고 깊어졌다. 이번 책은 배수아라는 어떤 정신의 ‘발언’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정신의 ‘무늬’를 그린다. “젊은 시절 항상 그는 자살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질투하고 선망해왔다. 종종 강하고 날카로운 인식 속에 있을 때면 특히, 그는 자살한 사람들의 글만을 신뢰했다. 자살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상태, 혹은 자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어떤 해석으로든 타협자이며 공동의 방식의 선택자이기 때문이다.”(81쪽) 이 책의 모토라 할 만하다. ‘강하고 날카로운 인식’으로,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상태, 혹은 자유’를 추구하기. 그것도 낯설고 아름다운 뉘앙스의 문장으로.
‘개성 있다’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그 개성의 개성을 따져야 하게 생겼는데, 배수아의 개성은 동시대 작가군에서도 가장 개성적인 개성일 뿐 아니라 그 개성을 이루는 지성의 논리와 감성의 구조가 산출하는 문장들은 완전하게 독자적이다. 나는 이 작가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나 ‘막힌 변기 뚫는 법’ 따위를 쓴다 해도 찾아 읽을 것이다. 그녀라면, 분명 다르게 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어딘가에 쓴 대로 “적어도 서너 페이지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실어나르는 컨베이어벨트가, 그 자체가 목적인 아름다운 문장들 때문에 멈추는 일”이 벌어져야 소설은 1차 콘텐츠가 아니라 언어예술이 된다. 특히 116~117쪽은 내게 ‘올해의 두 페이지’다.

올빼미의 없음
김사과의 장편소설 (문학동네 펴냄)의 주인공들은,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관객을 향해 이죽거리는 배우들처럼, 독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로 속삭인다. ‘알지? 저렇게 되면 끝장이야.’ 그들이 강에 유출된 폐수 보듯 하는 부류의 인간은, 이 사회가 제공하는 삶의 방식들을 과격하게 의심해보지도 않고 그중 하나를 택해 얌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다. 이 소설을 읽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소설의 전제를 삼단논법으로 바꾸면 이렇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좆같은’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남자와 시를 쓰는 여자가, 그런 세상에 맞서서, 그들만의 예술과 사랑을 실험한다. ‘속물지배시대의 히피즘’이랄까. 오늘날 패션과 여행의 폼 나는 수식어로 타락해버린 히피즘 말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급진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히피즘 말이다. 이 소설은 ‘이런 삶, 어때요?’라고 낭만적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은 이것뿐, 그 외엔 병신이거나 노예’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결기가 이 소설에 폭발할 것 같은 진정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돈 따위가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사랑 안에서 굶어죽겠다, 아름답게. 그게 내 꿈이었다.”(158~159쪽) 그러나 현실의 논리는 그 ‘꿈’을 박살내고 연인들은 몰락한다. 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 이 소설을 투정이나 치기와 구별되게 한다. 어떤 정신, 태도, 열정이 벽에 머리를 찧고 피 흘리며 비틀거리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소설이다. 세상이 ‘좆같다’는 걸 모르는 혹은 알아도 목숨 걸고 대들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은 믿지 않는다는 외침 소리가 들리는 소설이다. 이 작가는 어디에선가 나쁜 어른이 되지 않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른의 어른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소설을 써야 하고, 우리 나쁜 어른들이 그 소설을 읽어야 한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국힘 ‘절윤 격돌’ 예상했지만…싱겁게 끝난 “입틀막 의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낮 음주운전…감봉 3개월

이 대통령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양팔 벌려 꽉 껴안아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김혜경 여사·브라질 영부인, ‘커플 한복’ 맞추고 친교 활동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3/20260223503467.jpg)
그렇게 형이 된다...감독 김남국, 주연 정청래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