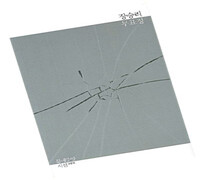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발이 닿지 않는 아이〉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계기 때문에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읽었다. 서점에서 이 책과 첫 대면을 했다면 선뜻 집어들었을 것 같지가 않다. 첫째, 그 흔한 신인 공모 하나 거치지 않은 작가가 바로 단행본을 출간한 경우라는 것. 편견 때문일 텐데, 이럴 경우 주춤하게 된다. 둘째, 유행하는 일러스트 표지에 포켓북 크기라는 것. 괴상한 편견인데, 시집은 제외하고, 이렇게 작고 예쁜 책에는 손이 잘 안 간다. 셋째, 이른바 ‘청소년문학’으로 분류될 만한 책으로 보인다는 것. 자녀가 없고 교사도 아닌 30대 중반의 남성은 청소년문학 시장의 사각지대일 것이다. 인생 선배들의 충고를 들을 시간도 모자라는데 청소년의 고민 상담을 해줄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이런 삼중의 편견이 미처 작동하기 이전에 이 책과 만났다. 다행스러운 우연이다.
아빠는 강도·강간죄로 복역 중이고 엄마는 집을 나갔다. 이 소년은 부모에게 네 번이나 버려졌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먹고살 게 없으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17쪽) 이런 생각을 하며 소년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폐휴지를 줍기 위해서다. 이 처지가 불행하단다. 노동이 고되어서가 아니다. “일찍 일어나버리면 하루가 그만큼 길어져버린다.”(18쪽) 여기까지만 듣고도 어떤 독자들은 ‘칙칙하다’는 생각을 하리라. 그러나 마음을 아프게는 하되 신파로 칭얼대는 법은 없다. 이를테면 이런 ‘고통의 철학’ 앞에서는 잠시 말문이 막힌다.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때로는 고맙다. 내가 후회로 서서히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의 고통만으로도 숨이 벅차서 과거 일로까지 고통받을 시간이 도무지 없다.”(63쪽) 이것이 이 소설의 톤(tone)이다.
처음 읽었을 당시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이 작품의 이런 정서였다. 그때의 메모다. “칙칙하고 우울하고 위태로워서 이 소설은 사랑스러웠다. 칙칙한 척, 우울한 척, 위태로운 척하는 소설들이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문학적으로 세공된 정서는 표가 난다. 그러나 어떤 작품은 이 작가가 이 정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것은 소설을 기술적으로 잘 쓰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장점이다.” 두 가지를 덧붙이자. 첫째, 그 ‘정서’라는 것이 청소년의 그것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 성인 독자를 뜨끔하게 할 통찰이 빈번히 등장한다. 둘째, 어떤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작가일수록 문장을 쓸 때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 그저 ‘정확히’ 쓰면 되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최단거리로 나아가는 문장들이 아름다운 법인데, 이 작가의 문장이 그렇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소설 도입부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에이 씨팔, 그래본다.”(25쪽) 결말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세상이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답지 않냐고 묻는 노래는 무척 아름답다. 그냥 그걸로 됐다.”(221쪽) 말하자면 이 소설은 ‘그럼 그렇지’가 ‘그걸로 됐다’에 도달하는 이야기다. 우리 삶이 ‘그럼 그렇지’와 ‘그걸로 됐다’ 사이쯤에 있다는 전언으로 받아들이면 그도 그럴듯하거니와, 전자에서 후자에 이르는 한 소년의 ‘성장’도 생생하다. 이 성장이 우리에게는 먼 과거의 일인가? 30대가 되면서 어디서건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내 안에는 여전히 나약하고 유치한 소년이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다. 세상엔 두 종류의 무엇이 있다 운운하는 말법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자칫 경박해 보이기 쉽지만 한 번만 더 사용해보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있다. 알고 보면 착한 인물과 알고 보면 악한 인물. 전자보다는 후자를 잘 그려내는 문학이 더 윗길이라는 게 내 편견이다. 상처로 생기는 통찰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문학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알고 보면 악한 게 세상이라는 전언이 장차 상처받게 될 사람들에게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보자. 어쩌면 인간과 세계의 실상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어떤 미묘한 무덤덤함일지 모른다. 문학은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이를 때 그 무덤덤함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 무덤덤함은, 우리를 편안하게도 불안하게도 하는, 회색에 가까운 세계일 것이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1217/53_17659590361938_241707891273117.jpg)
[단독] ‘쿠팡 가만 안 둬’ 스코틀랜드 3위 연기금, 총대 메고 소송 전면전

흔들리는 부산 “나라 말아먹은 보수가 보수냐…그런데, 뚜껑은 열어봐야”

‘이란 정권교체’ 노골적인 트럼프 “지도자 선정 관여하겠다”

“키 206cm 트럼프 아들을 군대로!”…분노한 미국 민심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6/53_17727496510754_20260306500054.jpg)
“부통령 밴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파원 칼럼]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305/20260305503520.jpg)
결국 너의 집 앞이야 [그림판]

이 대통령, 정유업계 직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대가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