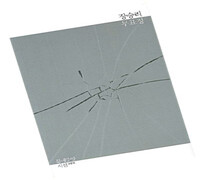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숨그네〉
노벨상은 노벨상이다. 헤르타 뮐러의 장편소설 (문학동네 펴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10월8일 그가 수상자로 지명되었을 때 우리 대부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시의 집중성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빼앗긴 이들의 풍경을 그려냈다”는 스웨덴 한림원의 공식 코멘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독일어로 글을 쓰는 이 낯선 작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연구자도 고작 한두 명뿐이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그의 작품을 탁월한 번역으로 읽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누군지 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한다.
1945년 1월, 당시 소련 치하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소련 재건’을 위해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다. “참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우리가 러시아인들에게는 히틀러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인들이었다.” 그중 하나인 17살 소년 레오(작가에게 수용소 체험을 증언하고 작고한 시인 오스카 파스티오르를 모델로 한)의 눈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견딜 수 없는 참혹을 견뎌내야 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살인적인 배고픔을 ‘배고픈 천사’와 친구가 된 것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착란 상태를 가슴속의 ‘숨그네’가 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작가의 말대로 비극이 시의 옷을 입었다. 한 대목만 옮긴다.
“점호 시간에는 부동자세로 서서 나를 잊는 연습을 했다.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크지 않아야 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눈만 치켜떴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내 뼈를 걸어둘 만한 구름자락을 찾았다. 나를 잊고 하늘의 옷걸이를 찾으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었다./ 구름이 없는 날도 잦았다. 그런 날 하늘은 탁 트인 물처럼 푸르기만 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는 날도 잦았다./ 구름이 계속 흘러 옷걸이가 멈춰 있지 않은 날도 잦았다./ 추위가 내장을 찌르는 날도 잦았다./ 그런 날은 하늘이 내 흰자위를 뒤집었고 점호는 그걸 다시 뒤집었다. 걸릴 곳이 없는 뼈들은 오로지 나한테만 걸렸다.”
본래 소설의 언어는 두 기능, 즉 기능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진동할 수밖에 없다. 소설은 이야기의 집이므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고(기능성), 언어로 만드는 예술품이므로 이야기 없이도 존립할 수 있어야 한다(예술성). 그러니까 소설의 언어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목적이다. 이 역설을 견뎌내는 것이 관건이다. 자칭 이야기꾼들의 언어는 투박하고 자칭 언어예술가들의 이야기는 빈곤하다. 이 작가는 어느 쪽도 놓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인간성의 위대함과 허약함을 동시에 꿰뚫는 이야기가 있고 책 전체가 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문장들이 있다. 참혹한 비극을 다룬 문학이 아름다워도 되는가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이 동네의 난제였다. 이 소설은 그 한 대답이다.
이 소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분류하자면 ‘수용소 문학’쯤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이성을 가진 인간의 근대 프로젝트가 아우슈비츠(나치 수용소)와 굴락(소련 수용소)으로 귀결된 것을 냉소한다. 냉소주의는 위험하지만 냉소 자체는 성찰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확신에 차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을 살려야 한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낙동강 강바닥의 돌멩이보다도 덜 생각할 것이다.) 수용소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 부단히 되돌아가야 할 상처이고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탁월한 수용소 문학은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반성이고 미래의 연습이다. 프리모 레비가 그랬고 솔제니친이 그러했다. 수용소의 문학은 문학의 수용소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역사책이 아니다. 푸코의 ‘생명정치’(인간의 생명이 권력의 메커니즘 속으로 포섭되는 근대 정치의 현상) 개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아감벤은 수용소를 가리켜 ‘근대 생명정치의 패러다임’이자 ‘근대성의 노모스(법)’라고 말하면서 수용소는 “역사적 사실이자 이미 과거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공간의 숨겨진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잘은 모르겠지만 2010년 대한민국의 풍경들을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는 한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믿음에 갇힌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내란 재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6/53_17703287145844_20260205504340.jpg)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주말 ‘영하 18도’ 극한 한파…호남·제주엔 폭설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후폭풍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선고

‘조수석 날벼락’ 가해 운전자, 나흘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

빗썸, 고객 수백명에 1인당 2천억어치 비트코인 ‘오입금’

“한국 핵 농축·재처리 금지해야”…미 상원의원 4명 트럼프에 항의서한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4/53_17702022240809_20260204503792.jpg)
법정의 참 군인과 비굴한 군인 [왜냐면]

용접 입사 첫주…현관에서 곯아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