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한 밤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20여 명이 참석했고, 고인을 존경하는 분들로 이루어진 모임의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제사를 지내고 장소를 옮겨 술과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두 그룹은 자연스레 떨어져 앉게 된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고인을 존경해 그 자리에 참석한 젊은 가수가 차분한 노래를 세 곡 잇달아 부를 때까지도 괜찮았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고 몇몇 예술가들이 앙코르를 외치자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반대편에 앉아 있던 어떤 분이 마침내 격분해 외친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선생님의 기일입니다. 이렇게 엄숙한 날에 노래를 부르고 앙코르를 외치는 건 다 뭐하는 짓들입니까.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예술인들은 자신에게 쏟아진 갑작스러운 비난에 당황해 대체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중 한둘은 부당한 비난이라 주장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 와중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분들 대다수는 그야말로 썰물 빠지듯 자리를 뜨고 말았다. 결국 20여 명의 예술인들만 남아,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말한다. “서로 싸울 일이 아니지. 추모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 선생님 가신 지 4년이야. 이제는 이날이 축제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 조금 전까지 우리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잘 지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죠? 저희들 지켜보고 계시죠? 한잔 받으세요. 자, 노래도 한 곡 하시고요.’
그날 자리를 뜬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뒤늦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었던 예술가들이, 자신들에게는 타인의 기분이야 어떻든 내키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영혼의 불가피한 반영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유치한 보헤미안 흉내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렇다. 확실히 예술가들은 어떤 경우 진지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이 못 견뎌 하는 것은 ‘진지함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지함에 대한 진지함’이다. 어디에선가 ‘진지해져라’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 ‘진지함’과 ‘진정함’은 다르지 않은가, 진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정해지는 법을 발명할 수는 없는가, 하고.
이것은 예술가들의 오래된 고민 중 하나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주 채택되는 방법 중 하나가 유머다. 프로이트의 고전적 설명의 핵심은 이렇다. 농담(joke)이 자신을 높여 ‘타자’보다 우월해지려는 것이라면, 유머(humor)는 자신을 낮춰 ‘세상’보다 우월해지려는 기술이다.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대상으로 웃을 때, 나는 세상보다 우월하다. 그 어떤 것도 최후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유머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유머는 희귀하고 고귀한 자질”이라고 말한다. 이 자질의 핵심은 ‘거리 두기’에 있다. 으레 그래야만 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것과 거리를 두는 기술. 이를 ‘태도로서의 유머’라고 하자. 꼭 그날 밤 얘기만은 아니다. 유머 감각이란 언제나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소설 정신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밀란 쿤데라는 신작 에세이집 (민음사·2012)에서 이런 말을 한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에 속하는 유혈 현장에서 유머가 할 일이 있을까? 그래도 유일무이하고, 새로우며, 경탄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 즉 무거운 주제에 대해 거의 의무적으로 감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유머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머가 없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근엄한 자의 황량함은 유머 없는 황량함이다.”(81쪽) 그러고 보면 그날 얼떨떨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더 신나게 놀지 않고 뭐하냐며 술을 따라주던 분은, 이 나라 저항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어느 선배 예술가였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작고하신 선생님과 함께, 동이 틀 때까지 놀았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이 대통령 “산골짜기 밭도 20만~30만원”…부동산 타깃 확대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TK 의원-지도부 내부 충돌

대전·충남 통합 불발되면, 강훈식은 어디로…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

이 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못 본 척한 공무원 엄중 문책하라”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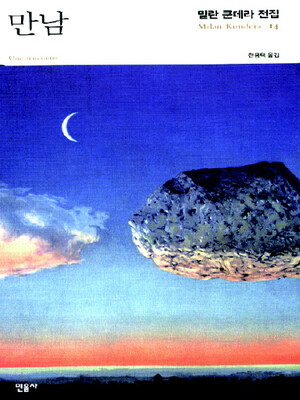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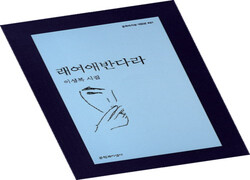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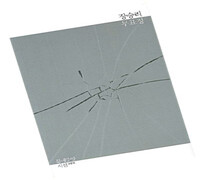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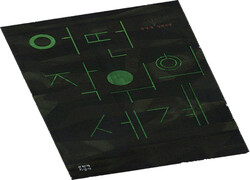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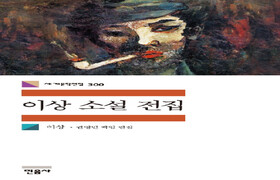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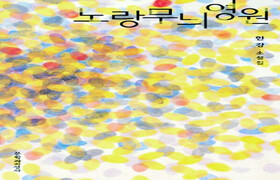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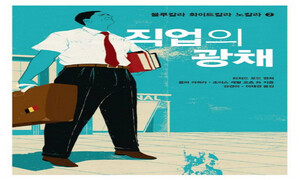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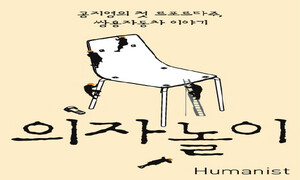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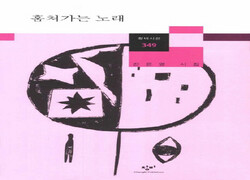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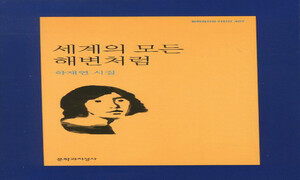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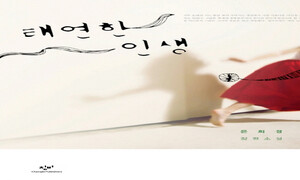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 [속보]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안 가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78646426_2026022450315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