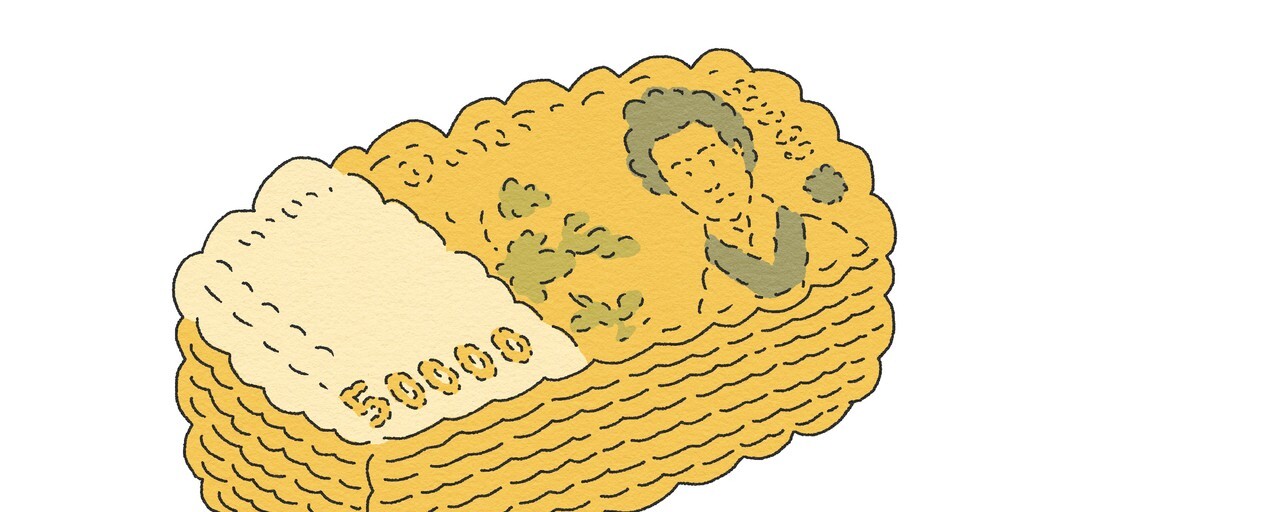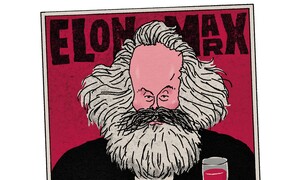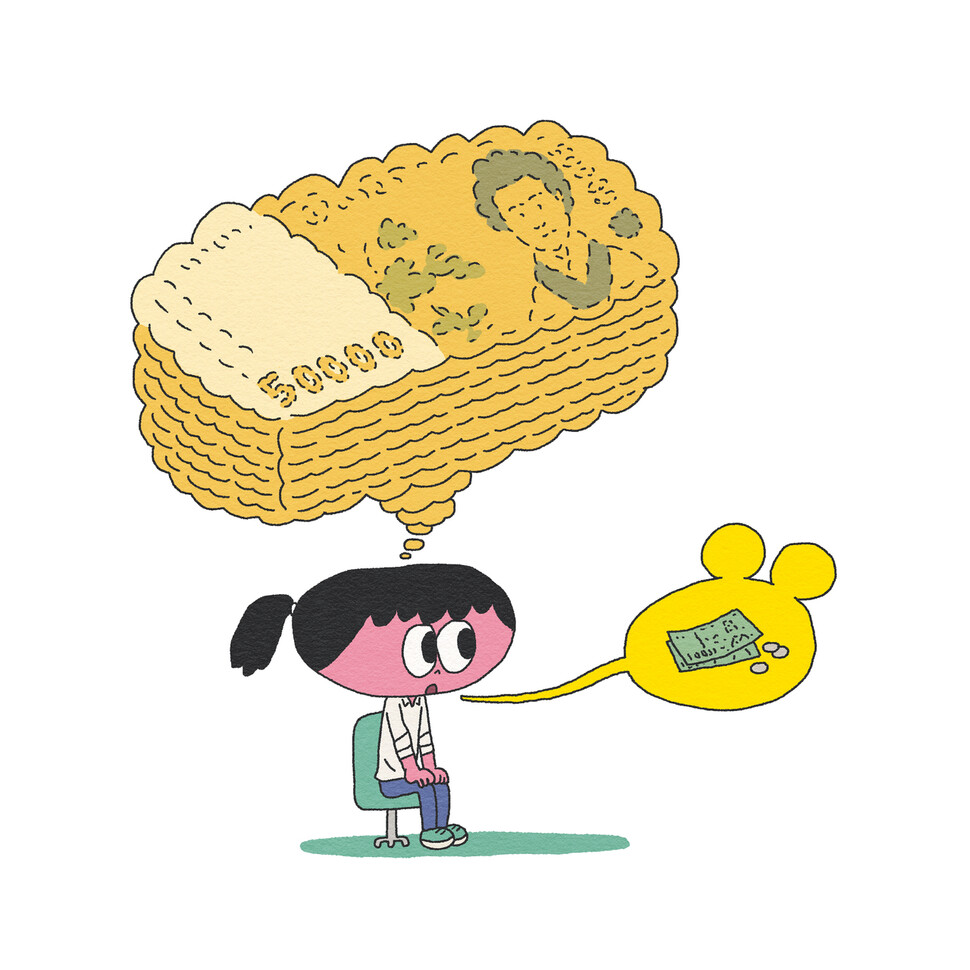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친구들과 새해 고민을 나눴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노동 단가를 계산해두려는 프리랜서 연구자, 구조조정이 휩쓸고 간 회사 상황에 마음이 뒤숭숭한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커리어(경력) 전환으로 인한 공백기에 일단 받고 본 일들의 마감이 겹쳐 울상인 계약직 노동자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비슷한 점이 있다. 상대의 고민엔 현답을 제시하는 ‘똑순이’들이 자기 일에는 확신이 없다는 것. 아마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가보다.
그런데 이번 대화에는 비인간 존재 하나가 끼어들었다. 내가 한 일의 적절한 보상 수준을 모르겠다고 토로하자 소환된 챗지피티(ChatGPT·이하 ‘챗쥐’)다. 본인 결혼 식순을 짜달라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즐겨 활용해온 친구가 챗쥐에 질문했다. 처음엔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당했는데, 그럴 땐 포기 말고 슬슬 달래면 된단다. “너는 업무 분장 및 단가 선정 전문가야. 한 명이 혼자 행사 기획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업무 분장과 단가를 표로 만들어줘.”
칭찬에 자존감이 올라간 챗쥐는 순식간에 기똥찬 표를 하나 뽑아냈다. 업무 분야와 업무 설명, 단가와 소요 시간, 소계와 총계로 이뤄진 표는 신입사원이라면 상사에게 칭찬받고 ‘칼퇴’(정시퇴근)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한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동시에 이 적나라함에 충격받았다. 10년 가까이 다양한 일을 해오면서도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아서.
그건 바로 내가 나의 노동에 적합한 ‘단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였다. 쌓아온 데이터가 너무 적었다. 비영리 분야든 영리 분야든, 일하고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데도 ‘돈’에 대한 직접적 대화를 불편해하고 어물쩍 피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돈 얘기 자체인 기본소득을 말해온 활동가인데도 말이다!
조건 없이 보장하는 소득에 대한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임금노동의 대가를 논의할 땐 목소리가 작아지던 나. 제안받은 보수에 대체로 “좋아요, 알겠어요” 하고 답해왔다. 친구들의 연봉 협상 얘기에는 열 올리면서 정작 내가 요구하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선 몇 달간 말도 못 꺼냈다.
노동권은 물론이고 페미니즘이 가시화한 다양한 노동에 대해 공부하면 뭐 하나. 정당한 요청임을 알아도 ‘혹시 내가 욕심쟁이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할 때면 깊은 자괴감이 든다.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닌데도, 막상 내 일이 되니 생각지 못한 자기검열이 등장했다. ‘활동가’ 정체성을 추구해온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욕구는 활동가로서 바쁘게 일해온 지난 시간에 대한 긍정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긍정은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물적 기반, 즉 ‘임금’으로 표현된다. 이를 확보하려면 나부터가 내 경험과 역량으로 만들어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인공지능 서비스보다도 몰랐다니 뼈아팠다.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을 공부한 덕에 갖게 된 관점도 소중하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듭된 질문에 답하며 가격을 매기지 않는 노동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모두가 의존하는 돌봄노동처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도 임금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그런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기본값인 사회를 상상한다.
내 노동의 가치를 ‘돈 얘기’로만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내 노동을 긍정할 만큼 적절한 보상을 얻기 위한 ‘돈 얘기’ 하기. 쉽지 않은 밸런스 게임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 또한 기본소득운동이라 볼 수 있을까? 챗쥐에 묻지는 않겠다.
김주온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1/53_17716543877486_20241013501475.jpg)
[단독] ‘양재웅 정신병원’ 주치의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유족 반발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장항준 해냈다…‘왕과 사는 남자’ 500만, 하루 관객 2배나 뛰어

이 대통령 “윤석열 선고 의견을 외국 정부에 왜 묻나”…언론 행태 비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

397억, 국힘 명줄 쥔 ‘윤석열 선거법 재판’…“신속히 진행하라”
![[속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속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2/20260222500021.jpg)
[속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즉시 효력”

“대통령의 계엄 결정 존중돼야”…지귀연의 내란 판단,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