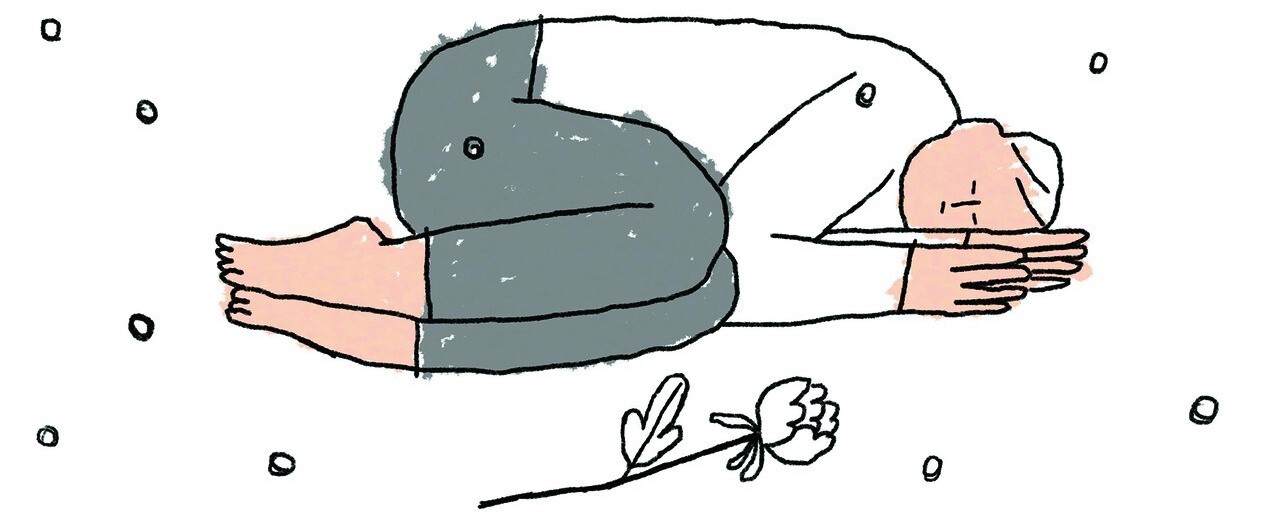우리는 4년 전 서울역 광장에서 처음 만났다. 홈리스(노숙인) 중에서도 여성은 남의 눈에 띄는 것이 위협으로 돌아오기 쉬워 한곳에 자리를 두고 홀로 지내기를 꺼리기 마련인데 특별하게도 그는 꼬박 두 번의 겨울을 혼자 서울역 광장에서 보냈다. 모든 복지제도 신청을 거절하며 살던 그는 건강이 많이 상하고서야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을 받은 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면
이렇게 멀리 돌아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마을을 떠나 서울에 와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번번이 임금을 떼였다. 보증금을 잃고 여관으로, 쪽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웃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60살 언저리인 그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자활 일자리에 참여해야 했다. 남들처럼 재빠르게 일을 따라잡지 못하자 그는 복지 수급을 단념하고 그만 상처받기로 했다. 자활 일자리에서 민폐가 된다는 감각,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떠나 거리로 나오자 고된 자유가 기다렸다.
거리생활은 쉽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에는 점퍼를 두 번이나 잃어버렸다. 밖에서 자는 그에게 벽이고 보일러인 점퍼였다. 거리생활은 순 도둑놈들과 사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이던 그는 일순간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와 다시 짚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윤영씨도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이로 만났죠. 내 점퍼를 가져간 사람도 나랑은 악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릴없는 배포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에게 그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추위와 통증, 냉랭한 시선, 열심히 일해도 해고와 임금체불이 일쑤였던 날들. 헐거워진 문고리 좀 고쳐달라 요구하면 다음달에 방 빼라는 답이 돌아오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기초생활수급권을 빼앗는 세상에서 그는 언제나 고군분투 홀로 노력하는 쪽이었다.
마음도 근육과 같아서 자꾸만 쓰면 피곤하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일상은 충격적인 손상보다 뻐근한 피로에 가까울지 모른다. 오랜 피로가 더딘 회복을, 끝내 상처로 이어지듯 한 사람의 가난은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상처는 날로 깊어지는데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세상은 모든 인간과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앗아간다. 요즘 우리는 회복할 방법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다.

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서로에게 더 나은 이웃이 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거리생활을 끝내고 다시 쪽방으로 돌아가 1년 남짓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뒤 그는 비로소 집에 돌아갔다. 시골 마을 가장 안쪽, 낡았지만 정겨운 곳, 내 나름의 질서와 멋을 갖춘 집. 해 한 줌 들지 않는 먹방이나 서울역 광장 한쪽 작은 수레 위에 몸을 누일 때마다 얘기했던 그 집이다. 지난봄에 그의 집을 찾았다. 높은 산 없이 야트막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냇물을 건너 작은 골목에 들어서자 길 끝에 동그랗게 밝은 그의 얼굴이 보였다.
매년 12월22일 동짓날이 되면 서울역과 대구역, 대전역 등지에서 거리와 쪽방 등에서 숨진 홈리스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다. 정주하는 인간의 첫 조건, 주거의 권리를 빼앗긴 홈리스들의 상태가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닮았다 하여 시작됐다. 가난으로 깨진 일상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일상적인 경쟁과 탈락의 두려움으로 상처받은 사회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서로에게 더 나은 이웃이 되기 위해 조금 더 헐거워질 시간이 정말이지 모두에게 필요하다. 2022년 서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선 432명의 홈리스를 추모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의 ‘노 땡큐!’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글 써주신 필자와 사랑해주신 독자께 감사합니다. 김윤영씨는 “말할 곳이 있어 힘이 났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19일 만에 ‘백기’ 든 정청래 “합당 추진 중단”…적나라한 권력투쟁에 리더십 타격
![‘오리발’ 판매 1위 [그림판] ‘오리발’ 판매 1위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0/20260210503930.jpg)
‘오리발’ 판매 1위 [그림판]

미 전문가들, 한미 조선협력 ‘용두사미’ 전망…“미국 내 숙련공 전무”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현미경 손질’…매물 얼마나 늘어날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신랑

국힘서 제명 김종혁 “참 애쓴다 싶어 실소…아파트 경비실도 이렇게 안해”

쿠팡으로 한국 정부 압박하던 미국…조사 결과에 태도 바뀌려나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의결…“‘내란 전두환’ 미화 해당행위”

“‘김건희 집사’ 의혹과 전혀 다른 범죄로 기소”...법원, 민중기 특검 부실수사 지적

“‘윤 어게인’ 지지 약속 지켜라”…밀려드는 ‘전대 청구서’에 진퇴양난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