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저 염소들은 오늘 다 잡아먹힐 거야.”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일하는 한 독일인 친구가 염소 대여섯 마리 찍은 사진을 보냈다. 감비아에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란다. 장에서 팔려가는 염소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불쌍해.” 그 친구 말에 나도 맞장구쳤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 우리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영국 방송 가 보도한 2017년 한 해 1인당 육류 소비를 보면, 서아프리카는 10㎏인데 한국은 51㎏, 서유럽은 80~90㎏이다. 적어도 감비아에서 염소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고기가 염소라는 건 확실히 알 거다. 그 친구가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사며 불쌍하다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없다. 도시 ‘문명’을 누리는 그와 나는 부위별로 잘려 깔끔하게 포장된 고기를 공산품 사듯 산다. 1+1 할인이면 몇 팩 더 챙긴다. 남의 손에만 피 묻히는 폭력은 우아해서 폭력의 소비자는 죄책감마저 느낄 필요가 없다.
살 안 찌는 ‘못난이’, 천형을 사는 암탉
에어컨이 쌩쌩 도는 지하철에서 한승태 작가가 쓴 <고기로 태어나서>(2018)를 읽다 울었다. 질질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마스크가 눅눅해졌다. 사람들이 더 피하는 거 같다. 작가가 공장식 양계장, 양돈장, 개농장에 취직해 쓴 르포다. 알을 못 낳는 “레몬 빛깔” 수평아리들은 쓰레기다. 이 수평아리를 키워봤자 사룟값이 더 드니 수익이 안 남는다. 키워 잡아먹는 육계는 빨리 살이 찌도록 개량한 품종이다. 수평아리는 쓰레기 자루에 꾹꾹 눌러 담는다. 자루마다 압사당한 사체가 악취를 풍긴다. 깔려도 끝까지 살아남은 놈들이 있다. 자루 아래서 소리가 새나온다. “삐악삐악.” 이 병아리들을 갈아 흙과 섞고 비료로 쓴다.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건 천형이다. 그가 일한 한 산란계 농장을 보면 그렇다. 가로세로 50㎝, 높이 30㎝ 전자레인지 크기만 한 케이지(우리)에 네 마리씩 들어가 있다. 그냥 한 덩어리다. 털은 다 빠졌다. 부리는 다 잘렸다. 서로 밟아 깔려 죽기도 하는데 사체를 빼내기도 힘들다. 케이지 밖으로 목만 빼고 수백 마리가 비명을 질러댄다.
냉면은 어떻게 할 거야?
육계 농장에서 그가 한 일은 ‘못난이’들 걸러내기다. 사룟값 드는데 빨리 살이 안 찌는 닭들의 목을 비튼다. 매일 죽이다보니 나중엔 별 감정 없이 목을 꺾는다. 끝까지 살아남아봤자, 32일이다. 그날 다 도축된다. 닭의 원래 수명은 7~13년이다. ‘못난이’ 걸러내기는 양돈장에서도 이어진다. 죽인다고 하지 않고 ‘도태시킨다’고 말한다. 빨리 살이 찌지 않는 돼지는 다리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친다. 그래도 잘 안 죽는다. 분뇨장에 버린다. 거기서도 바로 안 죽는다. 수컷 새끼돼지는 생후 한 달 즈음에 생식기를 떼낸다. 그래야 고기맛이 좋다. 빨리빨리 뜯어야 한다. 손으로 잡아뜯는다. 좁은 공간에 갇혀 사니 돼지끼리 꼬리를 씹는다. 꼬리랑 이를 자른다. 그렇게 살아남아봤자 6개월이다. 돼지의 원래 수명은 9~15년이다. 공장식 양돈장에서 어미돼지는 3년을 산다. 누웠다 일어났다만 할 수 있는 스톨(감금틀)에 갇혀 새끼를 낳는다. 생후 210일부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도축된다.
닭과 돼지는 사료를 먹는다. 개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 개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대가로 돈을 번다. 개는 땅에서 90㎝ 띄운 뜬장에 갇혀 있다. 똥오줌을 싸면 케이지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다. ‘못난이’를 걸러내진 않는다. 개는 살이 너무 찌면 소비자가 안 좋아한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주인이 쉽게 죽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를 죽인다. 그가 일한 두 곳에선 목을 매달거나 감전사시켰다.
이 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월 150만원을 받고 농장에 마련된 컨테이너에 사는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다. 돼지를 옮길 때면 자루를 퍼덕이며 몰다 결국 두들겨팬다. 이 돼지들을 다 옮겨야 컨테이너에라도 들어가 잘 수 있다. “병아리의 고통도, 돼지의 고통도, 개의 고통도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갔다. 언젠가부터는 왜 내가 이걸 문제 삼았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다. 물건은 그렇게 다루는 거다. 작업이 끝나고 내가 신경 썼던 것은 오직 얼얼한 팔의 피로뿐이었다.”
이 잔혹극은 인간이 더 맛있는 고기를 더 싸게 더 많이 먹기 위해 벌어진다. 소고기 1㎏ 생산하는 데 곡물 12㎏이 필요하다. 전세계 곡물 3분의 1을 가축에게 먹이는 동안 인간 8억 명은 굶주린다. 축산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김한민, <아무튼, 비건>)
지하철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결심했다. 최소한 채식을 해야지. 나는 백수고 친구도 별로 없다.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거의 사회적 격리 상태였다. 이보다 더 채식을 실천하기 좋은 조건은 없다. 몸만 부지런해지면 된다. 냉장고가 생화학 연구소다. 채소들이 형체가 없다. 형체 있을 때 요리해 먹기만 하면 된다. 돼지, 닭, 소의 고통에 비해 이건 정말 사소한 수고 아닌가.
“냉면은 어떻게 할 거야?” 채식을 해보겠다니 한 친구가 물었다. 맞다, 냉면. 이 여름만 지나고 시작할까? 한 친구는 채식을 시작하기 전날, 육식에 대한 미련을 끊으려 닭튀김 한 상자를 끌어안고 다 먹었다고 했다. 냉면 한 다섯 그릇 먼저 먹고 끊을까? “생선은 어떻게 할 거야?” 맞다, 조기. 생각난 김에 조기를 두 마리 구워 먹었다. “달걀은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달걀은 은총이다. 라면에 넣어 먹고 밥 비벼 먹고 프라이해 먹고 삶아 먹으며 한 끼를 때운다.
강제 임신시킨 젖소, 젖을 빼앗긴 송아지
이것 빼고 저것 뺐다. 공장식 축산이 없어질 때까지 육고기만 끊기로 했다. 3주 됐다. 벌써 몇 번 어겼다. 분식집에서 김말이 고르다 참지 못하고 만두까지 먹었다. 햄버거 앞에서 이 결심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다시 적는다. 육고기라도 끊겠다. 내 윤리는 입맛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가? 다른 생명의 고통은 내 혀끝의 쾌감보다 얼마나 가볍나? 빵집에서 팥과 버터가 들어간 바게트 맛이 궁금해 샀다. 크림빵도 샀다. 우유를 많이 먹으려고 인간은 젖소를 강제 임신시키고 송아지에게 돌아갈 젖을 가로챈다. 두 빵을 비닐에 따로 담아 다시 봉지에 넣어준다. 겹겹이 비닐이다. 소비자는 왕이니까. 두 빵이 엉켜선 안 된다. 집에 돌아오니 개 몽덕이가 두 발로 서서 기쁘다고 난리다. ‘그 무엇도 착취하지 않는 몽덕아, 너는 세상에 무해한 존재구나.’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이란전 안 풀리자…트럼프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793058302_20260313501532.jpg)
[단독] 이태원 참사 다음날 용산구청장, 대통령 경호처 ‘8100’번과 통화했다

“아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길”…60일된 딸 둔 가장 뇌사 장기기증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1/53_17732246670747_20260311503553.jpg)
[단독]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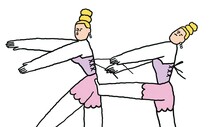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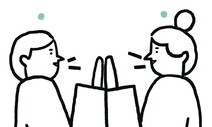


![[아무몸] 아홉 살 여자가 말했다 “여자애라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1/53_16059651125192_9116059651015046.jpg)
![[아무몸] 자유는 몸으로 만질 수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04/53_16018177874382_6916018177743424.jpg)
![[아무몸] 밥하는 일보다 중요한 노동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1/53_15997893871638_1615997893661638.jpg)
![[아무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선 남의 더러움이 필요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29/53_15986906788614_5915986906570301.jpg)
![[아무몸] 더럽게 외로운 나를 구한 ‘개 공동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6306094_5615955756190329.jpg)
![[아무몸] 어쩔 수 없는 나여도 괜찮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0/53_15943674064803_1415943673955014.jpg)
![[아무몸] 누가 나를 돌볼까, 나는 누굴 돌볼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5419299_24159315452916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