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약골이다. 고등학교 때 100미터를 24초에 달렸다. 내 발만 보고 달릴 때는 땅이 쉭쉭 지나갔다. 너무 열심히 달려서 토할 거 같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니 선생님이 그런다. “왜 달려오니? 걸어오지. 20초보다 느리면 점수 다 똑같아.”
점수로 연결되기에 몸의 움직임도 두말 안 나오도록 측정 가능해야 했다. 농구는 이런 식으로 배웠다. 1분 안에 골을 몇 개 넣나. 그 개수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드리블은 삼각형 세 변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주변을 10분 안에 몇 번 도는지로 실력을 쟀다. 농구 경기를 해본 적은 없다. 지루하고 무서웠던 체육 시간이 그래도 딱 한 번 재미있었던 적이 있다. 드리블 수업 때였다. 도수 높은 안경을 쓴 30대 남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다 대자로 엎어졌다.
남자는 운동장에서 축구, 여자는 네모 칸에서 피구
몸을 부닥치고 노는 즐거움을 배울 겨를이 없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남자아이들이 운동장을 차지하고 축구할 때, 여자아이들은 흰색 분필로 선을 그린 네모 칸 안에서 피구를 했다. 그게 너무 당연해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다. 분필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 선 안에서 다른 편 여자아이를 공으로 맞혀야 우리 팀이 이겼다. 왜 다른 애들을 맞혀야 하나? 얼굴에 정통으로 공을 맞고 우는 애들도 있었다. 느린 공에 살짝 맞고 빨리 ‘죽기’를 바랐다. 피구를 하지 않을 땐 응원 연습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응원의 달인이 돼 선생님이 사인을 보내면 한쪽만 은박지를 댄 짝짜기로 아이들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규칙을 신탁처럼 떠받들었던 모범생인 나는 춤은 ‘날라리’만 추는 건 줄 알았다.
여고 친구들은 종아리 근육이 불뚝 튀어나올까 걱정했다. 그때 내 앙상한 다리가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했다. 몸이란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도구이거나 전시품 같은 것이었다. 오로지 내 것인 내 몸인데 내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큰 재미를 그렇게 잃어버린 거 같다.
30대가 돼 여러 운동을 기웃거렸다. 체력이 바닥나서 깨도 자는 거 같고 자도 깨 있는 거 같았다. 직장에서 버티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했다. 가늘지만 근육이 도드라진 마돈나 팔을 갖고 싶기도 했다. 그때 사들인 장비들이 아직도 베란다에 쌓여 있다. 요가 매트, 국선도 도복, 스쿠버다이빙 오리발 한 짝…. 요가 시간에 허리를 구부려 발가락을 잡으란다. 다들 반으로 몸을 접었다. 나랑 50대로 보이는 아저씨만 손가락이 무릎 언저리를 맴돌았다. 그 아저씨와 나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손가락이 종아리까지 오기도 전에 흐지부지됐다. 스쿠버다이빙은 장비가 비싸서 그만뒀고, 국선도는 명상하다보면 지난 일이 떠올라 더 화가 치밀어서 그만뒀고, 수영은 수영복 갈아입기 싫어 그만뒀다. 선배랑 방송댄스를 같이 배울 때는 다들 꿈틀꿈틀 몸이 물결치는데 우리는 손으로만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보니 재미가 없었다. 선배는 음악이 쿵쾅거리는 와중에도 몸풀기 동작을 하려 바닥에 눕기만 하면 장군같이 당당한 자세로 잠이 들곤 했다. 운동과는 결국 친해지지 못했다.
재소자 징벌용으로 개발된 러닝머신
“어머니, 제가 트레이너 5년차인데 이런 인바디는 처음 봤습니다.” 내 체지방과 근육량을 점검하는 그의 표정을 보니 진짜인 거 같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며 순전히 남인데도 걱정되는 수준인가보다. “40대엔 근육이 저절로 사라져요. 지금 몸을 유지만 하려 해도 근육운동 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고 할 때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인바디’ 숫자들로 추정컨대 내 몸은 피부라는 비닐봉지에 체지방이 담긴 풍선 같은 상태라고 했다. 그날 무려 10회에 50만원이나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끊고 말았다. 마돈나 팔이고 뭐고 이제 살려면 근육이 필요하다.
나를 맡은 퍼스널 트레이너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27살 청년은 성실했다. 한 회당 5만원, 돈이 아깝긴 한데 최대한 몸을 안 움직이고 그 시간을 까먹으려고 나는 내가 아는 대화의 기술을 총동원했다. 트레이너가 된 계기는 뭔지, 여자친구랑 사이는 어떤지, 고민은 없는지… 푸시업 한 개를 못 하고 부침개처럼 바닥에 몸을 깐 상태에서 나는 절박하게 대화의 끈을 잡았다. 벌 받을 때나 했던 기마 자세로 있지도 않은 상상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쾃을 한 번이라도 덜 할 수 있다면, 어떤 대화 소재라도 상관없었다. 쉬려고 물을 엄청나게 마셨다. 리베카 솔닛이 쓴 <걷기의 인문학>을 보면 러닝머신의 원조는 교도소 재소자 징벌용으로 개발됐단다. 끔찍하게 지루한 벌이라 재소자들이 싫어했단다. 아무리 걸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풍경도 바뀌지 않는 러닝머신에 오르면 왜 이게 징벌용인지 알 거 같았다.
10회가 끝나고 성실한 청년 트레이너는 연장하길 권했다. 아직 근육이 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근육 만드는 과정이 괴롭기도 했지만, 이제 돈이 없었다. 트레이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도 성실해 보였다. 그 뒤 트레이너 얼굴을 보기가 미안해서 체육관에 못 갔다. 그러다 코로나가 왔고 나는 아직도 지방이 담긴 비닐봉지 상태로, 그 비닐봉지마저 나날이 흐물흐물해지고 있다.
그래! 코로나만 끝나면…
트라우마를 평생 연구한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책 <몸은 기억한다>에서 함께 몸을 움직이는 연극, 체육, 음악 시간 등이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침 튀기며 강조한다. 그 중요한 교육이 교과과정에서 밀려난다고 한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몸의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 안전하다는 느낌과 자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놀며 타인의 몸과 내 몸이 리듬을 공유하고 협응하는 걸 느낄 때 안전하다는 느낌도 자란다. ‘우분투’(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격언은 이렇게 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연은 책 <근육이 튼튼한 여자가 되고 싶어>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며 오로지 자신을 느끼고 자기 몸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충만한 기쁨을 썼다. 옷맵시가 안 난다는 이유로 미워했던 튼실한 허벅지를 사랑하게 됐단다. 몸과 함께 마음이 치유됐다고 고백한다. 자유는 추상이 아니라 몸으로 만질 수 있다. 나도 내 몸의 움직임으로 내 근육 마디마디를 (있다면) 느껴보고 싶다.
소파에 누운 듯 기대 과자를 까먹으며 인터넷으로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을 본다. 김민경이 헬스, 필라테스 등을 거쳐 근육이 매혹적인 척추 요정이 되는 과정을 보며 오늘도 다짐한다. ‘그래! 코로나만 끝나면…’ 과자 부스러기가 배 위로 떨어졌다.
김소민 자유기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 땅, 국제 사회 알려야”…민주 “즉각 중단” 촉구

이란전 안 풀리자…백악관 “가짜 뉴스 CNN” “망해가는 NYT” 비난

트럼프 “이란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라”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징계 중단하잔 말에 SNS 글

“이정현 전화는 꺼져” 장동혁, 오세훈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신고하세요”…“여기요! 1976원” 댓글 봇물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13/53_17733948569591_20260312502255.jpg)
[단독] 현대중공업,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기로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사퇴…“생각한 방향 추진 어려워”

오세훈 미등록, 이정현 사퇴…난맥상 국힘, 장동혁 대표 선택은

‘미국 vs 일본 4강전 용납 못 해’…또 대회 중 바뀐 WBC 대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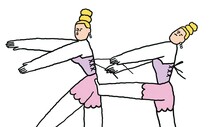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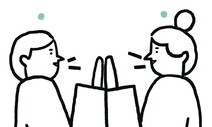


![[아무몸] 아홉 살 여자가 말했다 “여자애라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21/53_16059651125192_9116059651015046.jpg)
![[아무몸] 밥하는 일보다 중요한 노동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1/53_15997893871638_1615997893661638.jpg)
![[아무몸] 나의 깨끗함을 위해선 남의 더러움이 필요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29/53_15986906788614_5915986906570301.jpg)
![[아무몸] 더럽게 외로운 나를 구한 ‘개 공동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756306094_5615955756190329.jpg)
![[아무몸] 어쩔 수 없는 나여도 괜찮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10/53_15943674064803_1415943673955014.jpg)
![[아무몸] 누가 나를 돌볼까, 나는 누굴 돌볼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26/53_15931545419299_2415931545291646.jpg)
![<span>[아무몸] 쓰레기 자루 속 레몬 빛깔 병아리</span>](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6/53_15922336150495_96159223360268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