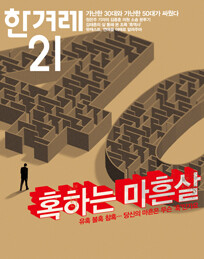19세기 말 조선을 무대로 한 황석영의 신작 장편 의 주인공 이신은 서얼(庶孼)이다. 정확히는 서자(庶子)가 아닌, 얼자(孼子)다. 속되게 말해 첩의 자식, 그것도 어미가 천인이라는 뜻이다. 서자 출신인 아비가 의원이라 형편은 어렵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그래도 사람 대접 못 받기는 매한가지. ‘어미가 노비이면 노비가 된다’는 노비세습제도(종모법, 조선초엔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노비’라는 종모종부법이었으나 임진·병자 양란 이후 노비 폭증으로 세수가 줄자 오랜 논란 끝에 이렇게 바뀜)의 굴레를 아비의 도움으로 벗어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조선의 기본 법전인 의 “첩의 자식과 개가한 여자의 자식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 탓에 벼슬길은 언감생심이다.
그런 이신이 “제 실력을 가늠해보고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간다. 우여곡절 끝에, 벼슬을 돈으로 사려는 부자 선비 대신 과시를 치른다. ‘불법 대리응시’지만, 아무 일 없다. 고관대작들이 벼슬을 사고팔고, 눈치 빠른 장사치들은 “과시야말로 큰 돈을 만져볼 대목 중의 대목”이라며 떡고물을 챙기는 아수라판에서 뭘 바랄까.
이 일로 이신은 자신을 ‘밖’으로 밀어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 장터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傳奇) 노릇을 호구의 방편 삼아 산천을 떠돌던 그가 ‘사람이 하늘이다’(人乃天)라는 천도교에 입도한 건 어쩌면 필연이다. 이신은 갑오농민전쟁 뒤에도 끝내 뜻을 꺾지 않고 저항하다 강원도 영월 산골에 묻힌다. 양반의 나라 조선은 ‘나도 사람이다’라는 민초의 절규를 외세의 힘을 빌려 진압했고 망국으로 치달았다. 황석영이 대가의 솜씨로 이 과정을 묘사하는데, 서늘한 바람이 가슴을 친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나 안과 밖의 구분이 있다. ‘안’이 넓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고, 한 줌의 무리가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면 결국 민란이나 혁명이 일어난다. ‘밖’은 반체제의 씨앗이자 어미다. 민주주의란 ‘안’을 넓혀 ‘밖’을 줄이고 배려하려는 무한운동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이유로 수백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간 쇼바’로 여기고 대학입시로 학생들을 점수 매겨 줄 세우는 한국 사회는, 한 줌 양반의 기득권을 지키려 서얼과 노비와 여성을 ‘비인간’으로 차별한 조선에서 얼마나 머나. 노조 추진 직원에 대한 무차별 사찰 및 해고, 특권층 자제 ‘특혜 입사’ 따위를 일삼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등 한국 대자본의 행태에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계층 상승 기회가 닫힌 폐쇄사회’라는 응답이 61.6%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뜻하는 바는 자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연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드론(무인폭격기)으로 무슬림들의 마을을 맹폭한 오바마의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에 설렐 이유는 없다. 그렇긴 해도 여성의 평등 임금, 동성애자의 평등한 결혼권, 소수인종의 평등한 투표권 행사 등을 ‘우리 시대의 임무’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자명한 진리가 있다”는 237년 전 미국 독립선언서의 문구를 인용한 오바마의 외침은 듣기 좋았다. 150년 전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50년 전 마틴 루서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다”며 인용한 바로 그 문구다. 나는 오바마의 꿈이 이뤄질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꿈을 잃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죽은 사회라는 건 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12/20260212504997.jpg)
“저긴 천국이네”…집에서 삶 마감 가능한 일본 시스템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