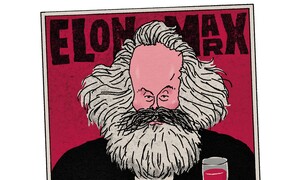박정희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하면 일본 군가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기 좋아하는 예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960년대 이 땅의 대표적 진보세력이던 혁신계 인사들도 요정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곤 했다는 얘길 들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던 나는 다소 분개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럴 수가! 방문연구차 지냈던 일본 생활 불과 6개월여 만에 콧노래로 ‘엔카’를 흥얼거리기에 이르더니, 급기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라오케에서 그 노래를 불러젖히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술 깨고 생각해낸 마음속의 핑계인즉, 어차피 노래야 문화이고 생활인 것을,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 유행가 한 가락에 그 무슨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적 의미 부여람?
에 발끈하는 언론
청와대 만찬에서 이 울려퍼졌다는 기사는 학교 다닐 때 화염병은 고사하고 돌멩이 한번 던져본 적 없는 386세대에게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얘깃거리였다. 누구에게 그것은 독재정권에 맞서 제적이나 강제입영, 체포,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던 시절의 군가요 행진곡으로 기억된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저 20대 젊은 시절에 자주 듣던, 그래서 귀에 못이 박혀버린 추억의 옛 노래로 기억된다. 아직도 가사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나 따위를 들으면서 왠지 모를 향수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그 시절의 병영적 통제사회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저 노래는 노래일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박정희가 부른 일본 군가가 ‘다카기 마사오’(그의 창씨명)의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소 과장된 해석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군국주의의 원흉이 되살아나오는 공포를 느낄 사람들도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게 있어, 그날 저녁 만찬 메뉴라는 샥스핀에 발끈한 야당 대변인의 독설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주요 일간지에 사설이나 기명 칼럼, 하다못해 가십으로라도 오르내린 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는 협박이었다. 광주항쟁을 들먹이며 잊고 있던 노래의 탄생 경위에다 그 노래가 암울한 시대에 얼마나 힘이 되었던가까지 소상히 설명해주고 난 뒤, 이제 청와대 뒤풀이 자리에서 그 노래가 합창될 정도로 변해버린 세상을 은폐된 한탄과 함께 마지못해 인정한 뒤, 그 주역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주류가 되었으니 주류에 맞게,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주문하거나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끝을 맺는다. 아뿔싸, 나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을 오가면서 이런 글을 몇개나 읽어야 했고, 그제야 샥스핀보다는 이 가져다준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유의 글을 몇편 반복해서 읽다 보니 나는 문득 그 노래를 불렀다는 주체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저 젊은 날의 한때를 기억하면서 가요무대의 옛 노래 따라 부르듯 불렀을 뿐인 노래 한 가락에, 그 옛날 반대편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력의 장송곡으로 그 노래를 들어야 했던 이들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변화된 정치 지형을 읽어라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그저 노래 하나 부른 것으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는 엉뚱한 상상 속에 사로잡혀버리는 것과, 그래서 그들 자신의 물질적 기반과 무관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에 동참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등속으로 평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주류이고 싶어하는 언론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에서, 그러나 똑같은 주문을 하고 싶다. 당신들이 발 딛고 선 지형은 이미 옛날의 그것은 아닐뿐더러, 그들과 당신들은 이미 같은 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노래는 노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임은정, ‘한명숙 사건’ 소환해 백해룡 저격…“세관마약 수사, 검찰과 다를 바 없어”
![[속보]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속보]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7/53_17721491840937_20260227500263.jpg)
[속보] 쿠팡, 4분기 영업익 97%↓…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국힘 지지율 17% “바닥도 아닌 지하”…재선들 “절윤 거부에 민심 경고”

‘재판소원 육탄방어’ 조희대 대법원…양승태 사법농단 문건 ‘계획’ 따랐나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법왜곡죄’ 위헌 소지 여전…판사들 “누가 직 걸고 형사재판 하겠나”

러시아 “돈바스 내놓고 나토 나가”…선 넘는 요구에 우크라전 종전협상 ‘난망’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