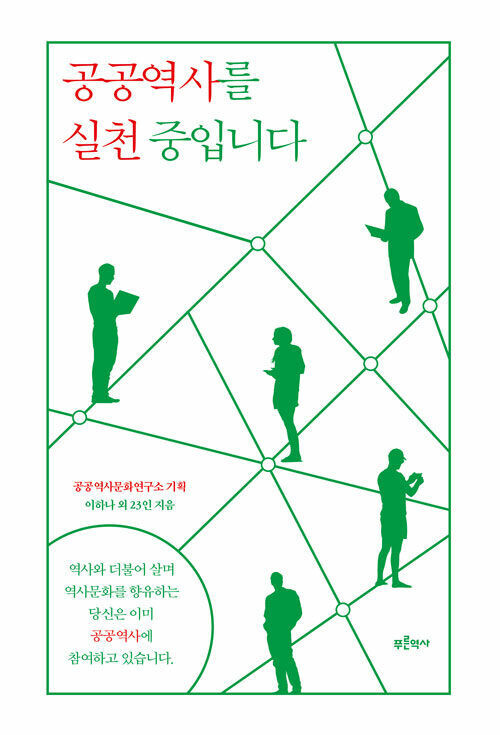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공공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이하나 외 23인 지음, 푸른역사 펴냄
바야흐로 ‘역사 과잉’의 시대다. 구태여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역사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텔레비전만 틀면 스타 강사와 유명 교수가 명강의를 펼치고 연예인이 학생처럼 귀 기울여 듣는 예능인지 교양인지 헷갈리는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비단 ‘공급’만 과잉인 게 아니다. ‘수요’ 역시 과잉이다. 역사를 소재로 삼은 영화나 드라마만 나왔다 하면 재야의 수많은 ‘무림고수’가 사실을 왜곡하진 않았는지, 친일이나 친중 논란은 없는지 매섭게 파고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역사학도는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나만 해도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열 번도 넘게 받았다. 물론 (내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역사학 전공자의 ‘전문적’ 식견을 기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역사학도가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역사란 너무 중요해 역사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들 한다지만, 그냥 다들 역사가 너무 만만해서 구태여 역사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공공역사문화연구소가 펴낸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는, 그 점에서 얼핏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한다. 역사 자체가 공적 성격을 지니는데, 구태여 ‘공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나 지금처럼 수요·공급 양쪽에서 역사가 넘쳐나는 시대에 말이다. 집필진 24명은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자주 멈춰서고 주저한다. 분명 하나의 책으로 묶여 나왔는데도 한 저자가 다른 저자를 향해 공공역사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몰아붙이기도 한다.
요컨대, 이 책은 수많은 질문과 고민, 충돌과 불협화음의 모음이다. 일단 공공역사가 상아탑의 전문적인 역사연구와 달리 학자가 아닌 대중 혹은 시민을 청중으로 삼고, 나아가 주인공으로 끌어올리려는 역사학이라는 건 알겠다. 박물관 학예사와 역사교사, 드라마작가와 팟캐스트 진행자를 아우르는 집필진은 공공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역사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단순히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면 그만인가, 아니면 대중이 스스로 ‘역사하기’(Doing History)에 참여하게끔 북돋아야 하는가? 아니, 애초에 대중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집단인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학계에서 훈련받지 못한 아마추어 역사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기억과 역사의 관계는 또 어떻고? 무엇보다 대중이 역사가의 소신과 어긋나는 기대를 드러낼 때, 가령 위대한 고대사에 대한 갈망이나 스타 강사의 족집게 역사학에 대한 선호 앞에서 역사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책은 이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로 정리하려 들지 않고,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 무엇이든 정해진 답이 있어야만 하는 시대에 오히려 용기 있고 정직하다 느껴지는 태도다.
물론 책이 순전히 모호함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첫머리에서 한국의 공공역사 논의를 정리한 이하나는 오늘날 ‘역사학의 위기’란 사실 ‘역사학자의 위기’라고 말한다. 그는 역사학의 실용성을 강조한 공공역사가 “취업에 목마른 사학과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이하나도 알고 있을 것이다. 공공역사에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역사학도의 미래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역시 책을 읽어도 마땅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유찬근 대학원생
*역사책 달리기: 달리기가 취미인 대학원생의 역사책 리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국세청 직원과 싸우다 던진 샤넬백에 1억 돈다발…고액체납자 81억 압류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869463045_20260226502791.jpg)
[단독]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집행 못 했다…남은 5일은?

조희대, ‘노태악 후임’ 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안귀령 황당 고발’ 김현태, 총부리 잡혔던 전 부하 생각은?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로…부동산공화국 해체도 가능”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수급자 감축 검토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6/53_17720725126758_20260226501531.jpg)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다주택 정책 잘했다” 62% [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