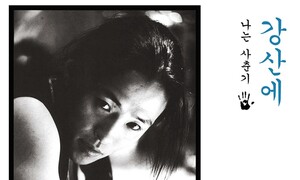이승윤의 <꿈의 거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이승윤 유튜브 갈무리
대학 시절 내내 외톨이였다. 입학하고 곧장 입대하는 바람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다. 나는 자꾸만 겉돌았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초소 근무 때는 버틸 만했다. 선임이 조는 동안 주위를 살피며 손바닥에 글을 적곤 했다. 글자들이 팔목을 지났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은 자주 다퉜다. 거실에서 고함이 오갈 때면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베개로 막았다. 공책에 적힌 이야기는 거의 슬픈 내용이었다.
창작 수업을 들었을 때다. 수강생이 돌아가며 단편소설을 내고 합평하는 수업이었다. 내가 제출한 소설의 제목은 ‘눈의 높이’였다. “몇 번씩이나 쌓인 눈의 높이를 물어보았네” 하는 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5·7·5의 3구 17자로 된 일본 특유의 짧은 시)에서 따왔다. 어느 젊은 남자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였다. 그의 부모와 경찰이 그가 남긴 흔적을 쫓아 산에 오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난다.
한 학생의 평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이 소설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며 누가 시간을 들여 이런 이야기를 읽겠느냐고 직설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평을 듣곤 했다. 허무주의에 빠져 삶을 체념하고 있다고.
한 명의 독자, 어딘가 있을 그의 존재를 믿었다. 그 믿음으로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소설 ‘눈의 높이’는 설산을 오르며 구상한 것이다. 스무 살 무렵 오랜 친구와 아이젠을 한 쪽씩 나눠 차고 산에 올랐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정상에 다다랐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표지석 앞에 서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나는 절망을 노래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 시절 나를 떠올리면 다른 사람 같다. 창밖의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던 그때의 나. 화분의 꽃이 창 쪽을 향해 피고 졌다. 몇 달을 방에 틀어박혀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밥상 앞에 앉혔다. 문학에는 문외한인 아버지가 “글쟁이에겐 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차오르고 비워지는 술잔을 말없이 바라보며 마른 오징어를 씹고 또 씹었다.
친구는 불투명한 앞날이 불안하다고 했다. “견디고 또 견딜 뿐 다른 방법은 없어. 묵묵히 쓰는 게 나의 운명이야.” 그의 언어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짙게 묻어 있었다. 나는 글 쓰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나를 몰아붙였다. 쉽지 않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러다 도망치고 싶었을 때 그는 파도 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너무 짊어지며 살지는 말자고.
파도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나는 파도 앞에 서 있다.
이승윤의 두 번째 정규 앨범 《꿈의 거처》는 “길 같은 건” “잃어도 상관없”다고 이 세상에는 진리 같은 건 없다고 노래한다. 그럴듯한 것을 좇아 삶을 완성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주어진 관문을 넘고 넘어 근사한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이름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되는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 이제 누구도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단 한 명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보다 아프게” 노래하는 이승윤은 이 세상의 “울타리” 바깥에서 “날것의 미학”(<야생마>)을 선언한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결코 “박제된 정답”(<꿈의 거처>)이 아니다. 길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을 때 홀연히 나타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네가 있다.
최지인 시인
*너의 노래, 나의 자랑: 시를 통해 노래에 대한 사랑을 피력해온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시인의 노래 이야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태진아 “전한길에 법적 대응”…일방적으로 콘서트 참석 홍보·티켓 판매

트럼프, ‘슈퍼 301조’ 발동 태세…대법원도 막지 못한 ‘관세 폭주’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아내 이어 남편도 ‘금메달’…같은 종목서 나란히 1위 진풍경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0/20260220502864.jpg)
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어디서 본 듯한’....국힘 이정현 야상 점퍼 ‘시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2/53_17717357343273_20260222501198.jpg)
[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당 망치지 말고 떠나라”…‘절윤 거부’ 장동혁에 쏟아지는 사퇴 요구

우크라, 인구 4배 러와 맞서려 기술 혁신…‘무인장비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