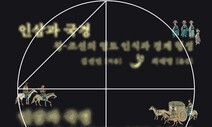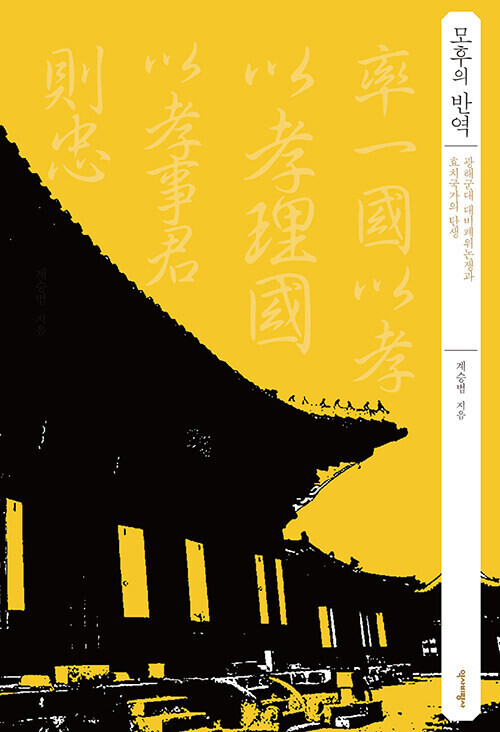
<모후의 반역>, 계승범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천민 하선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해군의 대역을 맡는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본디 저잣거리 만담꾼에 불과하던 하선은 얼떨결에 오른 용상에서 비로소 왕 노릇의 지엄함을 깨닫고, 대역에서 벗어나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임금으로 거듭나려 한다. 이미 <카게무샤>를 비롯해 수많은 작품에서 익히 봐온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지금껏 한국 사회가 광해군을 소비해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역사 속 광해군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세운다. “백성이 원하는 진짜 왕이었지만 궁궐을 떠나야 했던 하선”에게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렸다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단적인 예다.
계승범의 <모후의 반역>은 상상 속의 하선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광해군에 주목한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저자는 광해군을 북인의 공포정치에 휘둘린 허수아비나 대동법을 실시한 민생군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 탁월한 외교관으로만 여겨온 그간의 연구에 반기를 든다. 충과 효라는 유교의 두 가치가 팽팽하게 부딪치던 격동기, 광해군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판을 짜고 노련하게 정국을 요리한 키플레이어였다는 것이다.
적자도 장자도 아니었던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임진왜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힘입어 세자 자리에 올라 분조를 이끌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선조의 질시와 의심에 시달려야만 했다. 상국인 명은 자국의 정치 사정 때문에 세자 책봉을 다섯 차례나 거부했다. 16년에 이르는 세자 시절 동안 온갖 풍파에 시달린 결과 광해군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거듭났고, 무엇보다 임금으로서 절대적 권위에 집착했다.
그런 만큼 용상에 오른 광해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우선 형인 임해군을 유배 보내고, 그의 죽음을 사실상 사주했다. 여기까진 신하들도 이해해줬다. 하지만 다음 대상이 이복동생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로 정해지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모자가 연루됐다는 역모 혐의가 워낙 어처구니없었던데다, 인목대비는 계모일지언정 광해군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효로써 섬겨야 할 어머니가 임금인 아들에게 불충한 이 사건을 두고, 유교국가 조선은 충과 효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휘말린다.
저자는 본래 충효의 우선순위란 유교적 맥락에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한 주제였음을 강조한다. 다만 조선에선 인목대비의 혐의가 불분명한 데 비해 계모를 폐위하려는 광해군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므로 할 수 없이 신하들이 최후의 바리케이드로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명분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고개가 갸웃해지는 설명이다. 나아가 저자는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의 실책 중 폐모만이 강조되며 조선은 충에 대한 효 우위의 사회로 거듭났고, 이는 근대 여명기에 강력하고 통일된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다. 소설을 방불케 하는 촘촘하고 흥미진진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저자 역시 진짜 광해군이 아닌 ‘근대화’라는 이름의 하선을 대신 세운 건 아닌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유찬근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정년이’ 김태리 출두요…여성국극, 왜 짧게 흥하고 망했나

이재명, 오늘 비상회의 열고 광화문으로…“당 혼란스럽지 않다”

책 버리려거든 통도사로 보내시오…“책들한테는 절이 최고 안전”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1115/53_17316500762618_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백설공주’ 제글러 “또 다시 증오의 4년”… 트럼프 비판했다 사과

러시아, 중국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투기 첫 수출 계약

토마토 ‘이것’, 유전자 가위로 제거했더니 단맛 30% 상승

일본 왕실서 남편과 ‘반전·반성’ 목소리 냈던 ‘유리코 비’ 별세

16m 고래 ‘사체’ 악취 풍기며 4천km 이동…보라, 인간이 한 일을

김준수, BJ한테 8억 뜯겼다…“녹취 공개 101차례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