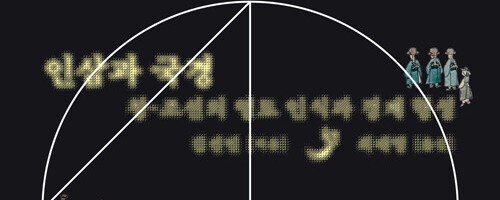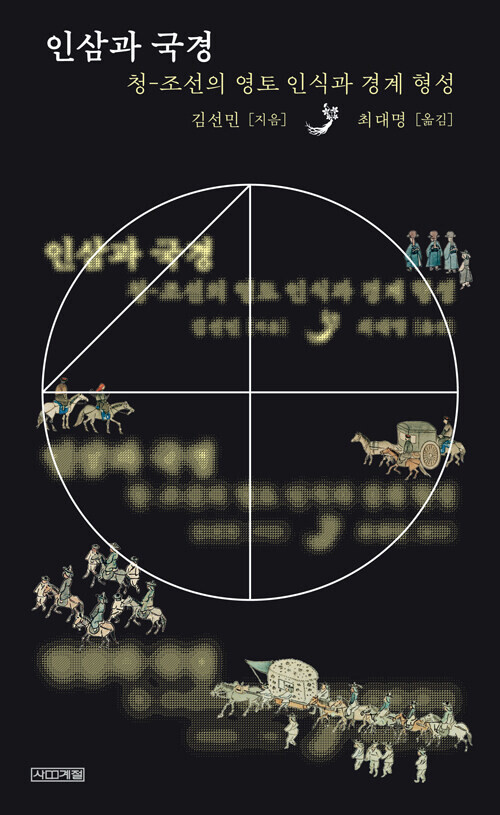
1637년, 조선 국왕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며 신하의 예를 표했다. 1704년, 노론의 이데올로그 권상하는 스승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기리는 만동묘를 세웠다. 1780년, 연행사로 연경(현 베이징)을 찾은 박지원은 그 화려함과 개방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오늘날 조선과 청의 관계는, 이렇듯 몇 개의 인상적인 사건이나 이미지로 기억된다. ‘오랑캐’에 항복했다는 굴욕, 이미 멸망한 옛 왕조에 대한 집착, 선진적 문물과 사상에 대한 동경만이 250년 넘게 이어진 두 나라의 관계를 설명한다.
김선민의 <인삼과 국경>은 정형화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넘어 조선과 청 사이에 이뤄진 사람과 재화의 이동, 구체적인 타협과 교섭의 과정에 주목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지은이가 보기에 조-청 관계를 특징짓는 중요한 변수는 조선과 청이 국경을 맞댔으며 그곳에서 귀한 인삼이 났다는 사실 자체다. 삼전도의 굴욕이나 존명의리, ‘북학’(北學)이라 부른 새로운 학문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본래 명과 여진, 조선의 세력이 중첩된 ‘변경’이었던 만주는 청이 이 일대의 패자로 등극하며 더 확실한 지리적 경계를 갖게 된다. 이전까지 요동이라 부르던 이곳이 만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635년 홍타이지가 족명(族名)을 여진에서 만주로 바꾸면서였다. 지역으로서 만주는 종족으로서 만주족과 사실상 동시에 ‘발명된’ 셈이다. 그런 만큼 청은 정체성의 뿌리인 만주에 다른 종족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만주, 그리고 만주족 정체성을 떠받친 산물이 인삼이었다. 애초에 청 태조 누르하치가 요동의 패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삼 교역 덕분이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 역시 조선인이 불법으로 청의 강역에 들어와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엄히 금지했고, 이를 조선 침공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내걸었다. 병자호란 이후 홍타이지가 조선에 요구한 다양한 물품 목록에 인삼이 빠졌다는 사실은, 그 점에서 퍽 의미심장하다. 홍타이지에게 인삼은 조선이 아닌 청의 ‘특산품’이었다.
이처럼 청은 만주라는 지역을 새로이 경계 짓고, 인삼을 그 ‘푯말’로 삼음으로써 지역적·종족적 정체성을 확실히 구축하려 했다. 문제는 홍타이지의 엄포에도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인삼을 채취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과 조선은 양국의 경계를 확실히 정하기보다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둔 채, 끊임없이 교섭하고 협상함으로써 범월(犯越) 문제에 대처했다. 한인(漢人)의 만주 이주와 개간이 본격화한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두 나라의 경계는 차라리 면에 가까운 두꺼운 선인 ‘국경지대’로 존재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이 국경 문제에 대처한 방식이다. 조선은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너그러움에 ‘전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청의 양보를 얻어냈다. 청에 대한 지극한 사대와 나라의 주권 수호는 적어도 당시 조선인에게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조선이 백두산을 비로소 자국 영토로 인지하고 북방 개척에 나선 게 1712년 청의 요청에 따른 두만강 수계(水界) 공동조사 이후였다는 것도 퍽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근대 이전일수록,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유찬근 대학원생
*역사책 달리기: 달리기가 취미인 대학원생의 역사책 리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이 대통령 “농지매각 명령이 공산당? ‘경자유전’ 이승만도 빨갱이냐”
룰라 ‘여보, 새끼손가락 없는 맞춤장갑 좀 봐요’…뭉클한 디테일 의전

정청래 “장동혁, 고향 발전 반대하나…충남·대전 통합 훼방 심판받을 것”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전한길, 반말로 “오세훈 니 좌파냐?”…윤어게인 콘서트 장소 제공 압박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24/20260224503791.jpg)
법원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림판]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계엄군 총구’ 안귀령 고발한 전한길·김현태…“탈취 시도”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