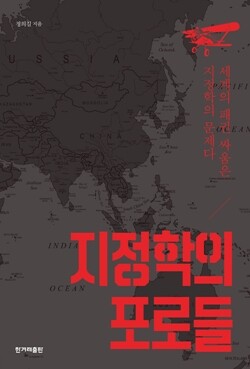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 최고 지도자가 전쟁광이라서(히틀러)? 판단 오류와 모험주의 노선 때문에(김일성)? 이런 설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하필 왜 ‘그때, 그곳’에서 포탄이 난무했는가를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국제정치 역학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정치·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지정학’(geopolitics)이 유용한 분석 틀로 떠오르는 지점이다. 대륙이동설로 지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판구조론처럼, 지정학은 ‘분쟁의 판게아 이론’으로서 탁월한 분석을 제공한다.
정의길 국제문제 전문기자가 쓴 (한겨레출판 펴냄)은 지정학의 틀을 빌려 근현대에 벌어진 패권 다툼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이 책은 베스트팔렌조약(1648년)을 기점으로 근대적 의미에서 국제정치 개념이 생겨난 이래 전세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로 이해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해 한반도의 러일전쟁으로 끝난 영국과 러시아의 1차 그레이트 게임,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맞붙은 2차 그레이트 게임,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3차 그레이트 게임은 유라시아를 무대로 펼쳐진 해양-대륙 세력 간의 긴장으로 설명된다.
해군력을 키움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영국은 대양 진출의 기회를 노리는 러시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옛 이름)과 인도로 최대한 전진하라”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유언(1725년)은 영국으로 하여금 줄곧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흥기를 경계하도록 만들었다. 1차 그레이트 게임이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독일은 1871년 통일에 발맞춰 급격히 경제력을 발전시켰다. 주변 열강과 끊임없이 동맹관계를 맺는 비스마르크의 ‘저글링 외교’나 선제적인 군사 공격 같은 양극단의 선택을 해야 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된 데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크게 작용했다.
이후 펼쳐진 2차 그레이트 게임, 즉 미·소 냉전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패권을 대체한 미국과 지리적 안보 불안을 끊임없는 팽창 본능으로 극복하려는 소련의 전면 대결이었다. 하지만 낡은 중공업 체제를 방치한 채 무리한 제3세계 진출로 국력을 소모한 소련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과 함께 내부 붕괴에 직면했다. 이로써 3차 그레이트 게임은 미국과 수교 뒤 동남연안지대의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대결로 이어졌다.
패권 경쟁을 살펴본 뒤 떠오르는 물음표는 당연히 한반도의 미래에 찍힌다. G2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한반도야말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단단히 얽매인, 대표적인 지정학의 포로다. 지은이는 “한반도가 특정 열강 진영의 완충지대로 유지되게 해야 한다”며 진보 진영의 민족통일론이나 보수 진영의 반공통일론 모두 “위험한 이상주의”라고 진단한다. “주변 열강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공존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이야말로 분단 체제의 평화적 해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동사무소 직원 ‘점 하나’ 실수로 남동생이 남이 되었다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5/53_17720019159043_20260225502317.jpg)
[단독] “새벽 2시 출근” 강동구 26살 청소노동자, 일자리 잃고 거리로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농지 전수조사’ 준비 착수…매각명령, 매해 1000명서 대폭 늘 듯

피해자들은 왜 내 통장에 입금했을까

내란 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누가 반대했나 밝혀라”…통합안 보류에 국힘 TK 의원-지도부 충돌

‘극우’ 손현보 목사, ‘밴스 측근’ 미 국무부 고문 만나…집행유예 석방 한 달 만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