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밝히건대, 이 기사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쓸 수가 없다. 지난봄부터 올해 봄까지, 사무실에서 거의 마주 보고 앉는 바람에 생기지 않아도 될 애증의 감정이 싹튼 사람이 책을 냈는데, 이 지면에 그 책의 리뷰를 써야 한다. 제목은 (철수와영희 펴냄). 2008년 봄부터 2011년 봄까지, 에서 권두 칼럼을 쓴 박용현 전 편집장의 ‘만리재에서’ 124편을 모아 펴낸 책이다. 지금 읽기에 지나치게 시의적인 몇몇 칼럼은 빼고 민주주의, 정치, 경제, 언론, 법, 인권, 성찰, 어린이 등을 주제로 다시 엮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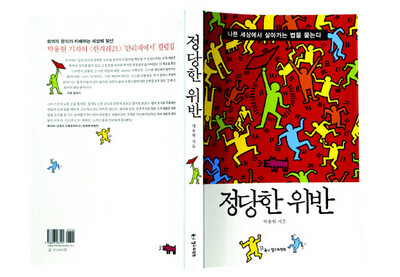
서글픈 세상을 향한 펜 끝
124편의 세월을 함께 나진 않았지만 1년치만으로도 충분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본의 아니게, 파티션이 너무 낮은 관계로, 저자가 편집장으로 재직 당시 손 내밀면 닿을 거리에 앉아 데스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서른을 맞기도 전에 희로애락의 인간사 삼라만상이 모두 깃든 얼굴을 목격했다. 주로 ‘노’(怒)에 집중했던 그 표정에서 나는 저자가 매우 히스테릭한 인간인가 보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에서 만난 그는 매주, 그것도 3년간이나 ‘그’로 상정한 독자를 향해 연애편지를 쓰는 로맨티시스트였다. 그러니 그의 얼굴에 비쳤던 분노의 기운은 사실, 사랑하는 ‘그’들에게 보낼 잡지에 화나고 답답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게 하는 세상을 향한 것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제가 된 칼럼 ‘정당한 위반’을 썼을 때도 그런 표정이었을까. “그들은 억울했다,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절박한 심정을 표출했다, 평화적으로. 국가는 귀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거리로 나섰다. 현행법 위반이었다. 국가는 그들을 체포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 나선 이들의 억울함을 글로나마 다독이며 저자는 서글픈 감정을 느꼈단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그래도 예측 불가의 이 ‘사태’를 좇아 기록하는 일은 가슴 벅차다. 나라가 꼴을 갖춰가고 세상이 더 살 만해지는 일의 시작은 늘 그러하니까”라고 마무리한다. 2011년에도 저자가 데스킹을 보며 종종 화를 냈던 이유는 나라가 여전히 꼴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은 더 각박해졌기 때문일까.
저자는 ‘그’로 상정한 독자들에게 연서를 보내면서도 종종 수신자로 다른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다. “민주와 진보를 내세운 이들이 낙엽처럼 속절없이 떨어져나간” 어느 선거날, “다시 공안기구의 정치 사찰이 고개를 드는” 어떤 날, 이름 모를 벗에게 젊은 날 그려봤던 세상을 위해 서로 어깨를 겯자고 이야기한다. 밤늦게 퇴근해 아들의 초코빵을 조금 떼어먹었다가 화풀이를 당한 다음날에는 아들이 수신자가 된다. 그 편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벌을 주는 대신 가르침을 준다. 권위적이지 않고 다정하게 조목조목 인권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평등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들에게 ‘어린이사회당’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저자는 그렇게 때로는 의 편집장이었다가, 피 끓는 청춘을 함께 보낸 누군가의 친구였다가,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굴려갈 수 있을지 갈망하고 모색한다.
마음을 붙잡는 문장들
애초에 이 리뷰는 3년간 그린 생각의 나이테를 단칼에 잘라 한쪽의 지면에 옮겨 담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빨리 마감하고 다른 할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감이라 마음이 바쁜데, 때로 애끓고, 때로 다정하고, 때로는 화를 누르는 듯 침잠하는 문장들이 자꾸만 걸음을 붙잡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호르무즈 봉쇄 직전 한국행 유조선만 ‘유유히 통과’…사진 화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18413306_20260304503108.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박용현 칼럼]

김성태 “검찰 더러운 XX들…이재명,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여”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304/53_17726139703969_20260304503247.jpg)
[단독] ‘왕사남’ 엄흥도 실제 직계후손 출연했다…누구지?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국방부, 장군 아닌 첫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향해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코트

한국인 선원 186명, 페르시아만서 발 묶인 선박들에 탑승 상태

하룻밤 공습에 1조원…트럼프는 “전쟁 영원히” 외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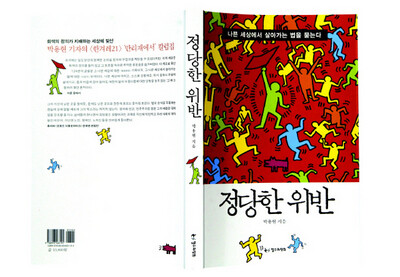







![마침내 극우에 표 던진, 공장노동자 내 어머니 [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6/0102/20260102502102.jpg)
![‘인류 죽음의 전문가’가 되짚는 남편의 죽음[21이 추천하는 새 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5/1225/202512255025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