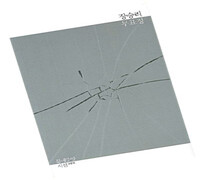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의 첫 장편소설 (창비 펴냄)을 읽었다.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7쪽)다. 17살의 나이에 그만 아이를 낳게 된 어린 부부가 있다. 그런데 그들의 아이가 이른바 조로증(早老症·progeria)에 걸려 태어난다. 안 그래도 부모는 너무 젊은데, 자식은 너무 빨리 늙는다. 지나치게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읽기도 전에 경계할 독자도 있겠다. 보기가 고통스러워 스타일의 다큐를 못 보는 이들도 지레 겁을 먹겠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겪고 있을 불행을, 당사자가 아닌 이가 소설로 쓰는 일은 그 자체로 뭔가 아슬아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런 걱정과 우려를 날려버린다.
서술의 권한을 부모가 아니라 조로증에 걸린 아이 한아름에게 준 것이 그 비결 중 하나다. 그래서 이야기의 포인트가 ‘자식을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는 자식’에 맞춰지게 되었다. 게다가 “가장 어린 부모”를 떠나는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이니, 우리가 이미 이 작가의 예전 단편에서 인상 깊게 확인한 적이 있는, ‘부모보다 더 부모 같은’ 화자의 위력이 십분 발휘될 만한 설정이기도 하다. 불행의 당사자가 자신의 불행에 유머러스한 거리를 두게 해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그 두 정서의 산술적 총합 이상의 것을 느끼게) 만드는 특유의 기교도 어떤 경지에 오른 것 같다.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부모를 떠나는가. 이야기를 만들어 이를 부모에게 선물해주면서다. “내가 두 분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등상도 학사모도 아닌, ‘이야기’여야 할 것 같았다.”(107쪽) 생사의 경계를 헤매던 어느 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이 뒤섞여 눈앞에 재생되는 기묘한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다. “완전한 거짓말도 사실도 아닌 무엇이, 탁한 듯 맑고 가까운 듯 먼 리듬으로 지나갔다.”(57~8쪽) 이 체험은 아마도 한아름에게 ‘이야기’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었을 것이다. 완전한 허구도 완전한 사실도 아닌, 그러나 진실한 어떤 것의 가치.
그래서 이 아이는 소설을 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를 그리는 소설. 이 소설에는 두 개의 목적이 있다. 첫째, 이토록 불행한 ‘나’라는 존재가 어째서 태어나야만 했는가를 납득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불행히 그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80쪽) 둘째, 열일곱에 자기를 낳고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부모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청춘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낳아드릴게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배어드릴게요. 나 때문에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드릴게요. 아버지, 내가. 어머니, 내가.”(324쪽)
여기서 우리는 김애란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만난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야기’(상상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간절하게 표명하는 이야기라는 것.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이 책의 끝에는 한아름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에게 남긴 바로 그 소설이 실려 있다. 마치 극장에서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영화 본편에는 나오지 않았던, 우리의 슬픈 주인공의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상상인) 행복했던 옛 시절을 흑백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대목을 읽으면, 이것이 어째서 남겨진 부모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먹먹한 기분으로 납득하게 된다.
이 작가의 장점이 총집결돼 있는 소설이라고 말해도 좋다. 이 말이 행여 작가가 쉬운 길을 갔다는 말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고통으로 울고 또 그 타인의 씩씩함으로 웃게 되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이야기의 윤리’를 고민할 줄 아는 작가에겐 공중에서 줄 위를 걷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 역시 이런 이야기 앞에서는 감동에 저항하려는 자의식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나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많이 웃었고 몇 번은 울컥했지만 내 웃음과 울음에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목적지에 훌륭하게 도착했다. 박수를 아낄 생각이 없다. 나는 내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최대한 건조하게 이 글을 썼다.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발효…일단 10%로 시작

스케이트 날이 휘면 다시 펴서…아픈 누나 곁 엄마에게 메달 안긴 아이

‘어디서 3·1절을 팔아?’…전한길 콘서트, 허위 신청으로 대관 취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이 대통령 “다주택 자유지만 위험 못 피해…정부에 맞서지 마라”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24/53_17719136432313_20260224502580.jpg)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김건희에 통일교 금품 전달

쌓여가는 닭고기, 못 받는 쿠팡 주문...‘배민온리’에 갇힌 처갓집 점주들

이 대통령 “농지 값도 비정상…투기용 보유 무의미하단 인식 만들어야”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1심 모순된 판단, 역사에 문제점 남길 것”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 다수…두 달 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