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상의 빛〉
세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멋대로 떠난다. 32살의 여인이 있다.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3년 전에 재혼했다. “다미오씨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도모코도 저를 잘 따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아내와 젖먹이를 버리고 멋대로 죽어버린 당신에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말을 걸고는 합니다.” 그녀가 ‘멋대로 죽어버린 당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 소설을 끝까지 읽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제는 슬픔이 맑게 가라앉아 있어 그것을 가벼운 힐난에 실어 말할 수도 있게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와 다다미방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도 이쪽이 힘들어질 일은 없겠구나, 하고. 미야모토 테루의 소설 (서커스, 2010)의 도입부다.
내용은 이렇다. 그와 그녀는 꼬맹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가난해서 둘 다 중학교까지만 다녀야 했다. 그런 일에서조차도 “둘이서 작은 방에 들어간 것 같은” 설렘을 느낄 정도로 둘은 정겨웠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첫아이를 낳은 지 세 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해도 좋을 때의 어느 날에, 남편은 전차의 선로를 걷다가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않고 죽어버린다. 그녀는 그 이후 껍데기처럼 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는 왜 갑자기 죽어버린 것일까. 그 생각에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바닷가 마을로 시집을 간다. 그곳에서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날 밤의 남편이 그랬을 법한 뒷모습을 한 채로 걷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다가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아무리 힘껏 껴안아도 돌아다봐주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뭘 물어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의 애원하는 소리에도 절대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59쪽)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옮기지 말자. 그저 이 뒷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출발한 소설이라는 것만 말하자. 이 소설에 몇 개의 뒷모습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뒷모습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 알게 된다. 인간의 뒷모습이 곧 인생의 앞모습이라는 것을.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인간은 그래서 타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얼굴을 보려고 허둥대는 것이다. 사람의 뒷모습이 대개는 쓸쓸하다면 그건 인생이 늘 얼굴을 찌푸려서인 거겠지.
우리가 흔히 삶의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의 얼굴에 스치는 순간의 표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 표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나. 행복한 가족의 어느 가장이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득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게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그냥 보여줄 수밖에, 그 남자의 뒷모습만을 하염없이 보여줄 수밖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지.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6.44) 의 후반부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6.522) 이 철학자가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문학의 언어만큼은 그 ‘스스로 드러남’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없을까.
그런 소설을 좋아한다. 해석되지 않는 뒷모습을 품고 있는 소설, 인생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들 중 하나를 고요하게 보여주는 소설. 한 사람의 표정들을 모두 모은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되지는 않는다. 한 소설이 건드리는 ‘작은 진실’은 독자적인 것이고, 과학이나 철학이 제시하는 ‘큰 진실’(진리)의 한낱 부분들이 아닐 것이다. 전체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들의 세계이니까 소설이란 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소설을 읽으면 겸손해지고 또 쓸쓸해진다. 삶의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미세한 것이구나 싶어 겸손해지고, 내가 아는 건 그 진실의 극히 일부일 뿐이구나 싶어 또 쓸쓸해지는 것이다. 미야모토 테루의 이 아름다운 소설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고 또 쓸쓸해졌다. ‘순수문학’이라는 이상한 명칭이 이런 소설 앞에서는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권 강탈”…당내선 ‘선거 포기했나’

앞뒤 다 비워…윤석열 ‘황제 접견’, 재구속 이후 278차례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 CCTV에 ‘찰칵’…성추행 의혹도

전임자도 “반대”…이성윤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에 민주당 발칵

‘트럼프 관세’ 90%, 돌고돌아 결국 미국인이 냈다

10만명 생계 달린 홈플러스, 살릴 시간 20일도 안 남아…“제발 정부가 나서달라”

기상 악화에도 “치킨은 간 모양이네요”…이 대통령, 연평도 해병대 격려

재판소원 옹호 나선 헌재 “4심제도 위헌도 아니다”

여자 500m 벽 높았다…쇼트트랙 최민정·김길리·이소연, 메달 획득 실패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 방지에 주의 돌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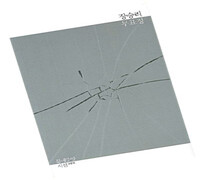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속보]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12/53_17708767345627_20260212502899.jpg)
